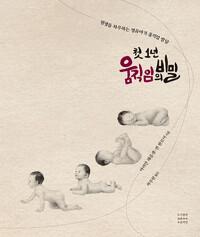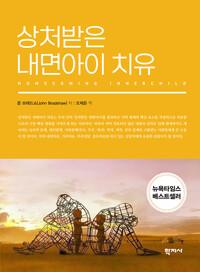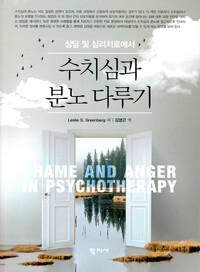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91169560146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23-04-20
책 소개
목차
제1편 한국의 주택
1 집과 주택(住宅)의 뜻〔意味〕
2 주택(住宅)의 다른 말〔用語〕들
제2편 주택의 역사
1.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기원전 60만년경-기원전 1만년경)
2 중석기시대(기원전 1만년경-기원전 7000년)
3 신석기시대(기원전 7000년경-기원전 1000년경)
4 청동기시대(기원전 1000년 - 기원전 300년)
2. 성읍국가시대
1 움집〔竪穴住居〕
2 지상가옥과 줄구들
3 기록으로 본 집 유형
3. 삼국시대(三國時代)
1 고구려(高句麗)
2 백제(百濟)
3 신라(新羅)
4. 남북국시대(南北國時代)
1 통일신라(統一新羅)
2 발해(渤海)
5. 고려(高麗)
1 주택 형성의 영향
2 주택
제3편 조선시대의 주택
1. 환경(環境)
1 자연환경(自然環境)
2 인문환경(人文環境)
2. 배치와 평면
1 서민주택(庶民住宅)―민가(民家)
2 중류주택(中流住宅)―중인가(中人家)이교가(吏校家)
3 상류주택(上流住宅)―제택(第宅)
3. 구조(構造)
1 기단(基壇)
2 주춧돌〔柱礎石〕―초석(礎石)
3 기둥〔柱〕
4 가구(架構)와 지붕틀
5 지붕
6 벽체(壁體)
7 바닥〔床〕
8 반자(盤子, 班子), 천장(天障, 天井)
9 창호(窓戶)와 문(門)
10 굴뚝
11 담〔墻〕
4. 내부공간(內部空間)
1 서민주택
2 중상류주택
5. 외부공간(外部空間)―정원〔庭園, 庭苑〕
1 서민주택
2 중류주택
3 상류주택―제택
제4편 각 지방의 주택
1. 서울
1.1 다동 백상규가(茶洞白象圭家)
1.2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가(三角洞都片手李承業家)
1.3 관훈동 이홍재가(李洪宰家)
1.4 와룡동 김은호가(臥龍洞金殷鎬家)
1.5 이문내 구윤옥가(里門內具允鈺家)
1.6 중학동 정씨가(中學洞鄭氏家)
1.7 견지동 윤영선가(堅志洞尹永善家)
1.8 수표동 장택상가(張澤相家)
1.9 운니동 내관가(雲泥洞內官家)
2. 경기도 주택
2.1 화성 정용채가(華城鄭用寀家)
2.2 용인 정영대가(龍仁鄭榮大家)
3. 강원도 주택
3.1 강릉 오죽헌(烏竹軒)
3.2 강릉 해운정과 고택(江陵海雲亭 및 古宅)
3.3 강릉 최종완가(江陵崔宗完家)
3.4 강릉 선교장(船橋莊)
3.5 임경당(臨鏡堂)
4. 충청도 주택
4.1 영동 송재문가옥(永同 宋在文家屋)
4.2 회덕 제월선생고택(懷德霽月先生古宅)
4.3 예산 추사고택(禮山秋史古宅)
4.4 예산 이참판고택(禮山李參判古宅)
5. 경상도 주택
5.1 하회 풍산류씨대종택 양진당(河回豊山柳氏大宗宅養眞堂)
5.2 의성김씨종택(義城金氏宗宅)
5.3 의성김씨소종가(義城金氏小宗家)
5.4 월성 손동만씨가(月城孫東滿氏家)
5.5 월성향단(月城香壇)
5.6 월성 관가정(月城觀稼亭)
5.7 묘동 박황씨가(妙洞朴煌氏家)
5.8 경주최식씨가옥(慶州崔植氏家屋)
5.9 영천매산고택(永川梅山古宅) 및 산수정(山水亭)
5.10 거창 동호리 이씨고가
6. 전라도지방
6.1 부안 김상만가옥(扶安金相万家屋)
6.2 고창 황병관가옥
6.3 구례 운조루(求禮雲鳥樓)
6.4 연안김씨종택(延安金氏宗宅)
제5편 한국 주택의 공간성
1 배치(配置)ㆍ평면(平面)
2 구조(構造)
3 내부공간(內部空間)과 외부공간(外部空間)
저자소개
책속에서
“조선시대 주택은 공간정서空間情緖의 변화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담장과 행랑채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채棟를 세우고, 또 이들 채들 사이에 사잇담과 행랑으로 구획함으로써 여러 개의 마당이 생겨 한 공간, 한 공간에 접근할 때마다 서로 다른 공간정서를 느끼게 한다.”“조선시대 주택은 그 공간과 공간이 상호 침투되는 데 특성이 있다. 이는 공간의 위계성位階性으로도 이루어지며 또 들어열개의 창호나 담장에 설치한 살창으로도 이루어진다. 들어열개의 창호들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쉽게 상호 침투시키며, 윤보선 전 대통령댁의 안마당과 안사랑채 사이의 사잇담에 설치한 교창처럼 두 마당이 상호 침투되게 한다. 또 옥산 독락당獨樂堂 담장에 설치한 살창은 독락당에서 살창을 통하여 독락당 마당보다 낮은 계곡을 흘러가는 냇물溪流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인공 공간과 자연 공간이 상호 침투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