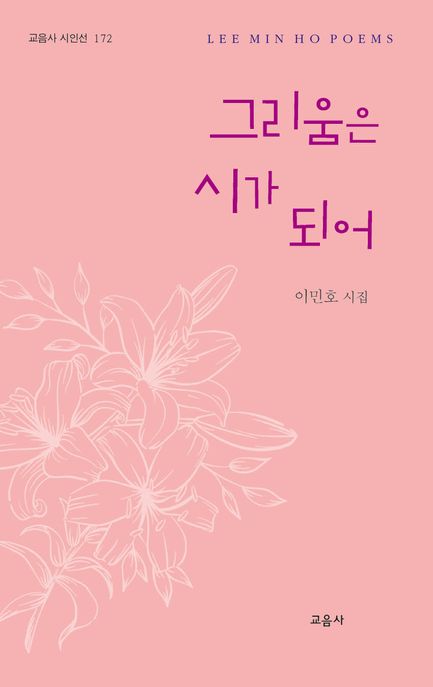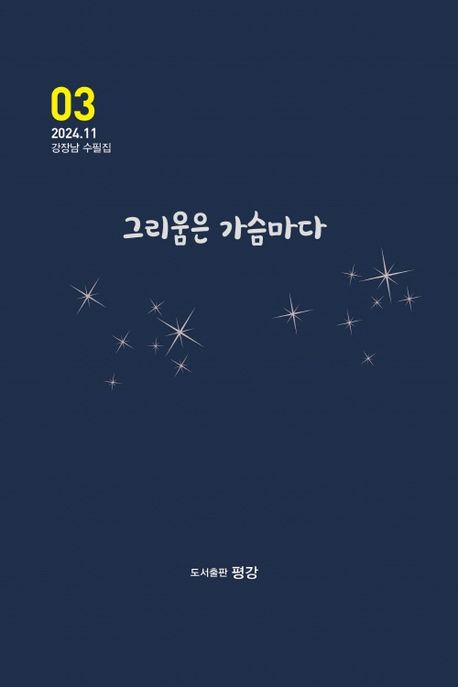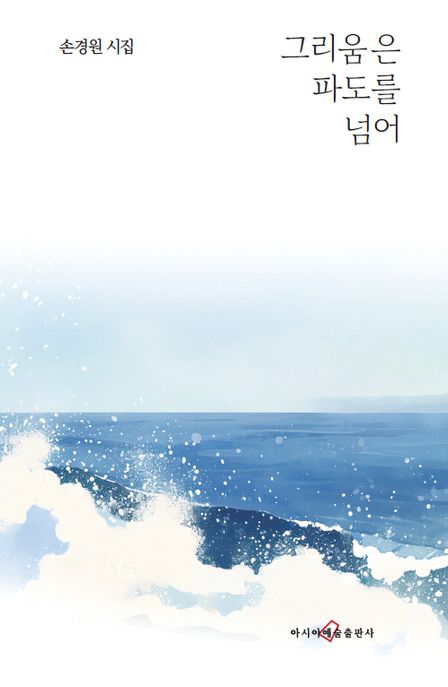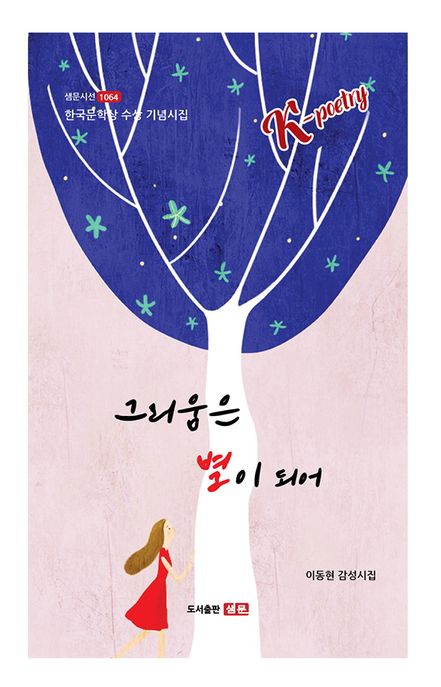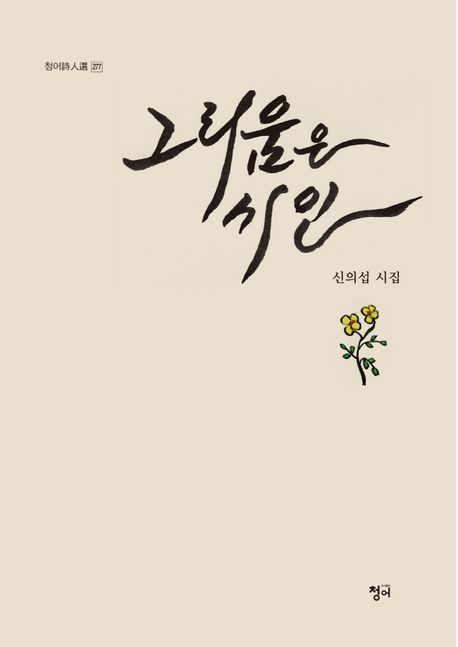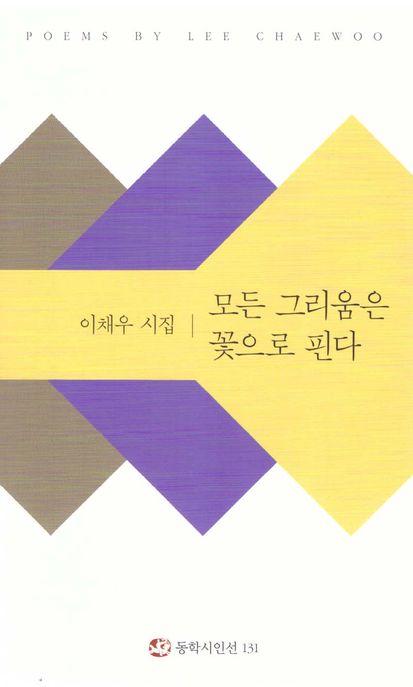그리움은 홀로 빛나는 미등
김채영 | 시와소금
10,800원 | 20251025 | 9791163251002
김채영 시인에게 있어 기억과 그리움은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현재성을 통해 살아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기억은 ‘과거의 잔존물’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의미화하는 ‘생성적 동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물을 찾아 사막을 건너는/목마른 그림자”(「해갈의 기억」)처럼, 기억에 천착하는 것은 현재적 실존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억과 시간은 장소와 만나 구체화된다. 태백을 중심으로 하는 장소애(Topophilia)가 표출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시간의 무게”(「손등 위의 세월」)에서 드러나듯, 시인이 제시하는 시간은 선형적 흐름이 아닌 중층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갖는다. 시간은 신체적 흔적을 통해 현재화되며, 개인적 체험과 역사적 경험이 교직하는 복합적 시공간을 형성한다. “그리움은 은하의 끝에서 홀로 빛나는 미등”(「그리움은 홀로 빛나는 미등」)이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그리움은 존재의 본질을 사유하도록 이끈다. 결국 그리움은 부재를 현존으로 전환시키는 존재론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면서 장소로서의 ‘태백’이거나, 소외층으로서의 ‘광부’를 호명한다.
시에 나타난 다양한 기호들 ‘손, 계단, 별빛, 샘, 새, 사진첩, 갱도, 안개’ 등의 문화적 의미는 개인적 체험과 만나면서 다양한 변주를 이룬다. 이 기호들은 기억과 시간 의식의 새로운 양상을 펼쳐나가는 매개체가 된다. 노동과 희생의 의미화 방식이라든가, 단시 구조를 통해 침묵과 언어의 변증법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시적 실험이기도 할 것이다. 디카시의 시도 역시 새로운 형식 시도일 것이다.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쓸어보며
낯선 이의 손금 안에
내가 걸어온 길 펼쳐진다
말보다 깊은 이야기
손끝으로 전해지는 시간의 무게
-「손등 위의 세월」 전문
타인 속에 각인된 자기 삶의 궤적을 발견하면서, 과거를 감각적으로 되짚는다. “낯선 이의 손금 안에/내가 걸어온 길”에서 보듯, 타자의 손등에 새겨진 주름은 곧 화자의 삶이다. ‘나’는 타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타자 또한 ‘나’ 없이 규정되지 않는다. ‘나와 타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자아와 타자의 고정된 경계가 해체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에서 관계는 상호 구성적이거나 유동적 존재로 나아간다. 끝 행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시간의 무게”는 비가시적인 과거를 가시화하는 촉각적 장치이다. 이는 비언어적 전승과 세대 간 기억의 연속성에 주목하며,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각인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시간은 육체의 흔적을 통해 다시 회상되며, ‘손’이라는 매개체는 그 자체로 삶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러한 시간의 응시는 「기억을 만나다」에서도 이어진다. “쓰다만 일기/덮어둔 사진첩/먼지 쌓인 지도책” 같은 구체적 사물들은 잊힌 기억의 저장고로 기능하다가, “오늘/꽃 한 송이 피었다”는 문장에 이르러 현재성을 회복한다. 사물에 축적된 기억을 통해 사라졌던 감정이 꽃 한 송이로 시각화되는 과정은 기억이 생명성을 획득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세상 어둔 곳으로 동안거에 들었네”(「육쪽마늘」)라고 고백하듯, 김채영 시인은 말해지지 않은 것, 지나간 것, 손 닿지 않는 대상들에 잔잔한 애정을 보낸다. ‘손등, 물결, 불빛, 발자국’ 등을 통해 무형의 감정과 기억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것 역시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난간에 기대어떠난 사람의 이름을 풀어놓자저편 허공에서 일어선 기척
물무늬 하나가물살 속에 스며들었다
(중략)
나는 흔들리는 물빛에손끝을 적셨다가
파문 속으로그 손을 다시 밀어 넣었다
저무는 입술로
봄을 불러본다
귀 기울이면달빛 아래, 아직 사라지지 않은그 이름이
물결처럼 되돌아온다
-「월영교의 밤」 부분
떠난 이를 불러내거나 부재를 견디는 데 머물지 않고, 남겨진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흔적에 눈길을 준다. 상실의 순간을 ‘기척’이라는 감각적 환영으로 재현하면서 상실 이후의 감각적 회복에 나설 수 있는 것도 현재성을 놓치지 않은 덕분이다. 물속에 스며드는 물무늬나 “파문 속으로/그 손을 다시 밀어 넣”는 장면은, 그리움의 감정이 감각적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이다. 사랑 혹은 존재의 부재가 ‘기억’과 ‘자연’ 속에서 조응하면서 생명 혹은 존재를 획득한다. “난간에 기대어/떠난 사람의 이름을 풀어놓자/저편 허공에서 일어선 기척”이라거나, “아직 사라지지 않은/그 이름이/물결처럼 되돌아온다” 등의 구절에서 확인되듯 부재의 존재가 자연의 질서 속에서 회복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시선은 「그리움은 홀로 빛나는 미등」에서도 확인된다.
노을 타서 마시던 술잔에 이윽고 밤이 그득하다
구름으로는 가릴 수 없는 푸른 달빛
그리움은 은하의 끝에서 홀로 빛나는 미등
그 빛은 어둠 위에 놓인, 사라지지 않는 나의 이정표
내일은 하늘 가장 가까운 고원에서
가장 늦게 사라지는 별을 보리
-「그리움은 홀로 빛나는 미등」 전문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등불이다. ‘미등’은 어두운 밤을 밝히며 길을 안내하는 존재로, 그리움의 본질을 상징한다. 부재가 빚은 그리움을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그리움은 단지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면의 이정표이자,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실존으로 기능한다.
“그리움은 은하의 끝에서 홀로 빛나는 미등”에서 ‘그리움’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 징후로 격상한다. ‘미등’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자아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타자의 흔적을 상징한다. 이는 시적 자아가 어떤 다른 존재, 즉 타자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인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둠 위에 놓인, 사라지지 않는 나의 이정표”는 자아가 ‘외부의 신호-타자의 빛’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빛은 단순한 회상의 잔광이 아니라, 자아가 타자를 향해 갖는 책임과 응답의 윤리적 상징이 된다. 따라서 시 속의 그리움은 자아가 어떤 결핍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라기보다는, 존재의 방향성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재정립되는 자아의 좌표라 할 수 있다.
“은하의 끝”, “홀로 빛나는 미등”, “사라지지 않는 이정표” 등은 모두 자아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인식하는 근대적 주체 모델을 해체하고, 외부의 타자적 시선(빛, 시간, 공간)에 의해 자아가 구성되는 탈중심적 세계관을 구현한다.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단지 과거의 회상이나 감상적 유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정표’를 확인하는 현재적 실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