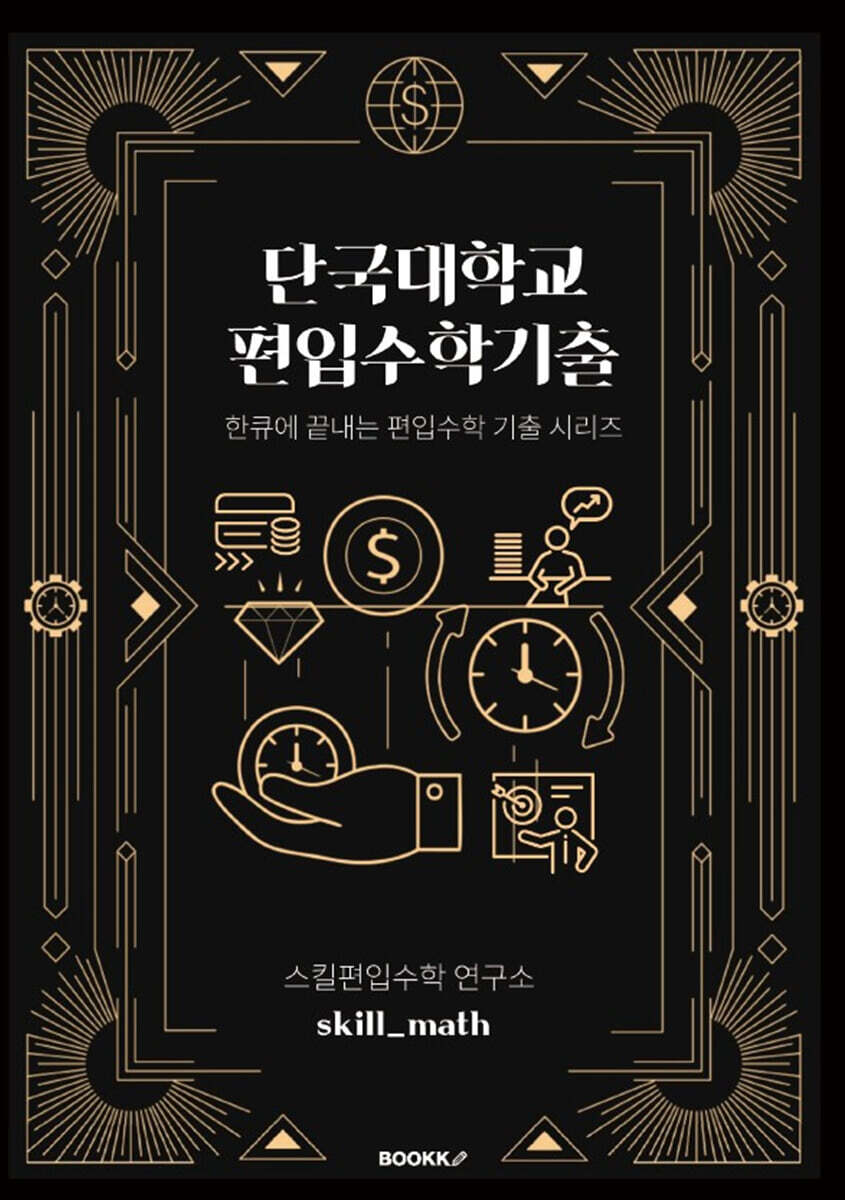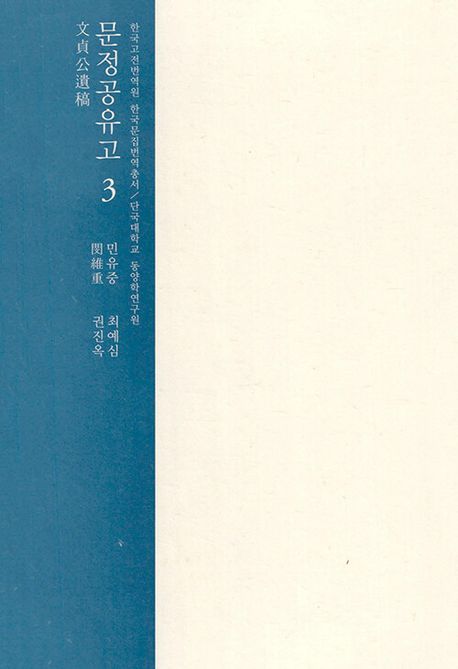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1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 다운샘
22,500원 | 20240108 | 978895817541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전2권) 소개〉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의 오랜 사유체계에 기반하여 축적된 전통 사상과 제도들은 새롭게 유입된 서양의 사조와 문명에 의해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켰다. 이때로부터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 1851~1925)가의 고문서는 축적되기 시작하여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 병합된 시기까지 총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자료는 이중구를 중심으로 조부 이재립(李在立, 1798~1853), 부친 이능덕(李能德, 1826~1861), 아들 이석일(李錫日, 1886~1950), 손자 이인원(李寅源, 1923~?)까지 여주 이씨 경주파의 5대에 걸쳐있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12대손 자운 이중구는 정제(定齋) 유치명(柳致明)의 문인으로 수학하며 학행과 덕망으로 사림의 중망(重望)을 받았던 이능덕과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후손인 동부승지 김진형(金鎭衡)의 딸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이재립도 1840년(헌종 6) 문과에 급제하여 초계문신(抄啟文臣)을 거쳐 선전관,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을 역임하기도 했던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1851년(철종 2) 9월 22일 광암리(匡巖里)에서 태어난 이중구는 1888년(고종 25) 식년시에 급제한 후 승문원 부정자(副正字)를 거쳐 1894년(고종 31)에 홍문관부교리 겸 서학교수(弘文館副校理兼西學敎授)에 제수되었다. 그는 세상이 혼란해지자 귀향한 후 학문에 매진하며, 선고(先考)의 유집을 정리하고 친족들의 일을 돌보다가 1925년 3월 향년 75세로 사망하였다.
1백여 년 동안 한 가문이 집안의 모든 문서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특히 간찰(簡札)의 비중이 높은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의 소식과 안부 등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활 제반 사항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간찰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일차 자료이다. 그러나 사료적 가치가 높으나 간찰의 경우, 흘려 쓰는 초서(草書)로 이루어져 이를 탈초(脫草), 해제(解題)한 후 연구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접근이 용이(容易)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부터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소장 이재령)가 《이중구가 5대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탈초·해제작업을 수행하였다. “서간문에 기초한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민간 생활사 자료 DB 구축 -경주지역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를 중심으로-”란 과제명으로 축적된 이 연구 결과물들 가운데 조선 후기 선비들의 일상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들을 뽑아 두 권의 책으로 국역하였다.
첫 번째는 왕가·관리·독립운동가·사림의 편지로 분류하였고, 두 번째는 시사 문제와 적서(嫡庶) 시비 및 과거·혼사 등으로 나누어 그 시대상과 선비들의 인식에 접근하였다. 이 책에는 이중구가의 고문서를 기반으로 19세기 중반이후 급변하던 국내외 상황과 향촌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 및 대응, 전통과 근대의 갈등, 수용, 변용 등 주요 내용이 오롯이 담겨있다.
이중구가의 고문서가 지닌 학술 가치와 역사적 함의는 다양성에 있다. 내용과 형식, 그리고 관련 인물의 다양성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를 살아가는 향촌 사회의 진면목(眞面目)을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다양한 문건으로, 본 연구팀이 지난 5년 동안 수행한 《이중구가 5대 고문서》의 탈초·해제 및 DB자료화 작업은 바로 조선 후기 민간생활사의 진가를 잘 보여준다. 8천여 건의 고문서에는 그동안 알고 있던 선비사회의 겉모양을 뛰어넘어 감추어진 이면의 세계, 음지의 세상사, 향촌 지식인들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문건은 이중구 집안이 살았던 경주와 옥산서원(玉山書院)이라는 지역을 떼어 놓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조선의 향촌 지식인인 선비들이 가졌던 사회적 관심사와 범주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천하를 울린 명문, 선비사회가 이룩한 서원(書院)의 소통 방식인 통문(通文), 시대의 병폐를 거론한 상소문(上疏文), 교지(敎旨), 시회(詩會)에서 지어진 시(詩), 잔치의 초청장, 장례 동안 오행(五行)에 근거한 금기(禁忌)를 적은 문서, 훌륭한 선생의 덕을 추숭하기 위해 형성된 유계(儒契) 기록, 조상의 덕행을 빛내려 명문장가의 솜씨를 빌어 지어진 글, 호적(戶籍), 혼인이나 손자가 태어났을 때 미래를 살펴보는 사주팔자(四柱八字) 풀이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며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공문서, 일왕 생일에 행해진 지역민의 축하연, 개성 인삼상회에서 보낸 광고지, 당시 판매된 담뱃갑, 산의 지번에 따른 도형 등등의 것들도 있다.
또 사람이 태어날 때 겪는 산모의 진통, 관혼상제의 절차가 성현이 세운 씨줄을 바탕삼아 변화된 현실에서 조화하는 날줄을 만나볼 수도 있다. 열 살이 넘어서면 혼맥(婚脈)을 만들기 위해 기울이는 양쪽 집안의 정성이 맞닥뜨려 어느 때는 거절하는 핑계, 어느 때는 성사에 필요한 주변 인맥의 동원을 위한 편지들에서 미사여구가 동원되고 있는데 이런 문서들에는 해학적 요소가 깃들어 있다. 기존의 전적(典籍)에서 전해진 것이 아닌 일상에서 생성된 우리말이 한문의 외피를 입은 것도 있다. “종무적병(終無適餠)”이란 ‘끝내 적병(適餠)이 없다.’라는 뜻인데 우리말의 “입에 맞은 떡이 없다.[無適口之餠]”는 것을 줄여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건에 다양한 문장이 어우러진 것이 이중구가 5대 고문서의 가치이다.
둘째, 다양한 형식으로, 이중구가의 간찰은 조선조 서간문 형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간찰 박물관이다. 한지에 모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갈하게 써진 한 장의 간찰은 어느 시점부터 변화가 더해지며 켜켜이 쌓였다. 이중구가의 간찰 형식을 분류해 보면 거의 삼십여 가지에 이른다. 이런 다양성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형태로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뿐 아니라 간찰에 곁들여지는 피봉(皮封)을 고종 21년(1884년) 우정총국(郵政總局)이 문을 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근대 우편제도 이전의 피봉에서 보이는 겹으로 싼 정중함, 발신인과 수신인을 적는 위치, 발신인과 수신인을 쓰지 않은 경우 피봉을 만들지 않고 편지의 여백으로 피봉을 만드는 등의 여러 형태들이 있다. 우정총국이 문을 연 뒤까지도 여전히 옛 피봉 형식이 고수되는가 하면 일부 계층에서 새로 제정된 제도를 인용하면서 옛 피봉 형식을 따르는 모습 등에서 오랜 전통과 관습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 쓰인 글자들이 모두 초서라서 읽어내는데 쉽지 않지만 중국이 간체자를 만들어 쓰기의 고통을 덜어내듯이, 우리 선조들의 문자 생활에서도 이런 혁신을 도모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예컨대 자형(字形) 생략형으로 毛(모)는 耗(소식 모), 复(복)은 復(회답할 복), 余(여)는 餘(나머지 여)의 자획을 생략한 글자로 쓰이고 있다. 자음(字音) 통용형의 卜(복)은 鰒(전복 복), 宜(의)는 醫(의원 의)의 음을 차용해 쓴 글자들이다. 자훈(字訓) 차용형의 薪(섶 신)은 국어의 훈독(訓讀)에서 ‘섶’을 ‘섭’으로 적용한 예이다.
셋째, 다양한 사람이다. 이중구를 전후로 5대가 경주에서 회재 이언적을 받드는 옥산서원의 주인으로 인식되었기에 이 집에 오가는 편지는 당연히 이에 걸맞은 인물들일 수밖에 없다. 조부 이재립은 사간원 정언을 지냈고, 아버지 이능덕은 영남 일대에서 이름을 떨친 유치명의 제자였으며, 이중구는 교리라는 정5품(正五品) 벼슬을 지냈다. 그렇기에 교류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경화(京華)의 왕족(王族)과 사족(士族)들이 있다. 왕족으로는 대원군의 맏아들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의 장자이자 고종의 조카로 태어나, 할아버지 대원군과 민씨의 척족 세력이 타도되며 들어선 친일 정권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국왕으로 추대되려다 실패한 이준용(李埈鎔)이 대표적이다. 그는 안타깝게 친일로 생을 마감한 불운한 왕족이다.
사족으로는 재상 세 사람과 대제학 네 사람을 배출한 대구서씨(大丘徐氏)의 명문거벌(名門巨閥)에서 대제학 서영보(徐榮輔)의 아들로 태어나 대사성, 예조·병조·이조 판서를 지내면서도 집은 비바람에 시달릴 정도여서 청백리에 선정된 서기순(徐箕淳), 명성황후가 임오군란으로 몸을 피신할 때 자신의 충주 장호원 집을 제공하며 병조판서에 오르고 위안스카이(袁世凱)와 개화파 타도에 앞장서다 갑오경장으로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며 전라도 고금도로 유배된 민응식(閔應植),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맏아들 정학연(丁學淵), 철종 연간에 대사간과 고종 연간에 대사헌, 한성부 판윤, 황해감사, 형조판서를 지내고 고종 12년(1875년) 청의 목종(穆宗)이 죽자 진위 겸 진향 정사(陳慰兼進香正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강난형(姜蘭馨) 등이 이중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독립운동에 한 몸을 바친 임시정부의 국무령(國務領)을 지낸 이상룡(李相龍)이 십대 시절 이상희(李象羲)라는 이름으로 보내온 편지, 국파군망(國破君亡)의 시대에 선비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서릿발처럼 논하다 요동의 안동현(安東縣)에서 생을 마감한 지사 안효제(安孝濟), 광무 9년(1905)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乙巳五賊) 암살에 가담했다가 투옥된 뒤 풀려나 형제들과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하여 통화현(通化縣)에서 김동삼(金東三)·유인식(柳寅植)과 활동하다 주하현(珠河縣) 하동(河東)에서 서거할 때까지 독립운동 일념으로 살았던 허환(許煥), 일본군과 싸움에 패전한 장군을 숨겨주다가 일제에 미움을 사 아들과 함께 온양의 냇가에서 피살당한 예산(禮山)의 이남규(李南珪) 편지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종교의 2대 교주 김교헌(金敎獻)이 자신의 아버지 상사(喪事)에 조문해 준 것에 감사하여 이중구에게 보낸 편지도 있다. 김교헌은 1916년 나철(羅喆)의 뒤를 이어 대종교의 도사교(都司敎)에 취임한 뒤 일본의 탄압을 피해 총본사를 동만주 화룡현(和龍縣)으로 옮기고 독립운동과 동포들에 대한 독립정신 교육에 전념하며 청산리 전투에 힘을 보탰다. 김교헌의 편지는 초상을 당한 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전형적인 편지로서 그 가치가 높다. 그리고 이중구가 고문서에는 우국(憂國) 시인 이육사(李陸史)의 조부 이중직(李中稙)의 편지도 있다.
지난 5년간의 연구가 이중구가 고문서의 정리와 자료정보 수집에 치중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19세기 중반 이후 영남 일부 지역의 선비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대이행기 서양 사상과 문명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앙의 정책 및 통치가 민간사회의 일상과 어떤 조화를 이루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시대 담론이 향촌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해한다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근대성 연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둣돌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