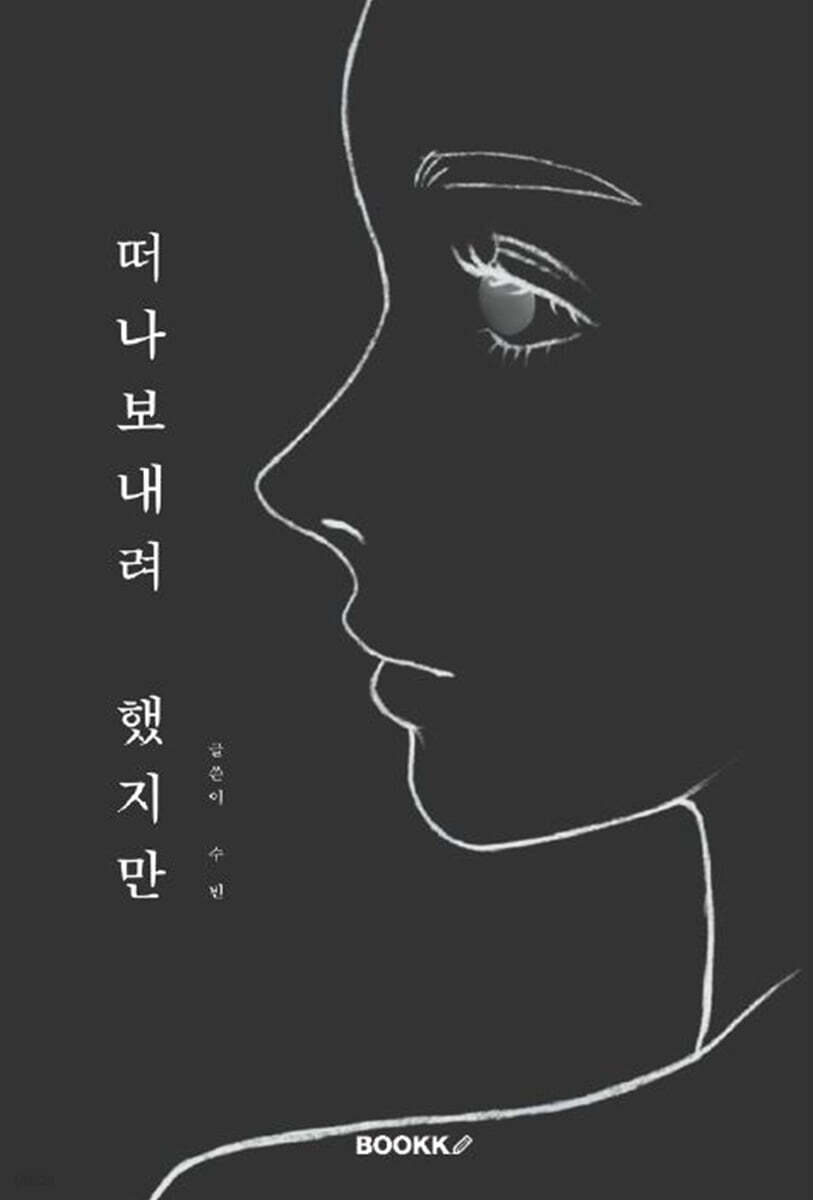애창곡 (‘하루 10분 글쓰기’ 27기 작품집)
김근임, 김다은, 망설 임, 수랑서, 신재호, 이구윤, 정수빈, 정혜원 | 하모니북
17,000원 | 20250530 | 9791167472564
하모니북 ‘하루 10분 글쓰기’ 27기 작품집
열다섯 가지 글감으로 쓰인 8명 작가님의 글을 모은 작품집입니다.
[본문 속으로]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의 몰입은 다른 성질을 띤다.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다 보니 그 시간 자체가 순수한 즐거움이자 행복이 된다.
회복 단계에 있는 지금은 예전처럼 성과나 결과를 쉽게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과도한 몰입이나 장시간의 집중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피로를 쌓이게 만들기도 한다.
- ‘집중과 몰입 | 김근임’ 중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던 모든 편지를 모아둔 나의 보물 상자.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로 축하 메시지나 위로의 말을 전하곤 하지만, 예전에는 우정 편지, 사랑 편지, 축하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었다. 난 유독 어릴 때부터 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단짝들과 이유 없이 편지를 자주 교환했던 기억이 난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또 다르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 편지쓰기는 특별하고 재밌게 느껴졌다. 그 편지들은 어린 나에게도 너무 소중했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모아두었고, 이사할 때마다 꼭 챙겨왔다.
- ‘고장난 물건 | 김다은’ 중에서
“지니야 지금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해줘.”
지난 10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후회도 많이 하고 정말 다사다난했었다. 그렇기에 조건은 이 모든 기억을 가진 채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 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을 거고 부모님 질병도 미리 알아차려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터라는 생각이 있다. 흔하게 영화에 나오듯이 시간을 돌려도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다 소용이 없으니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해달란 말을 덧붙였다.
- ‘요술램프 | 망설 임’ 중에서
나는 쓸데없는 인류애가 넘치면서도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모순적인 인간으로, 나라는 인간은 평생 어느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린지 오래다. 그래서 더욱이 가족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들은 내가 어떨 때 즐거운지, 어디서 예민한지, 그것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의 어떠한 모습도 그저 나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것임을 믿고, 또 믿는다. (이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 ‘나 다움 | 수랑서’ 중에서
뇌도, 심장도 없이 그저 본능대로 유영하는 해파리.
푸른 동해에서, 맑은 지중해에서조용히 부유하고 싶었다.
해파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대개 무리를 이루어 함께 떠다닌다.
심지어, 물해파리는 귀엽잖아.
- ‘동물로 태어난다면 | 신재호’ 중에서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는다. 목청껏 소리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행위)인지, 누군가 앞에서 점수가 매겨지는 솜씨의 장(장소)를 싫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가끔 노래방에서 노래를 고르라한다면 검정치마의 ‘love shine’이다.
특히나 아무런 조건없이 나를 봐달라는 사랑고백과 동시에 요청은 내마음에 쏙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러웠다. 어떻게 그 ‘tangled’와 ‘강아지’를 부르던 조휴일(검정치마)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럽다. 사랑하고 또 받고싶다.
- ‘애창곡 | 이구윤’ 중에서
내가 극복하거나 변화시킨 트라우마는 주문하는 것이 아닐까? 살면서 한동안 매우 소심해졌던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 말 한 마디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를 일이다.
내가 저 사람의 괜한 시간을 뺐을까봐, 용기 내어 말을 걸었는데 나를 무시해버릴까봐. 나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취급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걸까?
나이를 먹어가며 마음이 점점 단단해진 것인지 이런 일에 대한 걱정은 어느샌가 사라졌다.
- ‘버릇 | 정수빈’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벚꽃이 날리는 봄도, 푸른색이 싱그러운 여름도, 색색깔 옷을 갈아입은 가을도, 펑펑 내리는 함박눈도, 나의 색색깔의 이쁜 의상들도….
모두 볼 수 없다면 너무 고될 것 같다.
- ‘볼 수 없는 삶 | 정혜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