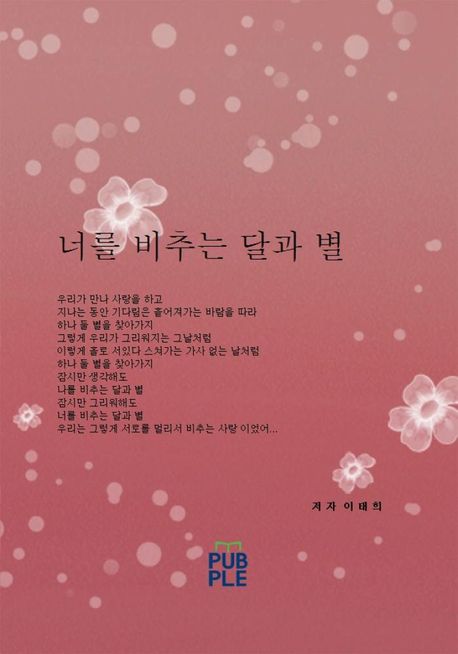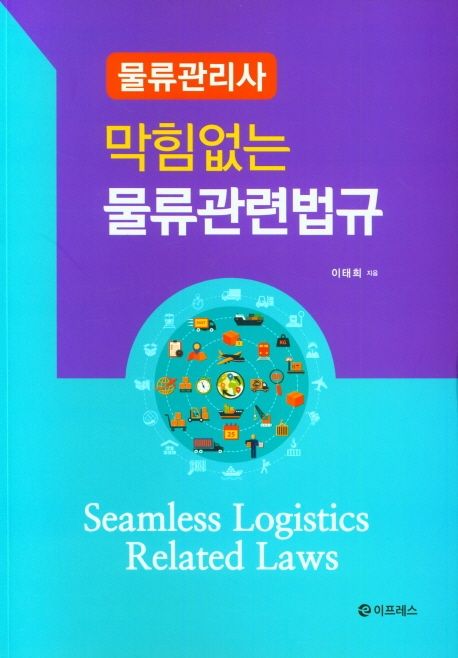푸른 책에 밑줄 긋다 (이태희 디카시집)
이태희 | 상상인
12,350원 | 20251201 | 9791174900302
이태희의 디카시집 『푸른 책에 밑줄 긋다』는 제목처럼, 하늘과 땅, 계절과 사물 위에 밑줄을 그어 나가는 한 시인의 섬세한 시선의 기록이다. 먼 산의 흰 눈과 호수의 오리, 물가의 진달래가 한 화면 안에서 ‘봄 마중’을 하는 첫 장면에서부터, 백록담의 장엄함과 겨울나무의 고독, 봄을 기다리는 얼음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시집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4부 구성으로 짜여 있어 한 해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 디카시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의 변화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모습이 얼마나 세밀하게 포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봄의 호수에는 오리의 자맥질과 물가의 진달래가 설렘을 전하고, 여름의 지리산 고사목은 “몸으로 살아온 백 년, 혼으로 살아갈 천 년”이라는 문장과 함께 시간을 초월한 생명의 단단한 숨을 들려준다. 가을에는 비·바람·햇살·구름이 지나간 자리의 빛깔이 ‘가을이 눕는다’는 장면으로 응축되고, 겨울에 이르면 잎도 열매도 떠나보낸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기보다 “푸르고 투명한 창공 속으로/내 고독의 뿌리를 뻗”는 존재로 서 있다.
디카시의 효과는 무엇보다 구체적 사물의 개념화를 통한 사유의 확장에서 비롯된다. 이 시집에서 연꽃, 모과, 붓꽃, 태양 흑점, 신호등, 심지어 사마귀와 그림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단순한 피사체가 아니라, 존재와 관계, 시간과 기억을 사유하게 만드는 개념의 장으로 확장된다. 반대로, 추상적 언어로 흘러가기 쉬운 개념들을 다시 사물의 피부와 질감으로 불러내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하늘은 책이다’에서 시인은 “푸른 책에 흰 밑줄 긋는다/시나브로 지워진다”고 말하며, 누구나 올려다보는 하늘을 ‘만인의 책’이라는 개념의 장으로 옮겨놓는다. 그러나 곧 “수수만년 읽어도 닳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닳아 없어지지 않는 푸른 종이의 촉감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개념은 사물의 구체성을 떠난 추상이 아니라, 다시 구체의 감각 속으로 되돌아가 독자의 몸에 각인되는 경험으로 완성된다.
이런 경험은 이태희 시인이 찍은 사진의 품격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호수의 잔물결과 먼 산의 설경, 모과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빛, 달을 닮았으나 “이것은 초승달이 아니다”라며 다른 상상력을 촉발하는 형상, 녹색과 적색의 신호등이 만들어내는 밤 풍경까지, 화면 구도와 노출, 색감은 대체로 차분하면서도 또렷하다. 주제와 상관없는 군더더기를 지워내고, 꼭 필요한 사물 몇 가지만 남겨 놓은 화면은 시의 언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하며 서로를 비춰준다. 사진의 질적 우수성은 단지 선명한 해상도나 기술적인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발화를 준비하고 뒷받침하는 미묘한 거리감과 여백, 빛의 깊이에서 드러난다. 이 덕분에 독자는 먼저 사진을 ‘본’ 뒤, 곧이어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시를 동시에 ‘겪는’ 경험을 하게 된다.
『푸른 책에 밑줄 긋다』는 우리 일상의 풍경 속에 이미 놓여 있었으나 제대로 읽히지 못했던 수많은 장면에 밑줄을 그어 주는 시집이다.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물과 계절, 빛과 그림자에 천천히 밑줄을 긋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비워야 덜 흔들릴 것인가, 어떤 어둠을 품은 밝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계절을 순환하는 이 디카시집은 독자에게 거창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길 위에 조용히 밑줄을 그어 두고, 언젠가 그 밑줄 위로 각자의 문장을 써 내려가 보라고 권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