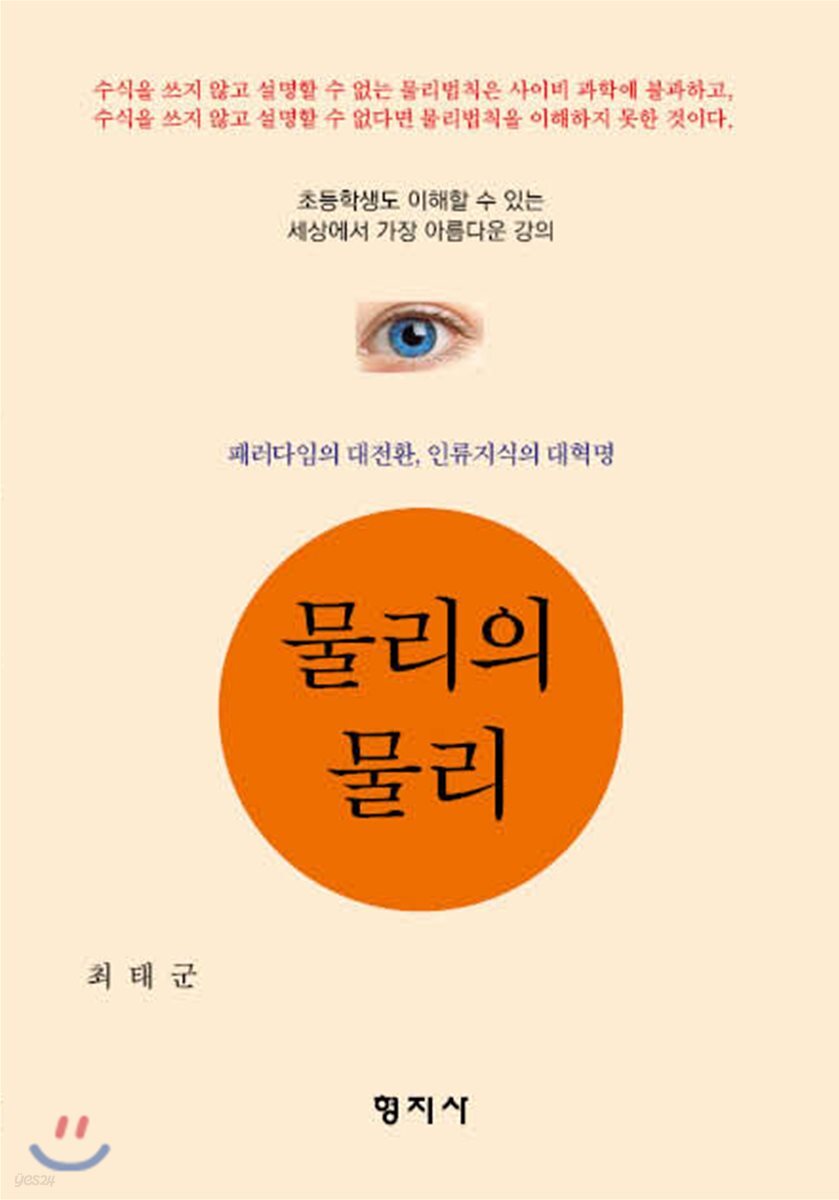비트코인 100만달러시대 글로벌 경제질서와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
진하수 | 부크크(bookk)
23,800원 | 20250602 | 9791112000460
21세기 초반, 전통 금융질서의 중심축이었던 법정통화 체계와 중앙집중적 금융 인프라는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부상과 함께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비트코인은 단지 하나의 암호자산이 아닌, 전통적 화폐관, 금융 중개 구조, 자산 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조 전환의 기호(symbol)로 기능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라는 상징적 가격대에 도달한다는 가정은 단순한 시세 예측을 넘어, 기축자산 체계의 분화, 글로벌 유동성 구조의 재조정, 자산 계층 간 재편성을 상정하는 하나의 통찰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며, 기존 금융시장의 핵심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자산은 글로벌 자본 흐름, 통화정책, 금융중개 기능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증권형 토큰(STO), 탈중앙화금융(DeFi) 등의 확산은 자산의 유통 방식과 금융 리스크 전이 경로에 근본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정태적 시각이 아닌, 동태적 전이 과정(transitional dynamics)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자산은 가치 저장, 교환, 증식이라는 자산의 고전적 삼기능을 전통 자산군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금융 시스템 내 리스크 관리 체계, 수탁 인프라, 자본 유통 구조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야기하고 있다. 커스터디의 제도화, 담보화 구조를 통한 유동화, 파생상품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은 단지 기술 혁신이 아닌, 글로벌 금융 구조의 내적 메커니즘을 재구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G-SIFIs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통합 움직임은 제도권 내 암호자산 수용이 불가역적인 흐름임을 시사한다.
한편,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 소비자 구조를 재편하면서, 자산의 축적 경로를 시간 기반, 정보 기반, 기술 기반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선호 확대는 세대 간 자산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자산계층(neo-asset class elites)의 부상을 통해 정보 비대칭과 기술 격차가 자산 격차로 전환되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제도의 접근성이 제한되었던 참여자들에게는 자기주권적 금융(self-sovereign finance)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금융 포용성과 사회안전망의 정의 재설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 질서의 다극화, 블록화, 분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보유 전략, CBDC 설계 방식, 준비자산 구성의 변화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중견 개방경제에 있어 통화주권과 자산시장 안정성에 대한 복합적 구조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한국은 규제 대응을 넘어, 통화·기술·정책의 전략적 정렬을 통해 디지털 금융 질서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실험국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