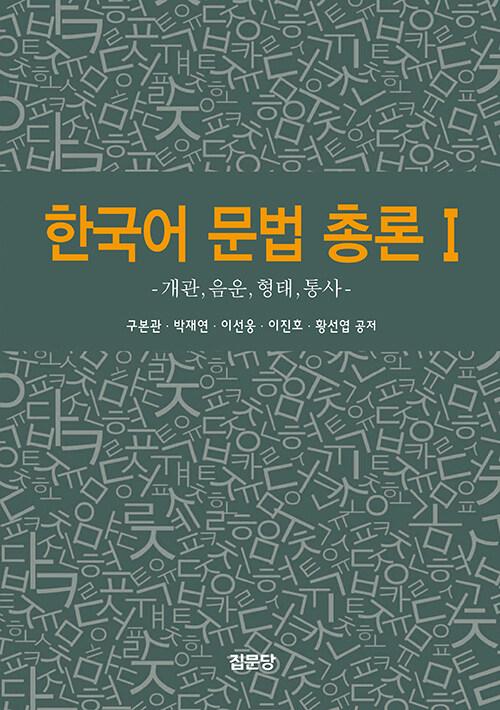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어문학계열 > 국어국문학 > 국어사/방언론
· ISBN : 9788975987526
· 쪽수 : 740쪽
· 출판일 : 2009-08-15
책 소개
목차
후기 _5
역자 머리말 _7
일러두기 _10
역자 일러두기 _11
1부 총설
1장 _한국어 방언 연구의 역사 19
2장 _한국어 방언 연구의 필요성 24
3장 _한국어 방언 조사 경과 26
4장 _한글의 로마자 전사 31
5장 _조사 지점 일람 및 인용 문헌 약칭 34
2부 각론
1장 _?(?) 43
2장 _외(oi) 49
3장 _여(i?) 53
4장 _요(io) 58
5장 _ㅿ(?) 60
6장 _음절 중간에 나타나는 [b] 68
7장 _음절 중간에 나타나는 [k]·[g] 113
8장 _말(馬)의 명칭 144
9장 _여우(狐) 157
10장 _매(鷹)의 명칭 183
11장 _달팽이(蝸牛) 명의고(名義考) 195
12장 _소주(燒酒)?アラキ(araki)? 208
13장 _벼(稻) 223
14장 _옥수수(玉蜀黍) 226
15장 _고구마(甘藷) 231
16장 _‘ととき’ 명의고(名義考) 251
17장 _냉이(薺) 명의고(名義考) 267
18장 _그네(?韆) 277
19장 _평안남북도 방언 285
20장 _함경남도 및 황해도 방언 331
21장 _북부 방언 활용어의 어말에 존재하는 ‘?둥’과 ‘?메’ 413
22장 _70여 년 전의 함경도 방언 431
23장 _신라어와 경상도 방언 441
24장 _대구 부근의 방언 453
25장 _제주도 방언 488
26장 _‘겨(在)’의 방언 분포 538
27장 _겸양법 조동사 551
28장 _방언 경계선의 한 사례 558
29장 _서양인의 기록에 남아 있는 한국 방언 562
30장 _일본어 특히 대마도 방언에 미친 한국어 어휘의 영향 590
31장 _한국어에 있어서의 외래어 622
32장 _방언 채집 회고 641
3부 한국어 방언 구획
1장 _경상도 방언과 강원도 방언의 경계 655
2장 _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의 경계 659
3장 _경상도 방언과 충청도 방언의 경계 668
4장 _전라도 방언과 충청도 방언의 경계 678
5장 _함경도 방언과 강원도 방언의 경계 688
6장 _함경도 방언과 평안도 방언의 경계 697
7장 _평안남도 방언과 황해도 방언의 경계 707
8장 _경기도 방언과 인접한 여러 도 방언의 경계 714
9장 _결론 722
역자 참고문헌 _725
딸린 그림 _728
찾아보기 _738
- 용어 찾아보기
- 인명 찾아보기
책속에서
1장 한국어 방언 연구의 역사
【해설】 한국어 방언에 대한 연구는 당시까지 이루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음을 지적한 후 이전 시기에 한국어의 방언 자료를 기록한 몇몇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크게 한국인에 의한 것, 중국인에 의한 것, 일본인에 의한 것, 서양인에 의한 것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한국어는 근래까지 내외 학자들의 주의를 그리 끌지 못한 언어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방언 연구와 같은 것 역시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한국인은 예전부터 한학(漢學)을 숭상하여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각종 기록은 거의 대부분 한문으로 표기되었을 뿐 한국어로 기록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언어를 속어(俗語)로 멸시했으며 굳이 이것을 문학어로 사용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한국어 및 그 방언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이게 되었다. 그 사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사람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그의 저서 ≪寒竹堂涉筆≫에서 <新羅方言>이라는 제목을 붙여 다음과 같이 경상남북도 지방의 방언을 기재한 바 있다.
“지방의 官長이 方言을 알면 그 지방의 俗情을 알 수 있다. 내가 처음 沙郵에 부임했을 때 아전이나 하인들의 말을 얼핏 듣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는 대개 그들이 신라의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또한 나의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얼마 지나서는 나도 자못 방언을 익혔으므로 마침내 백성을 대하는 데 방언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 번은 還穀을 거두어 창고에 들일 때 시험 삼아 종(下隷)들에게 방언으로 분부하기를 ‘居穉(거치)가 온전치 않으면 羅洛(나락)에 물이 새게 된다. 請伊(청이)로 까분 뒤에 沙暢歸(사창귀)로 단단히 묶어서 丁支間(정지간)에 들여 놓아라’라고 했다. 마침 서울에서 온 손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입을 가리고 웃으면서 무슨 말이냐고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풀어 주었다. 居穉(거치)는 섬(?)을 말하고 羅洛(나락)은 벼를 가리키고 請伊(청이)는 키(箕), 沙暢歸(사창귀)는 새끼, 丁支間(정지간)은 곳간을 가리킨다.”
또한 이덕무와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北塞記略≫에서 ‘巫覡(무당)’을 ‘師[su?-su?ŋ]’, ‘門(주택)’을 ‘烏喇[o-ra]’, ‘高阜(언덕)’를 ‘德[t?k]’, ‘邊涯(부근)’를 ‘域[j?k]’, ‘墻壁(벽)’을 ‘築(담) [t?uk-(tam)]’, ‘淺灘(여울)’을 ‘膝[?su?l]’, ‘猫(고양이)’를 ‘虎樣[ko-n?ŋ-i]’, ‘貰牛(種牛를 남에게 대여하고 그 송아지를 무상으로 얻는 것)’를 ‘輪道里[jun-du-ri]’, ‘鳥網(새를 잡는 그물)’을 ‘彈[t?an]’, ‘南(남쪽)’을 ‘前[alp, ap]’, ‘北(북쪽)’을 ‘後[tui]’,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多路岐[to-ro-gi, to-re-gi 등]’, ‘썰매의 한 종류’를 ‘跋高[pal-gi, pal-gui]’, ‘두만강에서 난 물고기의 일종’을 ‘夜來[ja-ri, ja-rui]’라고 하는 등 함경북도 방언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한국어 방언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거론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일본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는 꽤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특별히 방언 연구에 뜻을 둔 것은 없다. 오다 간사쿠(小田管作)의 저서인 ≪象胥紀聞拾遺≫(1841년)에서 경상남도에서는 무(大根)를 ‘무시’라고 한다는 사실이 쓰여 있지만 물론 한국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 그 후 한국어 지방 발음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약간 언급한 것이 있지만 새삼스레 여기서 특별히 적을 만한 것은 없다.
중국인으로서는 한나라 때 양웅(揚雄)이 <揚子方言>에서 洌水 부근의 방언을 거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본래의 한국어가 아니라 그 지방의 중국어 방언을 표기한 것이다. 또한 송나라 때 손목(孫穆)이 지은 ≪?林類事≫는 고려 시대의 한국어를 수집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것은 고려 왕도(개성)의 언어를 표기한 것으로 지방의 방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명나라 때의 ≪華夷譯語≫에도 다수의 한국어 어휘가 발견되지만 이 역시 방언적 색채를 진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서양인의 연구이다. 그들이 한국어 연구에 대해 뜻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엽 이후인데 방언에 대해서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영국인 항해자 W. R. Broughton이 1797년 10월 부산 지방에서 이 지방의 방언 단어 38개를 채집했고, B. Hall이 1816년 한국의 서해안 지방을 탐험하며 남항할 때 그 지방 방언 단어 28개를 채집한 것 등은 단어의 수에서는 극히 빈약하지만 어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그 후 서양인의 언어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이 저술한 한국어에 관한 사전이나 문법 중에 우연히 방언적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귀중한 방언 자료가 뜻하지 않게 우리 눈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Poutzillo가 펴 낸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대역사전 속에 포함된 어휘 중 상당수는 함경도 방언에 속한다. 또한 만주에서 선교하며 중국어와 한국어 연구에 종사한 J. Ross 및 J. MacIntyre 두 사람의 한국어에 관한 문법이 평안도 방언의 어법인 것 등도 그 예이다.
제2장 한국어 방언 연구의 필요성
【해설】 한국어 방언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한 문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살아 있는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언어학이나 방언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앞의 것에 논의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해 방언을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한국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언어이며 어떤 언어와 같은 계통인지 등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규명에 있어서는 우선 한국어 자체의 역사적 변천의 자취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한 편으로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역사적 변천을 연구하고자 함에 있어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는가 하면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생각건대 오래 전 한국에는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고유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 시대 초기까지 사람들은 한자를 차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몰랐다. 그 불편함과 부정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대략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인 1446년(세종 28)에 이르러 조선 고유의 문자 한글 28자를 창제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한국어를 여실히 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종래에는 오로지 한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불완전하게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렀지만 한글 창제 이후에는 명사, 수사, 조사, 부사 등 독립적인 뜻을 가진 말 이외에 형용사, 동사, 조동사의 어미 변화 등 모든 언어 현상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졌다. 그 이후 일반 사람들이 누린 편리와 복지는 말할 것도 없으며 후세 언어 연구자가 느끼는 감사의 마음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글 반포 당시 실제로 이 문자가 이용된 것은 두세 종의 문학서나 어학서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불경 언해서들이며 여러 방면에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은 세간에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무학자(無學者)와 부녀자나 즐기는 문자로 경시됨으로써 문자의 활동력은 현저히 위축되고 한글에 의한 숭고한 문학 등은 출현할 여유가 없었다. 또한 일상 생활에 사용되었음직한 풍부한 어휘의 상당 부분도 문자로 기록할 수 없었다. 오늘날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한국어 사전을 보면 어휘 수가 빈약한 것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주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에서의 방언 채집 작업이 긴급하게 필요함을 느낀다. 한국어 방언 채집의 목적이 상술한 바와 같이 새롭게 얻은 자료로서 종래 어휘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밖에 더욱 중대한 사명은 살아 있는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언어학 또는 방언학의 발달에 무엇인가 공헌을 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3장 한국어 방언 조사 경과
【해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1931년 6월 25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열린 ‘京城帝大方言會’에서 ‘私の朝鮮方言調査の經過’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 내용은 조윤제가 정리하여 같은 해 12월에 간행된 ≪靑丘學叢≫ 6호에 실었다. 강연의 제목이 이 장의 제목과 거의 같고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1931년의 강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장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신의 방언 조사 결과물과 방언 관련 논저 목록을 제시했으며 방언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저자는 1911년 한국에 건너와 직(職)을 조선총독부에 바치고 교과서 편찬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원래 목적은 한국어 연구에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실제 화법을 배우고 각종 문헌을 섭렵해서 한국어 연구에 종사했지만 이것의 완전한 연구를 기하기 위해서는 방언 연구가 절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저자는 조선총독부에 있든 경성제국대학에 있든 공무 중 짧은 휴가를 이용해 몇 번이나 장단기의 한국 여행을 시도하였고 약 20여 년에 걸쳐 대단히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각 지역에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1933년 동경제국대학으로 옮겼으나 해마다 공무로 서울(京城)에 갈 기회를 이용해서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지역에 출장을 가 이전 조사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저자는 여행 때마다 그 조사 결과를 잡지 등에 공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단편적인 보고는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10여 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 편으로 이러한 자료의 총괄적 연구로서 각종 시론을 발표했는데 그 중 잡지나 논문집 등에 발표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언 조사에 있어 저자가 취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우선 조사 지점은 각 군청 소재지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그 외의 지점에도 이르렀다. 오늘날까지 조사할 수 있었던 지점의 수는 한반도 전역을 통해서 200곳 이상에 다다르는데 그 중에는 필요에 따라 재조사를 한 지점도 적지 않다.
다음은 제보자의 종류인데 원칙적으로 보통학교 상급 남녀 생도 약 10명을 골랐다. 조사의 목적을 생각하면 노인, 특히 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사람들은 긴 시간의 조사를 견디지 못하고 질문의 대답에 요령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생도를 이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 항목을 기입하는 조사지인데 이것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작성했다. 원래 유럽의 여러 언어는 각 언어에 따른 방언 조사지가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전부터 여러 종류의 방언 채집부라고 부르는 것이 사용되어 왔으나 그것들을 그대로 한국어 방언 채집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어는 그 특유의 언어 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는 종래 이러한 종류의 조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자가 최초로 조사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 우선 음운, 어휘, 어법상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손수 선택하고 여행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처음에는 어휘의 수가 극히 적었지만 점차 그 수를 늘려서 지금은 600 내지 700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말해야 되는 것은 조사 여행에 관해서이다. 한국의 각지는 오늘날 철도나 해운도 발달하고 도로망도 완비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십수 년 전에는 교통 기관이 매우 미흡하고 겨우 말(馬)로 도읍(都邑) 사이의 여행을 시도하는 데 불과했다. 따라서 조사 연월이 길었던 것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오늘날까지 조사를 계속 해 왔지만 이는 원래 일시적인 흥미에서 출발한 것일 뿐 학문적 기초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여러 가지 결함이나 미비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저자는 이러한 결함이나 미비점이 완전히 제거되어 한국어를 기초로 한 방언학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날이 오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일본 학술진흥회의 커다란 지원 아래 1937년 10월부터 향후 3년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어 방언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이에 후학인 공동 연구자 고노 로쿠로(河野六郞)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현지 답사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