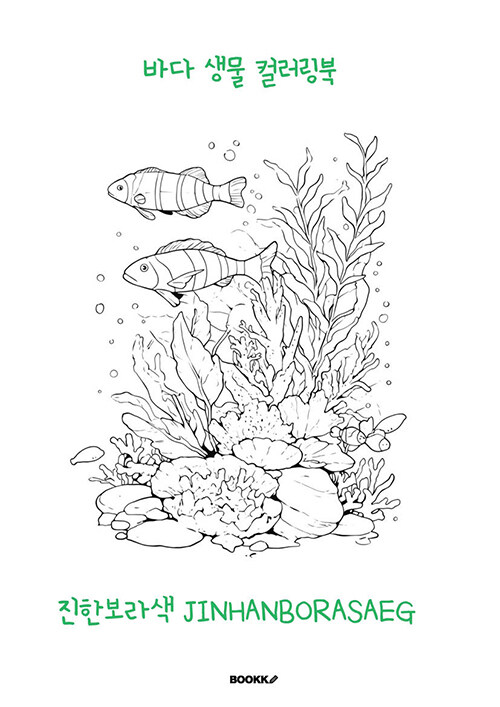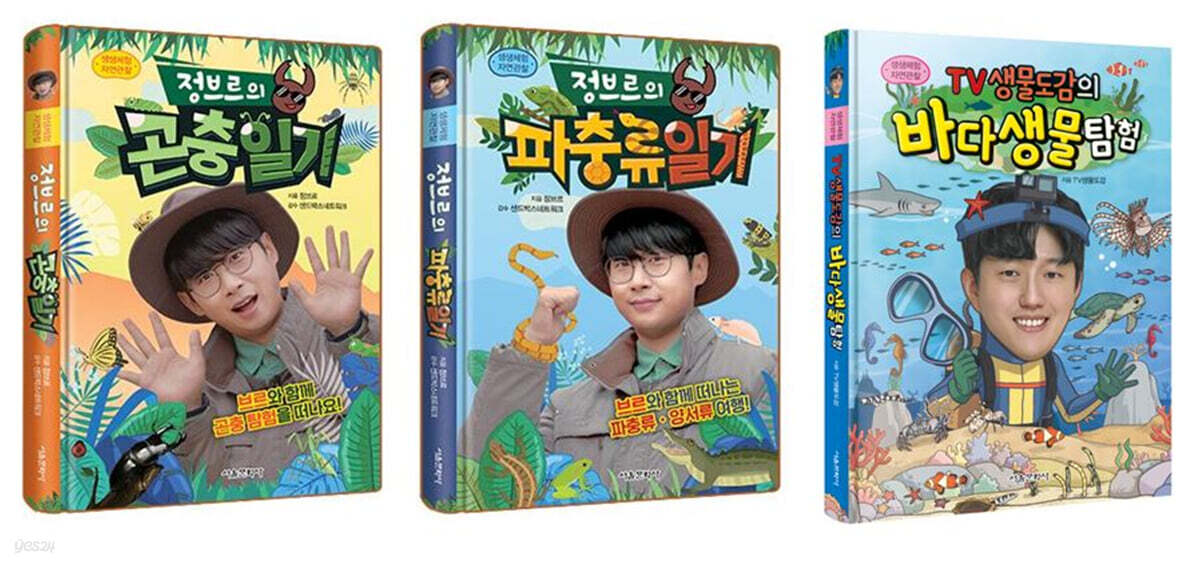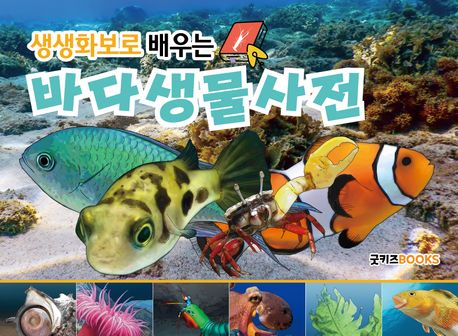우리는 갯벌에 산다 (갯벌에서 건져 올린 바다 생물 이야기)
김준 | 이글루
18,000원 | 20250829 | 9791198788467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의 맛은
갯벌이 만들어낸 맛이다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 32종, 바지락에서 꼬막까지, 매생이에서 다시마까지!”
★ 갯벌을 날다, 짱뚱어
★ 외계인을 닮았다, 개소겡
★ 개의 불알을 닮았다, 개불
★ 제주 해녀가 사는 법, 소라
★ 갯벌에서 건져낸 보석, 개조개
★ 어촌의 곳간을 책임지다, 바지락
★ 갯벌을 지키는 토종의 맛, 매생이
갯벌은 농촌의 논밭처럼 어민들의 텃밭이다. 갯벌은 수천 년 동안 파랑 작용과 조석 차로 인해 바닷물이 굴곡이 심한 해안에 이르고, 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역에 흙과 모래와 영양염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바다 벌판’이다. 서해에서 살아가는 바다 생명들의 70퍼센트가 갯벌에서 산란하고 자란다. 그래서 갯벌은 생물자원의 보고(寶庫)이며 지구상에 있는 완전성을 갖춘 마지막 생태계다. 람사르습지를 지정해 보전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습지보전법을 제정해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갯바위에서 미역ㆍ톳ㆍ우뭇가사리를 뜯고, 갯벌에서 바지락ㆍ꼬막ㆍ백합ㆍ동죽을 캔다. 그리고 얕은 바다에서 김ㆍ매생이ㆍ파래 등을 맨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갯벌은 섬살이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봄이면 바지락, 여름이면 미역과 톳, 가을이면 낙지, 겨울이면 굴 등 사시사철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그것이 갯벌의 힘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해안 개발 등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었다. 거기에 갯벌을 사유화하고 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이에 갯살림은 무너졌다. 갯벌의 살림살이는 인간과 생물과 물새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바다 살림이다.
갯벌은 인간의 곡식 창고이기 이전에 바다 생물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였다. 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들도 산란철이 되면 갯벌로 나와서 알을 낳았다. 갯벌에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펄과 모래와 돌, 다양한 해초류가 생활하고 있어 어린 어패류가 먹고 놀고 생활하기 좋다. 때로는 도요물떼새들이 모여들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다. 수많은 새가 심한 먹이 경쟁 없이 갯벌에 기대어 공존할 수 있었고, 작은 규조류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이 갯벌에 기대어 함께 살아왔다.
김준의 『우리는 갯벌에 산다』는 갯벌 생물들을 통해 갯벌의 역사와 문화, 어민들의 삶, 갯벌 음식, 슬로푸드 운동, 생태계의 변화, 기후변화 등을 살펴본다. 갯벌 생물들은 오랫동안 갯벌에서 살아왔고,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했다. 인간은 갯벌 생물에 기대어 살아왔다. 갯벌은 생물과 인간이 공존공영하며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제1부 ‘갯벌은 삶이다’는 김, 미역, 감태, 매생이, 톳, 모자반, 우뭇가사리, 다시마 등 8종, 제2부 ‘갯벌은 단단하다’는 굴, 꼬막, 동죽, 백합, 바지락, 가리맛조개, 개조개, 홍합 등 8종, 제3부 ‘갯벌은 다채롭다’는 짱뚱어, 망둑어, 개소겡, 소라, 피뿔고둥, 전복, 고둥, 군소 등 8종, 제4부 ‘갯벌은 푸르다’는 꽃게, 민꽃게, 칠게, 낙지, 해삼, 멍게, 미더덕, 개불 등 8종으로 모두 갯벌 생물 32종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