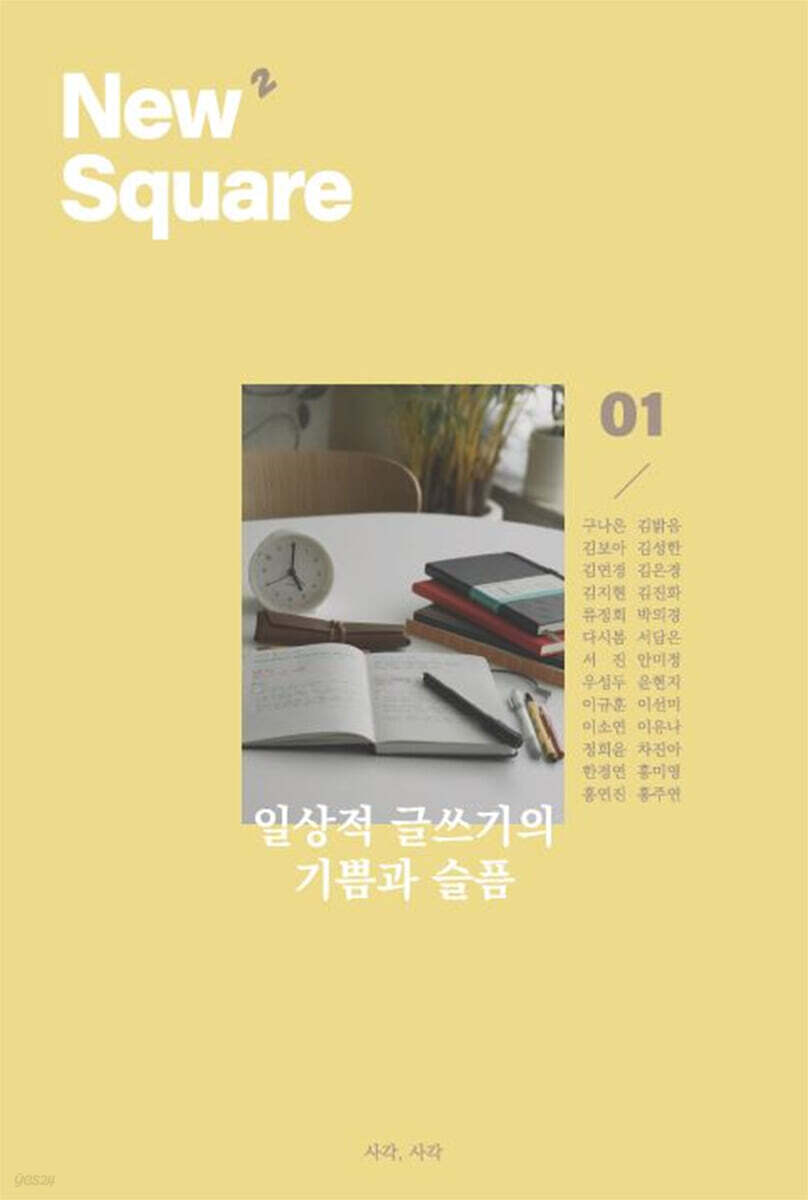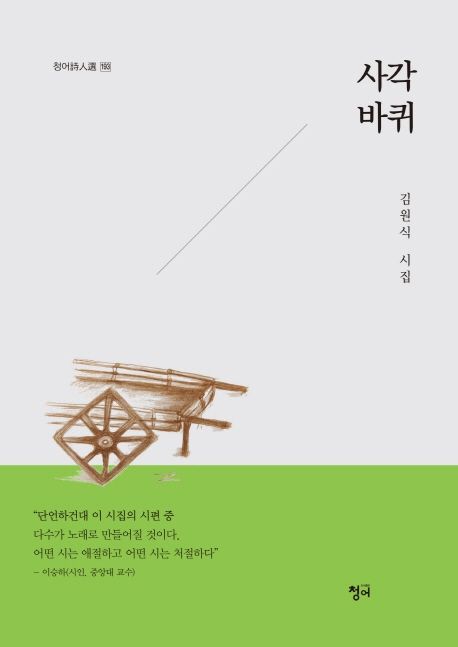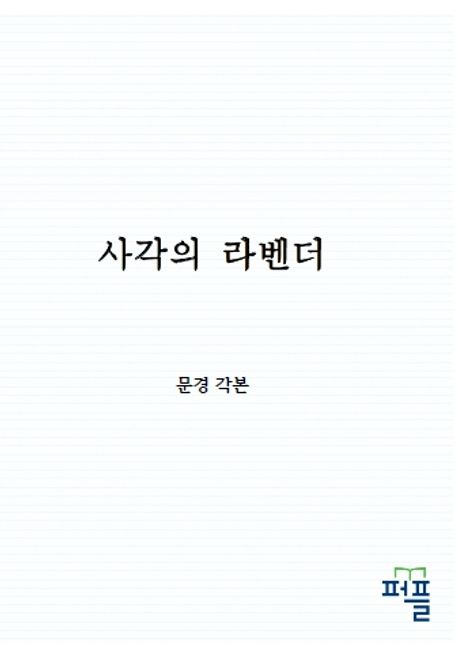사각의 라벤더 (원희경 장편소설)
원희경 | 하모니북
18,000원 | 20240327 | 9791167471710
이서와 서아.
스무 살과 스물두 살의 이야기.
두 여자아이는 머리 길이부터 생김새까지 정반대이다.
다섯에 길거리로 나오고, 일곱에 보금자리를 버린다.
열다섯에 가정을 잃고, 열일곱에 아이를 낳는다.
갈수록 혼자가 익숙하면서도 의지할 사람을 찾는다.
스무 살이 된 이서는 빵집 마을의 가수가 된다.
스물두 살이 된 서아는 빵집 다락방의 주인이 된다.
빵집 주인 할머니의 ‘손녀’가 된 두 여자아이.
할머니의 마지막 인연으로 어른이 된다.
[본문 속으로]
“아가야.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줄게, 기억해 둬. 배고프면 와도 좋아. 알겠지? 약속하자. 꼭 와. 지금 와도 좋고, 당장 내일 배고플 수도 있잖아?”
아내는 단발에게 바짝 다가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눈에 서린 집착은 새끼손가락의 자상함과는 판이했다.
“그건 내가 천천히 말할게. 당신은 먼저 집에 가서 쉬어.”
“저기, 엄마라고 불러도 돼… 요?”
단발은 어색한 존댓말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맞닿은 아내의 피부는 차가웠다. 미약한 체온은 뱀을 감은 것 같았다. 모녀를 맹세하는 약속과는 다르게 손가락의 감촉은 강렬하게 상극을 알렸다. 아내 또한 느꼈을 것이다.
- ‘#3’ 중에서
“난 인형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마냥 귀엽지만 자존심이 센 편인 서아는 제대로 화가 났다. 심술도, 삐친 것도 아니었다. 일곱 살의 나이도 충분히 원통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분노할 줄 알았다. 그 이유가 종종 사소하다 보니, 설령 부모여도 일곱 살의 감정을 간과할 때가 있는 것이었다.
테라스에서 보이는 마당은 널찍하고 잔잔했다. 어두운 밤이 된 지금, 서아의 빵처럼 새카만 짙은 점 하나가 집에서 나와 움직였다. 목적지는 명료해 보였다. 확고한 동선으로 마당을 등졌다.
서아는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을 앞으로 안고 대문으로 뛰었다.
‘#4’ 중에서
서아는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를 다시 확인했다. 두 줄이었다. 쓰레기통으로 가서 안에 든 것을 전부 꺼냈다. 맨 밑에 테스트기를 던지고 그 위로 쓰레기를 쌓았다. 집 밖으로 나갔다.
남자아이가 방에서 나왔다. 서아의 인기척을 듣고 반갑게 말을 걸려 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숨죽이고 있었다. 쓰레기통에 신경질적으로 처박은 게 어떤 것인지 전혀 짐작 가지 않았다. 테스트기를 확인했고, 두 줄이었다. 한 줄과 두 줄 중 어떤 게 임신인지 몰랐다. 다만, 상식으로는 아마 두 줄이 임신이었던 것 같았다. 눈앞의 현실보다는 자신의 상식을 의심하며 임신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서아가 돌아왔다. 테스트기를 든 남자아이를 봤다. 단번에 낚아채고 등졌다. 화를 내거나 입을 꾹 닫지는 않았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사과부터 했다.
“숨겨서 미안. 말하려고 했어.”
- ‘#6’ 중에서
“아직도 아내라고 부르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고 아직도 좋아하니까. 근데 내 아내는 네가 커버려서 싫대. 내 아내가 내 딸을 불청객으로 생각하고, 내 딸은 내 아내를 정신병자라고 해. 서아야, 공부하느라 힘든 거 아는데, 부탁할게. 잠시만이야. 괜찮아질 거야. 우리 세 가족은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그동안 내 편 좀 해 줘.”
양아빠는 아주 직설적으로 의사를 전했다. 덕분에 이서는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실망하지 않았다. 양아빠는 여전히 이서의 보호자이니 슬퍼할 것도 없었다. 명치에서 들끓으며 순식간에 턱밑까지 차오른 감각은 죄책감이었다.
“자리 비켜 줄게. 편하게 마셔.”
이서는 현관문을 조금 열고 밖을 확인했다. 상자도 사람도 없었다.
“아빠 미안.”
- ‘#7’ 중에서
“할머니. 가족 맞죠? 시비 같은데.”
채연은 시선을 큰아들에게 고정한 채 할머니에게 물었다.
“가족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 일을 도와준 건 고마운데, 지금 어머니 건강 상태로 이러고 계신 것 자체가 고집입니다. 옆에 계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가서 앉아. 너 얘 알아? 초면에 왜 시비야.”
할머니가 경고했지만 큰아들은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항상 서아 양을 핑계 삼았거든요. 이제 제대로 상의하려고요.”
“말 다 했어요?”
“서아 양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해요. 굳이 제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 서아 아닌데.”
작은아들은 자신의 예감이 맞는다는 걸 확인했다. 눈썰미가 적중하자 뿌듯한지 바로 큰아들에게 귓속말했다.
“역시 맞아. 형, 서아 그 아이는 무척 예쁘다고 했어.”
“저기요. 들려요.”
- ‘#13’ 중에서
이서의 연주는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듯 달라졌다. 스피커와 기타가 있고, 항상 그렇듯 그 옥상이었다. 확연히 다른 점은 스피커의 음량이 이전보다 훨씬 컸다. 이서 본인도 스피커 근처로 가면 눈을 질끈 감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음량을 더 키우더니 기타 줄을 강하게 튕기며 옥상을 거닐었다. 오자마자 이런 소음공해를 시작했고, 고막이 망가져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야상 점퍼의 안주머니를 확인했다. 뒤적거리고는 당황했다. 점퍼를 벗어서 주머니를 다 확인하고 뒤집어서 털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코트에 있나.”
옥상 문을 열고 들어온 이서는 큰 발소리와 함께 사람 실루엣을 봤다. 멈칫했지만, 즉시 따라 내려갔다. 서아와 마주쳤다.
“미안. 여기서 이렇게 노래하는 건 이서 너밖에 없다고 해서.”
서아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맞아. 사실 널 촬영하고 싶었어. 근데 정말 몰래 찍으려던 건 아니야. 허락받으려고 했어.”
- ‘#14’ 중에서
이서는 운동화를 새로 샀다. 옥상 문 앞에서 노숙하다가 뛰어 내려가기를 반복하던 중 신발이 망가졌다. 세뇌당하는 것 같았다. 침낭에 몸을 묻든, 창고에 있든, 층계참 부근에 있으면 어김없이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방향은 정확히 계단 아래였다. 자신에게 욕지거리하며 귀를 막았다. 머리를 좌우로 연신 흔들다가 벽에 박았다. 한참 발작하고 나면,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쫓을 수밖에 없었다. 1층까지 질주한 뒤 정문과 뒷문을 보면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골목 옆에 숨는 버릇이 생겼다. 빵집 안에 있다가도 누군가 쳐다보는 기분이 들면 밖으로 나가 벽에 기댔다. 골목에서 명확한 인기척이 들리면 주저 없이 돌아 들어갔고, 사람은커녕 바닥에 쓰레기조차 미동도 없었다. 억측을 거듭할수록 감시는 심해졌다. 서아는 새벽에도, 폭우 날씨에도, 벽에 붙은 채 골목을 감시했다.
- ‘#19’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