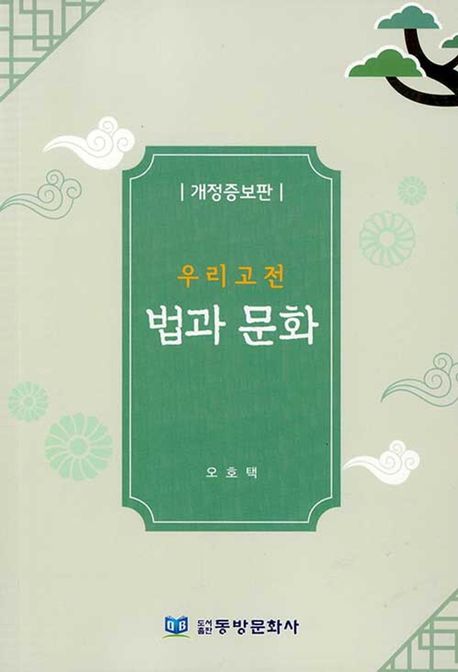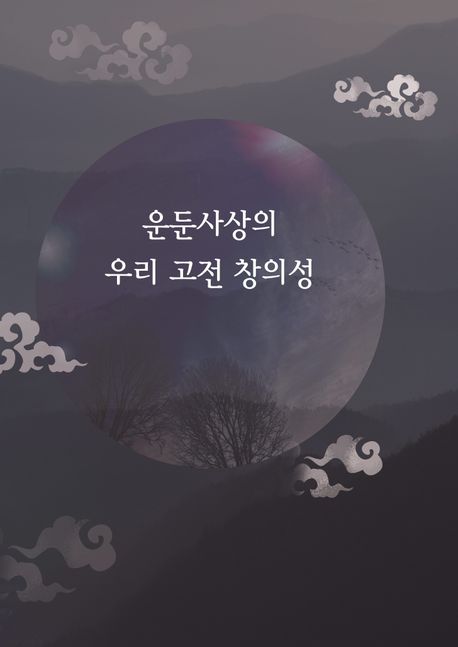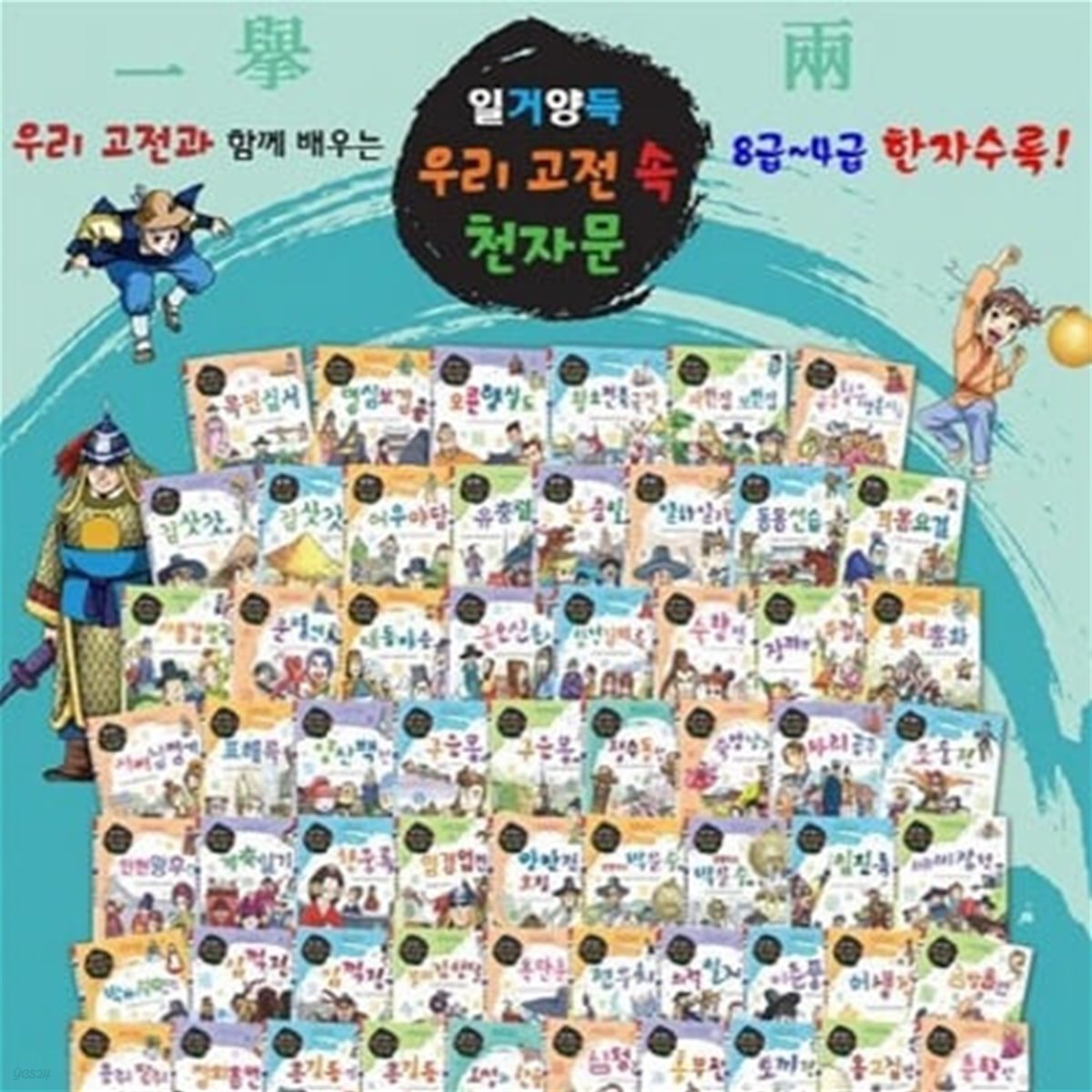우리 고전 명시
김영석 | 문학의숲
12,600원 | 20180914 | 9791187904113
자연과 계절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며
사색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고전 시들의 향연
시인이며 국문학자인 김영석 교수가 고조선부터 전해 내려온 시와 고구려, 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쓰인 한시들 중 주옥같은 명시들만을 골라 옮겼다. 『한 번은 읽어야 할 우리 고전 명수필』에 이은 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한 번은 읽어야 할 우리 고전 명시의 향연.
우리의 고전문학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 고전 시들은 현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없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편역자는 우리나라 한시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고 알려진 『대동시선』에서 추려 뽑아 옛사람들의 감수성과 인간관계, 생활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쉬운 우리글로 옮겼다.
정치?자연?생활 환경 등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며 온갖 기계음에 둘러싸여 마음마저 삭막해져가는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잠시나마 옛시에 젖어보고, 자연과 계절을 느끼며 사색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대별 분류와 간단한 저자 약력을 통해
242수의 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시는 시대별로 고조선?고구려?신라,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로 구성했다.
고려 이전의 시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고조선의 「공후인」과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신라의 설요, 김지장, 최치원, 박인범, 최광유 등 7명의 시 13수를 모았다. 고려시대의 시는 최충, 정지상, 김극기, 이인로, 이규보, 이색, 정몽주 등 27명의 시 50수를 모았다. 조선시대 전기의 시는 정도전, 김시습, 김종직, 이매창, 이달, 권필 등 39명의 시 72수를 모았다. 조선시대 후기의 시는 허난설헌, 장유, 정약용, 최익현 등 76명의 시 107수를 모았다.
총 242수의 시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사람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들을 감상할 수 있다.
매 시에는 저자들의 간략한 약력을 적어놓아 시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했다.
글을 쓸 줄 몰랐던 더 많은 사람들의 노래가 전해지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남겨진 시들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며 예나 지금이나 자연과 사람들과의 따스한 관계 속에서 삶의 고단함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번역한 시와 함께 한자로 된 원시와 원시의 자구풀이도 있어서 원시를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의 마지막에는 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자명, 원시(한시), 역시(번역시)의 찾아보기를 두었다.
정쟁에 유배를 당하거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 시골에서 작은 벼슬을 한 사람, 여인, 기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배움을 얻고 사람을 그리워하며 삶의 고단함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들이 펼쳐진다.
자연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
12세에 당나라에 유학해 과거에 급제하고 신라로 돌아와 한림학사가 되었던 최치원은 마음의 거울에 대한 시를 지었다. “여우는 미녀가 될 수 있고/너구리 역시 선비가 될 수 있는 것.……/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싶은가./바라건대 마음의 거울을 닦고 보소서.(최치원의 「옛말의 뜻」)”
고려시대 문장으로 동국의 으뜸이었던 이규보는 물고기를 보고 시를 지었다. “물에 떴다가 잠겼다가/괴로워 어쩌지도 못하는 물고기/사람들은 멋대로 즐거이 논다고 하네./가만히 생각하면 잠시도 쉴 틈 없나니/겨우 어부가 돌아가면/백로가 또 엿보네.(이규보의 「물고기」)”
조선전기 단종이 왕위를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책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불교에 들어간 김시습도 자연에서 배움을 노래했다. “……/꽃이야 피든 지든 봄이야 알 리 없고/구름이 가건 오건 산은 다투지 않네./말하노니 세상 사람들아, 부디 기억해 두라./기쁨은 평생에 어디서나 얻을 수 있나니.(김시습의 「잠시 개었다 비 오고」)”
조선후기 문과에 급제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장유는 이익과 명예를 좇는 사람들을 시로써 비판했다.“구더기는 더러운 곳에서 생겨나/죽을 때까지 그곳을 못 떠난다./어찌 알랴, 이 천지 안에/다시 청정한 곳이 있는 줄을./……/이익과 명예를 찾는 굴속은 어지럽고/생선 가게는 썩는 냄새 진동하는데/여기서 빠져나올 기약도 없어/뼈까지 취한 마음 어둡게 헤매인다.……(장유의 「거리낌없는 말 3」)”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고단함을 노래한 시
고려 인종때 벼슬에 있다가 묘청의난에 죽임을 당한 정지상은 이별의 아픔을 시로 남겼다. “비 개인 긴 둑에 풀빛이 짙고/그대 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 울리나니/이 대동강 물 언제 마르랴./해마다 이별의 눈물/저 푸른 물결에 보태는 것을(정지상의 「대동강」)”
조선전기 선조 때 과거에 급제했던 유몽인은 고단한 백성의 삶을 노래했다. “가난한 여자가 베를 짜면서/두 뺨 흥건히 눈물을 흘리네./애초에 그 겨올 옷 님을 위해 시작했네./이튿날 아침 세금을 독촉하는 관리에게/어쩔 수 없이 그 베를 찢어 주었는데/한 관리가 겨우 돌아가자/또 다른 관리가 찾아오네.(유몽인의 「이천에서」)”
조선후기 황해감사였던 김니는 벼슬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그 소감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학의 다리 길고 오리 다리 짧아도/모두 그것들을 새라 부르고/오얏꽃 희고 복사꽃 붉어도 모두 꽃이네./벼슬이 낮아 장관 꾸지람 많이 들으니/흰 갈매기 저 물결로 돌아감만 못하리.(김니의 「소감」)”
나라를 생각하는 의로운 마음을 노래한 시
공민왕 때 문하시중이었고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정몽주는 나랏일하며 그 소회를 시로 남겼다.“물나라에 봄빛이 움직이는데/하늘 끝 나그네는 나아가지 못하네./풀은 어디서나 똑같이 푸르고/……/사내장부가 사방에 다니며 뜻을 펴는 것은/공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네.(정몽주의 「일본에 사신으로 가며」)”
조선전기 무관이었던 남이는 그 기개가 느껴지는 시를 지었다.“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앤다./사나이 이십 세에 나라 평정 못하면/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남이의 「북을 정벌할 때」)”
조선후기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일본군의 반격에 패하여 처형당한 전봉준의 백성 위한 마음을 노래한 시도 있다. “때를 만나서는 천지가 나와 함께했지만/시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네./백성을 사랑하고 정의 위한 일 무슨 잘못이랴./나라 위한 붉은 마음 그 누가 알리오.(전봉준의 「죽음」)”
을사조약 후 전라북도 태안에서 거병하였으나 패전해서 대마도에 유배되었다가 단식으로 항거하다 죽은 최익현도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백발로 시골에서 오래 살았으니/초야에서 충성스런 사람 되려 했네./사람이면 모두 왜적을 쳐야 하거늘/어찌 꼭 고금을 물어야 하리.(최익현의 「백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