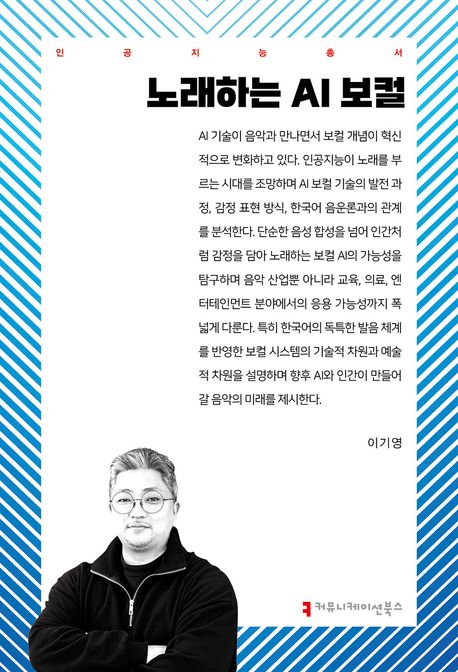노래하는 아시아 (문화유산으로서의 트로트와 엔카)
박진수, 민경찬, 박애경, 손민정, 야마우치 후미타카 | 역락
27,000원 | 20250918 | 9791173961960
트로트와 엔카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형성된 정서의 축적이며, 시대의 상흔을 감내해 온 대중의 기억이자 표현입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냉전과 분단, 개발과 민주화, 이산과 귀환이라는 역사의 굴곡 속에서 이 노래들은 특별한 감정의 언어로 기능하며, 각기 다른 지역・세대・계층의 삶을 매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로트와 엔카는 단지 과거의 산물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변주되고 재해석되며 살아 움직이는 문화적 실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서 노래하는 아시아―문화유산으로서의 트로트와 엔카는 모두 세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트로트와 공동체의 기억」은 트로트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적 정서와 기억을 형성하고 매개해 왔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민경찬은 창가(唱歌)라는 장르를 통해 개항기부터 식민지기에 이르는 시기의 감정 구조와 계몽의 정치학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박애경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기의 트로트를 ‘보수적 장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당대 민중의 감성과 욕망을 담지한 중요한 대중문화로 재조명합니다. 손민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트로트가 대중의 불안과 상실을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 기억의 정치성을 고찰합니다. 현재 타이완에서 활동 중인 일본 국적의 트로트 연구자 야마우치 후미타카는 해방 후 한국에서 ‘왜색가요’라는 비판 담론이 트로트의 형성과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며, 문화정치적 긴장의 맥락을 드러냅니다.
제2부 「대중음악과 ‘전통’의 창조」는 대중음악이 어떻게 ‘전통’을 구성하고, 그 구성 과정이 다시 대중음악의 정체성과 위상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를 동아시아 각지의 사례를 통해 탐색합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형성과 전개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며, 음악의 구조뿐 아니라 그 배후에 놓인 감정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찰합니다. 와지마 유스케는 ‘엔카(演歌)’와 ‘민요’라는 개념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짚으며, 엔카라는 장르가 일본 대중음악의 정체성을 구성해 온 담론의 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장유정은 오아시스레코드를 중심으로 트로트의 유통 구조와 음악적 형식의 변화를 추적하며, 산업과 감성의 교차 지점을 실증적으로 드러냅니다. 천페이퐁은 타이완 엔카(演歌)가 사회 변동 속에서 어떻게 표현 양식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타이완 내부의 언어・정치・지역 정체성의 교차로에서 세밀하게 고찰합니다.
제3부 「횡단하는 대중음악」은 트로트와 엔카가 초국가적 경계 속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해석되며 변형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준희는 재일조선인의 음악 실천을 통해 1945년부터 1965년 사이 일본 내에서 대중음악이 갖는 정체성의 교차 방식과 정치적 성격을 조명합니다. 타이완의 황춘밍은 중국에서 타이완 대중가요가 ‘타이완적 감정 구조’로 소비되는 양상을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라는 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문화의 경계와 내셔널리즘이 감정과 어떻게 연루되는지를 드러냅니다. 김성민은 트로트가 20세기 후반 한국의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재범주화되었는지를 살피며, 대중음악의 정치성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수는 이들 세 지역 사례를 종합하여, 트로트와 엔카가 단일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상호 교섭과 감정의 변형을 통해 형성되어 온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장르임을 강조합니다.
노래하는 아시아―문화유산으로서의 트로트와 엔카가 동아시아 대중음악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아시아 각 지역 간 문화적 공존과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책이 연구자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비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