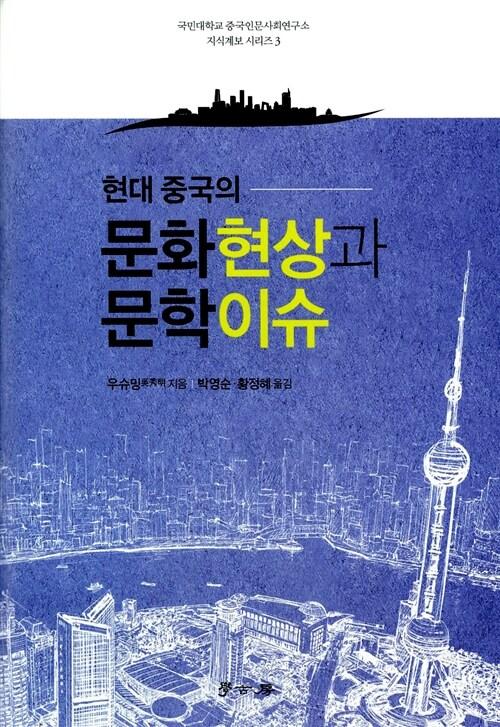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기초과학/교양과학
· ISBN : 9788956242569
· 쪽수 : 364쪽
· 출판일 : 2006-09-29
책 소개
목차
1. '봉위규얼(奉爲圭?)'과 규표(圭表)
2. '일촌광음일촌금(一寸光陰一寸金)'과 해시계
3. '일각천금(一刻千金)'과 물시계
4. '내용거맥(來龍去脈)'과 주거환경
5. '등당입실(登堂入室)'과 가옥의 구조
6. '방예원조(方?圓鑿)'와 목구조(木構造)의 장부맞춤
7. '구심투각(鉤心鬪角)'과 건축의 두공(枓?)
8. '명수잔도, 암도진창(明修棧道, 暗度陳倉)'과 잔도(棧道)
9. '모범(模範)'과 청동기 거푸집
10. '노화순청(?火??)'과 고온 측정 기술
11. '백련성강(百?成?)'과 백련강(百??) 기술
12. '명경고현(明鏡高?)'과 투광경
13. '옥불탁, 불성기(玉不琢 不成器)'와 고대의 옥 가공법
14. '청출어람(靑出於藍)'과 염색 기술
15. '일월여사(日月如梭)'와 베틀의 북
16. '사사입구(??入?)'와 직기(織機)의 바디
17. '금상첨화(錦上添花)'와 채색 견직물 직조 기술
18. '천리지제, 궤우의혈(千里之堤, 潰于蟻穴)'과 전국(戰國) 시대의 제방(堤防)
19. '수도거성(水到渠成)'과 운하(運河) 정비
20. '포옹관휴(抱瓮灌畦)'와 두레박
21. '규구(?矩)'의 의미 변천
22. '권형(?衡)'의 의미 변천
23. '유좌지기(宥坐之器)'와 무게중심
24. '천변만화(千變萬化)'와 로봇
25. '간풍사타(看風使舵)'와 선박의 키
26. '가경취숙(駕輕就熟)'과 마차 매는 법
27. '자상모순(自相矛盾)'과 창, 방패
28. '도광검영(刀光劍影)'과 도검(刀劍)
29. '강노지말(强弩之末)'과 쇠뇌
30. '초연미만(硝煙彌漫)'과 화약
31. '오곡풍등(五穀?登)'과 오곡의 명칭
32. '인지제의(因地制宜)'와 농업 생산
33. '적현신주(赤?神州)'와 대구주설(大九州?)
34. '오호사해(五湖四海)'와 호수, 바다
35. '창해상전(滄海桑田)'과 해륙 변천
36. '기인우천(杞人憂天)'과 하늘에 대한 인식
37. '소아변일(小兒辯日)'과 천문학 이론
38. '두전성이(斗轉星移)'와 별자리
39. '칠월유화(七月流火)'와 대화(大火) 관측
40. '이관규천(以管窺天)'과 관측기
41. '만사구비, 지흠동풍(萬事俱備, 只欠東風)'과 제갈량(諸葛亮)의 기상(氣象) 지식
42. '해시신루(海市蜃樓)'와 신기루
43. '목미오색(目迷五色)'과 색의 분산
44. '각주구검(刻舟求劍)'과 상대성 이론
45. '일발천균(一髮千鈞)'과 역학
46. '황종대려(黃鐘大呂)'와 악률(樂律)
47. '동성상응(同聲相應)'과 공진(共振) 현상
48. '백락상마(伯樂相馬)'와 준마(駿馬) 감별법(鑑別法)
49. '기황지술(岐黃之術)'과 전통 의학
50. '토고납신(吐故納新)'과 양생법(養生法)
51. '기사회생(起死回生)'과 편작(扁鵲)
52. '대증하약(對症下藥)'과 화타(華?)
53. '행림춘만(杏林春滿)'과 의사의 자질
54. '이독공독(以毒攻毒)'과 종두법
55. '당랑포선, 황작재후(螳螂捕蟬 黃雀在後)'와 먹이사슬
56. '명령의자(螟?義子)'와 곤충의 기생
57. '귤화위지(橘化爲枳)'와 고대 식물 분포 한계선
58. '국색천향(國色天香)'과 모란
59. '화씨지벽(和氏之璧)'과 월광석
60. '하도낙서(河圖洛書)'와 환방(幻方)
61. '운주유악(運籌?幄)'과 산가지 계산법
62. '불관삼칠이십일(不管三七二十一)'과 구구법
63. '일자천금(一字千金)'과 <여씨춘추(呂氏春秋)>, <집고산경(緝古算經)>
64. '거일반삼(擧一反三)'과 과학적 사고
65. '세마지책(賽馬之策)과 책론(策論)
66. '일거이삼역(一擧而三役)'과 운주학(運籌學)
67. '반문농부(班門弄斧)'와 노반(魯班)
68. '기구상계(箕?相繼)'와 고대의 기술 전수
69. '도천이무앙(盜天而無殃)'과 기술관
70. '매독환주(買?還珠)'와 고대 기술과 문화
책속에서
17. '금상첨화(錦上添花)'와 채색 견직물 직조 기술
'금상첨화(錦上添花)'는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더한 것, 아름다운 가운데 더 아름다움을 더한 것을 이른다. 금(錦)은 채색된 날실과 시실로 짜서 만든 각종 무늬의 직물로, 무늬가 정교하고 우아하며 색깔이 아름답고 다채롭다. 이런 비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꽃봉오리까지 더하였다 하여 '금상첨화'라 하였다.
'금(錦)'은 '금(金)'과 '백(帛)'을 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고대에 글자를 만드는 규칙에 따라 해석하면, '금(錦)'은 매우 귀중한 '사백(絲帛, 견직물)'으로, 그 가치는 황금에 버금간다. 동한(東漢) 시대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석채백(釋采帛)>에 "금(錦)은 금(金)이다. 금처럼 귀중하므로 존귀한 자들만이 그것을 구해 입었다"라고 되어 있다.
고대에는 화려한 채색 비단을 한 폭 짜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쳐야했다. 먼저 누에실을 각각 다른 색깔로 염색한 후, 다시 색실에 따라 날실을 배치한다. 그러고 나서 도안에 따라 잉아를 꿰어 직기에 넣고, 일정하게 자카드(jacquard)로 도드라진 무늬를 짠다. 이렇듯 견직물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비단은 중국 고대 견직물 직조 기술의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격자에는 여러가지 기하학적인 작은 무늬를 교묘하게 배치하여, 가지런하고도 장엄하게 도안하였다. 또 기하학적 도형의 골간 위에 다시 각종 '빈화(貧花)'를 골고루 아름답게 배치하기도 하였다. 송나라의 비단은 일반적으로 강렬한 대비색을 사용하지 않고, 명암이 비슷한 몇 가지 색깔로 구성하여 '화려하면서도 붉지 않고, 복잡하면서도 난잡하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