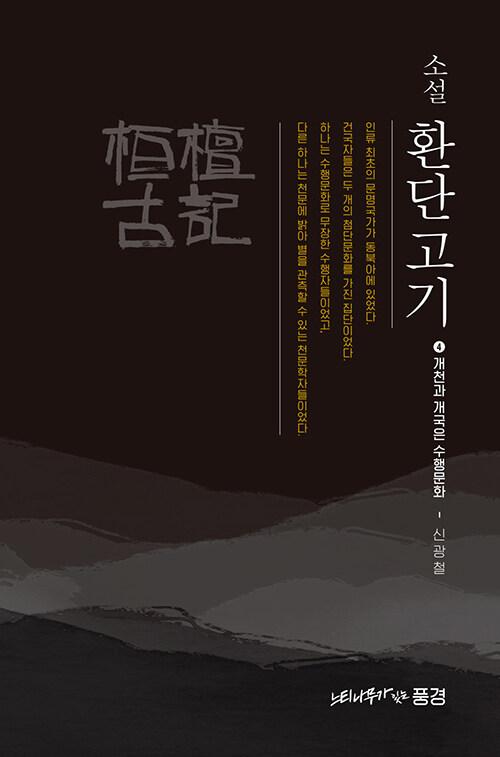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여행 > 국내 여행가이드 > 전국여행 가이드북
· ISBN : 9788996383659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0-10-08
책 소개
목차
|한옥, 한옥마을에 대하여 |
|현대 한옥마을|
01. 서울 북촌마을 : 락고재/청원산방
02. 남한산성 마을 : 김태식가옥/주일성가옥/고향산천
03. 무안 약실마을 : 박광일가옥/박석문가옥
04. 함평 오두마을 : 박선숙가옥/청도김씨 명가고택
|전통 한옥마을|
05. 거창 황산마을 : 신씨고가
06. 경주 양동마을 : 무첨당/서백당/향단
07. 고령 개실마을 : 점필재종택
08. 고성 왕곡마을
09. 나주 도래마을 : 홍기응가옥/홍기헌가옥
10. 보성 강골마을 : 이식래가옥/이용욱가옥
11. 보성 예동마을 : 이범재가옥/이용우가옥
12. 봉화 닭실마을 : 권충재
13. 산청 남사마을 : 사양정사
14. 산청 단계마을 : 권씨고가
15. 성주 한개마을 : 한주종택/북비고택/하회댁/교리택
16. 순천 낙안읍성 : 곽형두가옥/최창우가옥
17. 아산 외암마을 : 감찰댁
18. 안동 군자마을 : 종택 사랑채/후조당
19. 안동 하회마을 : 충효당
20. 영덕 인량마을 : 갈암종택/충효당
21. 영양 주실마을 : 호은종택/옥천종택
22. 영주 무섬마을 : 만죽재/해우당
23. 대구 옻골마을
24. 제주 성읍마을 : 한봉일가옥
책속에서
서 문
한국인을 닮은 미학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한옥,
한옥마을
머무르지 못하는 유목에서는 바람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정착을 그리워하지만, 유목민에게는 꿈이었다. 사람이 가진 모든 살림과 사랑마저도 등짐으로 지고 이동해야만 했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안정과 평화 그리고 정주의 상징물인 항아리로 가득한 장독대도 마련되었다. 오래오래 발효되어야 깊은맛을 내는 장맛처럼 사람도 삶의 역사가 길고 깊어짐에 따라 나눔과 온기를 갖게 되었다. 바로 한옥마을이다. 우리 한옥마을의 장독대엔 여전히 장맛이 들어가고 구들장엔 장작을 땐 온기가 아직 그대로다.
사람 사는 마을에는 사람을 닮고, 산을 닮고, 바람을 닮은 집이 지어졌다. 한옥이다. 한옥은 독특한 내면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 유목하면서 정착을 그리워했듯, 사람은 머무르면서 유목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집, 한옥은 자연을 받아들였다. 한옥에 자연주의가 자리 잡은 것은 조선 후기이지만, 애초 민족성에는 자연의 바람이 들어 있었다. 우리 한옥이 아름다운 것은 이런 자연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의 독특함에 있다.
배흘림기둥은 동양이나 서양에서 모두 사용하는 건축기법이지만, 우리 한옥에는 자연성을 확대하는 요소가 더 들어 있다.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천연덕스러움이다. 돌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체화하는 그렝이기법이나 기둥을 받치는 초석으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덤벙주초가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질서를 파괴하여 더 큰 자연과의 화합을 이루려는 기질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성정이다. 모두 잘 다듬어진 기둥을 세우다가 어느 하나는 나무가 생긴 모습 그대로 세워 놓는 능청스러움도 보이는데 이것은 도랑주이다. 도랑주의 특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위 속에 무위를 천진스럽게 도입하고 있다. 작위만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질서에 무작위의 자연성을 끌어들여 우리의 삶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우쳐 주기라도 하는 듯하다.
앙곡, 안허리곡, 귀솟음, 안쏠림과 같이 자연주의에 적응하려는 한옥의 기법들은 우리의 마음과 닮은 데가 많다. 우리의 뿌리가 유목민족 이어서일까, 아니면 북방을 달리던 기마민족의 피를 이어받아서일까. 그 근원은 알 수 없으나, 한옥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하다. 인위적인 것에도 자연을 들이는 큰 철학이 담겨 있다. 한국인은 미학을 다루는 솜씨가 여간 깊은 것이 아니다. 한국미의 특징은 단순미와 자연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성정에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시선 안쪽의 심연을 에돌려 보여 주는 탁월한 자연주의 기질이다. 언뜻 보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심오한 철학과 미학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한옥이 모여 있는 한옥마을. 그곳에는 북방의 웅혼함을 지닌 조선의 마음과 조선의 산하를 닮은 집들이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땅에 한옥이 지어지고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다시 지어졌다. 지금까지 남은 한옥과 새로 지어진 한옥들이 있는 마을을 찾아다녔다. 우리의 선조는 머무르지 못하고 떠났지만, 집들은 장독대를 품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역사와 애환, 노동이 함께하는 사람 사는 곳에는 정주의 안락으로 방향을 튼 한옥마을이 있었다. 마을의 집들을 취재하는 동안 더 없이 행복했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더욱 좋아졌다. 가파른 세상보다 자연을 더 닮은 사람들이었다. 추상같은 선비정신은 누그러졌고 집은 퇴락해 가고 있었지만 반가웠다. 우리를 가장 닮은 한옥을 다시 보고, 한옥이 모여 있어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 주는 한옥마을의 속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민족의 호흡을 닮은 한옥과 한옥마을, 그리고 한국의 산하는 모두 다 아름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