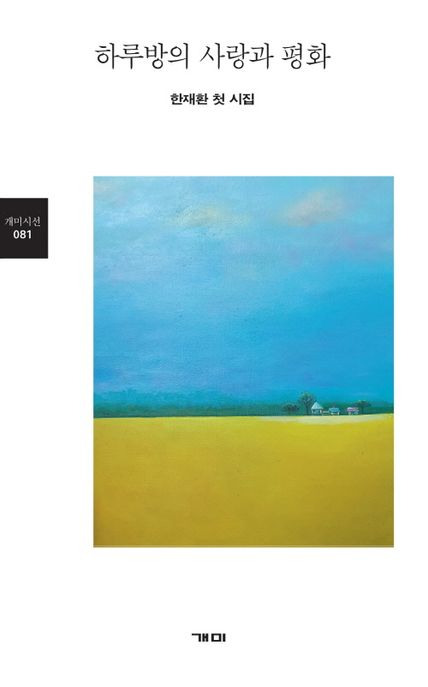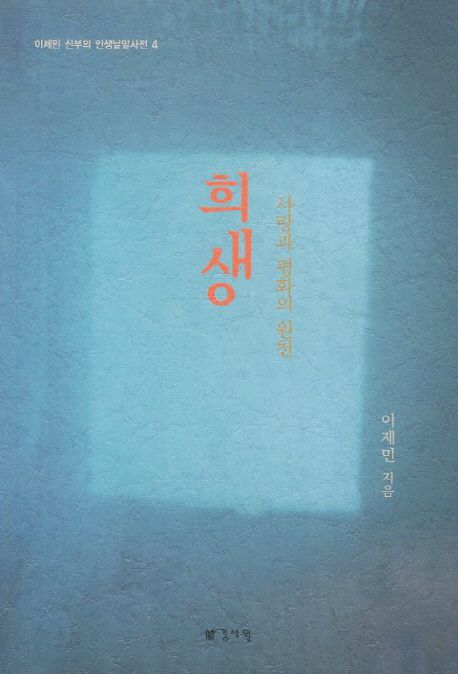전쟁과 평화, 사랑과 죽음: 우로보로스와 탈 우로보로스 (꼬리 먹는 뱀 우로보로스 사유와 서양 문명 비판 3)
권석우 | 청송재
31,500원 | 20230727 | 9791191883190
인문학자 권석우의 20년 연구 역작!! / 총 3권 중 제3권 완결본!
우로보로스 사유와 서양 문명에 관한 결론! 죽음과 전쟁의 무젠더성: 탈우로보로스의 가능성에 대한 성찰
○ 영문학자이며 전쟁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저자가 이십여 년간 연구한 여성과 죽음, 그리고 우로보로스적 사유와 서양 문명에 관한 문화사적 연구서인 이 책은 본문이 1,200쪽이 넘고 본문에서 밝힌 참고문헌만 쪽수로는 44쪽, 문헌 수로는 840여 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대작으로 총 3권으로 나누어 발행했다. 각 권의 제목은 제1권은 “선악과와 처녀 잉태: 유대-기독교 문명”, 제2권은 “메두사와 팜므 파탈: 지혜와 생명의 여성”, 그리고 제3권은 “전쟁과 평화, 사랑과 죽음: 우로보로스와 탈(脫)우로보로스”이다. 이번에 발행한 책은 제3권이며, 제1권은 2023년 2월 28일, 제2권은 2023년 7월 7일 발행하였다.
○ 저자는 이 세 권의 저작에서 여성을 통해서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다시 삶이 되는 현상을 추적하고 생사의 우로보로스를 삶과 죽음을 동시에 체현하고 있는 여성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더불어 여성적 동물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뱀과 이에 상응하는 태양계의 별자리인 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라는 ‘우로보로스’의 원(圓) 또는 원융(圓融) 현상을 파헤치고 있다.
○ 시리즈 제1권에서는 주로 여성과 죽음, 생사에 연관된 종교적인 전통에 대한 논의를, 제2권에서는 삶의 여성이 어떻게 죽음 등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서양의 역사에 출몰했는지에 관해 논구했다면, 제3권에서는 죽음을 양산하는 전쟁이 서양 문화, 특히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서양 문화에서 특별히 여성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재현되는 양상과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3권에서 저자는 여성과 죽음이라는 이 책 원래의 주제로 되돌아가 죽음을 양산하는 전쟁과 여성의 관계를 되짚어 본다. 특히 서양 문명에서 삶과 죽음의 여성이 죽음의 여성으로 완전히 변한다고 할 수 있는 베트남전쟁에 관한 미국 소설, 그리고 비단 서양 문명뿐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을 위협하고 있는 핵전쟁과 이와 관련된 젠더와 성의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 제3권은 2개 부, 5개 장과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발행한 제1권 제1부 1~4장, 제2권 제2부 5~8장, 제3부 9~10장에 이어 제4부 11장부터 제14장, 제5부 결론과 부록1, 2, 3이다.
○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1장부터 제12장까지는 여성을 전쟁으로 보는 습속이 여성을 죽음으로 보았던 사유의 연장선이며,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축조된 관념임을 밝히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소설인 『13 계곡』, 『비좁은 병영』, 『시체 세기』, 『대나무 침대』,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과 죽음과 전쟁의 동일화에 대해 고찰한다. 제13장에서는 『호랑이 여전사』를 통하여 여성과 전쟁이 얽혀져 있는 여전사 개념의 실체와 허구성을 궁구한다.
○ 이어지는 제14장은 여성과 전쟁, 그리고 평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여성이 죽음과 전쟁으로 표상되는 현상의 이면에 더불어 도사리고 있는 질문인 “여성은 평화적인가 또는 평화는 여성적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결론 삼아 말하자면 여성은 전쟁도 평화도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입론이다.
○ 부록 1은 전쟁의 원인을 사랑으로 분석한 저자의 20여 년 전의 글을 원문의 수필적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전쟁에 관한 철학적 성찰과 미추와 선악과 호오에 대한 맹자와 묵자, 그리고 불교의 선악에 관한 이론을 보충한 글이며, 부록 2는 제1권의 제4장에서 제시된 지식과 지혜의 다르지 않음을 어원학적으로 추적하는 글, 그리고 부록 3은 뮈토스와 로고스의 대위법 내지는 우로보로스적 상호 보완에 대한 글이다.
○ 이 책에서 저자가 도달하고 있는 결론은 ‘삶과 죽음이 대대적으로 꼬아진 우로보로스의 끈’이라고 말하는 서양 문명의 우로보로스적 사유 즉, 여성이 삶이고 죽음이고 재생과 부활이며, 그러한 여성성을 매개로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다시 삶이 되는 것은 허상이며, 여성이 여성이듯이 죽음은 죽음이고 전쟁 또한 전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