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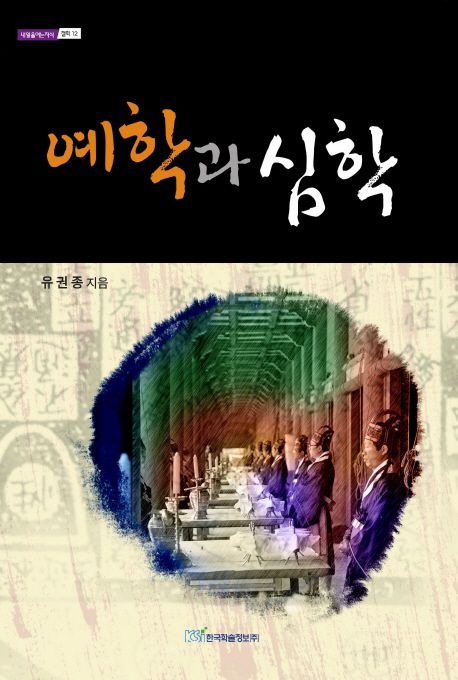 |
예학과 심학유권종 | 한국학술정보
22,500원 | 20091231 | 9788926806432
『예학과 심학』. 이 책에 담긴 연구논문들은 예학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심학과의 연관성을 음으로 양으로 담고 있다. 이는 예학 전공자라 해도 실은 禮文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의미의 충족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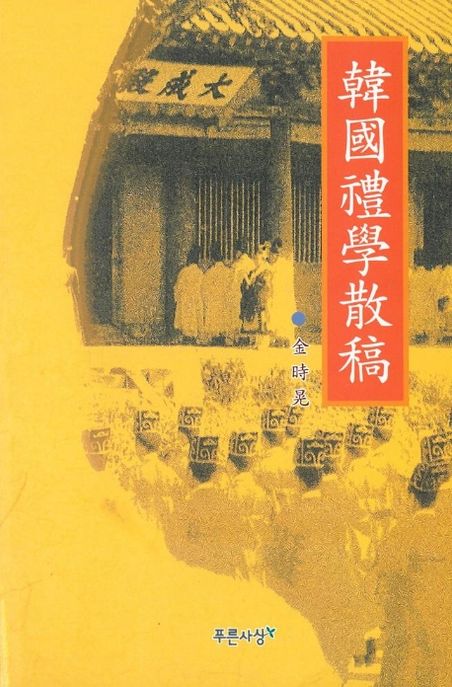 |
한국예학산고김시황 | 푸른사상
16,200원 | 20021130 | 9788956400594
우리나라에서 "예(禮)"란 중요시 여기고 실천해온 오래된 전통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모습을 그래도 실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잘못된 절차와 형식들을 바로잡고자 하는게 이 책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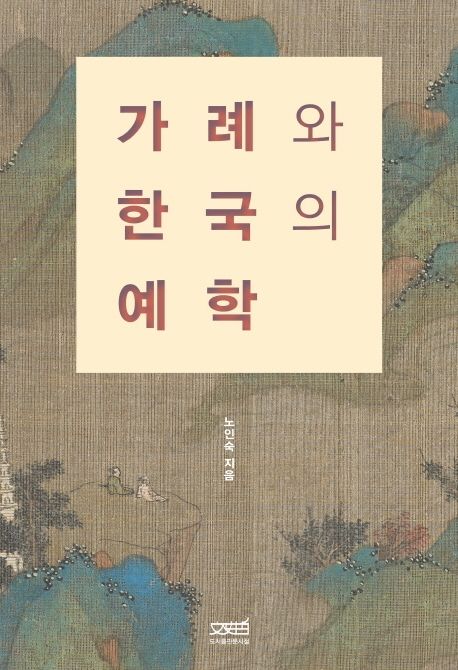 |
가례와 한국의 예학노인숙 | 문사철
31,500원 | 20200627 | 9791186853788
『가례와 한국의 예학』은 중국의 대표적 가훈에 대한 연구와, 조선조 예학자들의 가계(家戒)를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가훈, 가계 또는 가풍이 가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