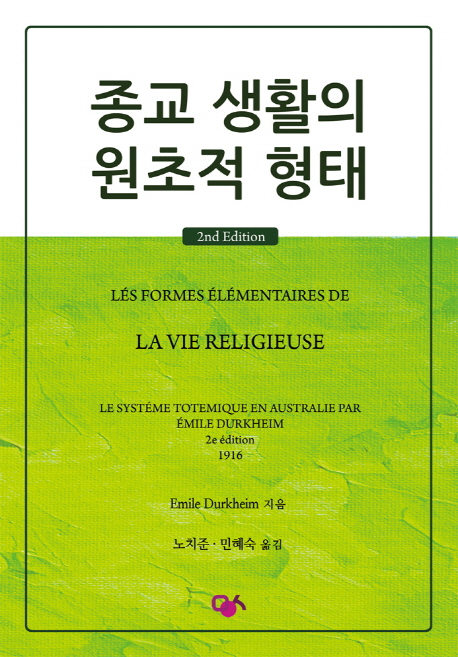CIS 고려인 이야기 (전통 생활과 문화, 종교 활동)
이병조 | 경인문화사
31,500원 | 20180713 | 9788949947600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 인간의 삶이요 또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면서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바로 삶이고 시간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은 정교회 연구였으나 결국은 고려인 연구에 귀착된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게다가 어찌하다보니 고국을 떠나 고려인의 본고장 중앙아시아에서 뿌리내리며 언제까지 일지 모를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도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간의 활동이 연구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미천한 행보들이었지만 그래도 삶 자체만큼은 나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또한 고려인의 본고장에서 이제는 ‘원없이’ 고려인 연구를 하게 되었으니 그 또한 그리 아쉬워 할 일도 아닌 듯 하다.
본 연구서는 수년 동안의 졸고들을 모아 수정, 재구성 된 논문모음집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실은 더 빨리 발간을 했어야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살아왔다.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함 속에서 앞만 보고 뛰다보니 오히려 제때 할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스스로의 게으름을 감추고 싶다.
본 연구서는 총 3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정교와 한인사회’에서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 한인(강제이주 이후부터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고려인’, ‘고려민족’ 등으로 칭하고 있음)의 종교(정교와 개신교)활동을 둘러 싼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1860-1917년 시기 극동의 한인들은 상당수가 정교회 세례를 받고 정교 신자의 길을 걷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20세기 초까지 극동으로 농업이주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한인이 토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와 개종과정을 거쳐 러시아국적을 받아야 했다.
또한 1910년대 한반도의 일본식민화로 인해 많은 극동의 한인들은 정교에 입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까지 대략 28%정도의 극동 한인들이 정교도인의 삶을 살았다. 한편으로 1910년을 전후하여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신교가 진출하며 정교회측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제1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러시아 정부와 정교회지도부, 한인사회 간의 관계망 속에서 세례와 개종, 토지문제와 국적문제, 한인의 동화와 재이주 문제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어 제2부 ‘스탈린 탄압과 고려인’에서는, 강제이주 직전인 1930년대 중반에 자행되었던 스탈린 정치탄압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최 파벨(최재형의 차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최파벨은 극동지역 항일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의 차남이다.
그는 극동시기 최초의 한인해군장교로 활동했으나 스탈린 탄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총살을 당하고 만다. 최 파벨은 전형적인 스탈린 탄압의 희생양이며 스탈린 정치탄압의 참상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2부에서는 최 파벨 형제들(4남7녀) 중 생존자들의 가족사 회상수기와 소련 해군당국에 의해 생산되어 러시아국립해군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최 파벨의 군복무 사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스탈린 정치탄압의 실상과 잔악성을 조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부 ‘고려인의 전통문화와 삶’에서는, 1991년 소련방 붕괴 이후에도 계승, 전승되어 나오고 있는 CIS지역 고려인의 전통문화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전의 극동거주시기에 이어 강제이주 이후 어려운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도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스탈린 체제와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며 고려인들은 한민족의 언어와 역사, 문화, 전통 등 많은 부분을 상실해 왔으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민족적 정체성 회복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제3부에 실린 4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현장조사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들이다.
현장조사는, ㄱ)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ㄴ)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ㄷ)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ㄹ) 구전전통 및 표현, ㅁ)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ㅂ)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ㅅ)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를 조사범주로 설정하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CIS고려인 사회에서는 공연예술문화(고려극장, 소인예술단 등)와 식문화(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 일부지역의 농경문화(우쉬토베 등지), 세시풍습(설, 한식, 단오, 추석 등), 관혼상제(결혼, 장례, 돌 등) 등의 일부 분야에서 그 명맥이 이어져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인 및 한국학 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소장 현황 정보도 실었다.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본고에 사용된 졸고들 중 일부는 작성 시점이 다소 오래되어 현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관 및 조직, 단체들, 개인들을 상대로 일반 연구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용이하게 접근 및 파악하기에는 시간과 물질측면에서 다소 쉽지 않은 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시간의 모습과 상황 그 자체로도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고민 끝에 수록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제1부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은 필자의 2016년 출간된 단행본에도 게재된 바 있으나 해당 논문집의 편집 및 구성상 중복 게재된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