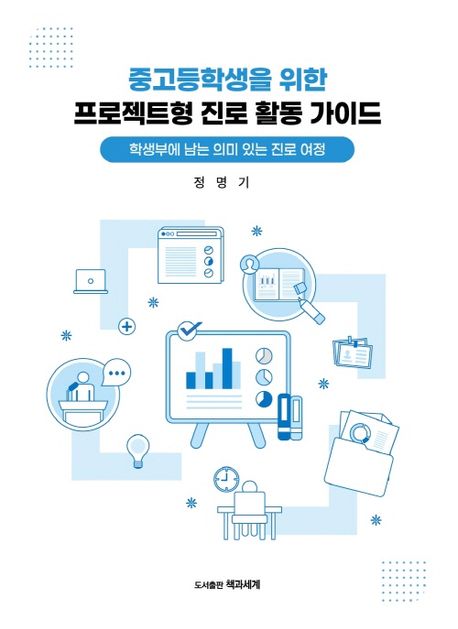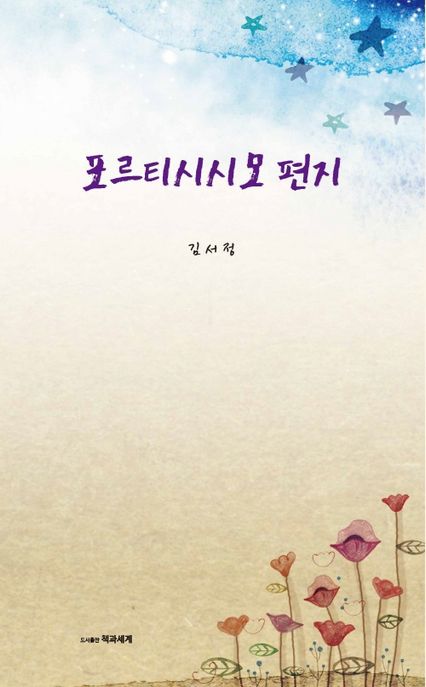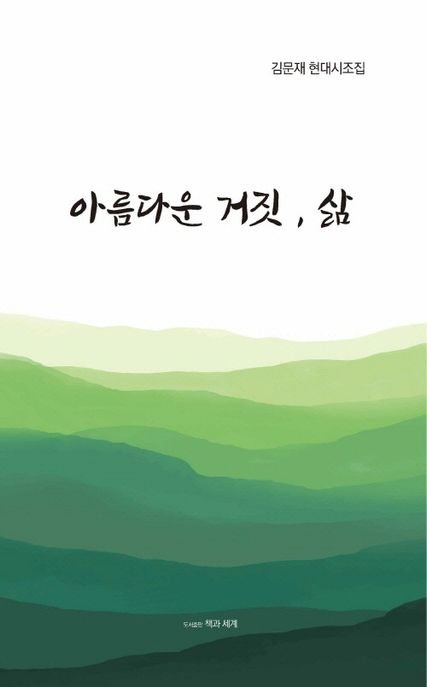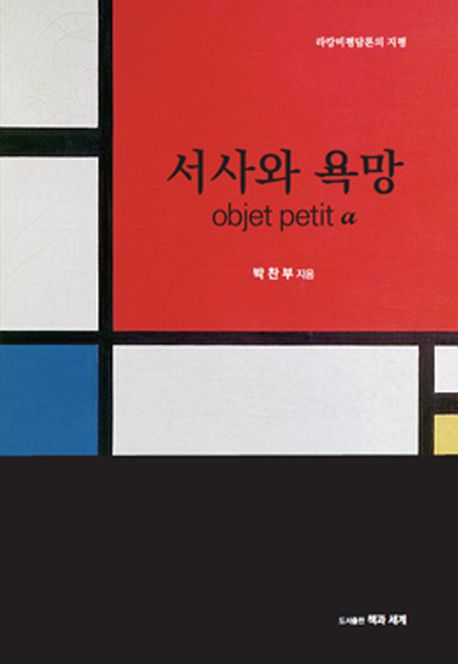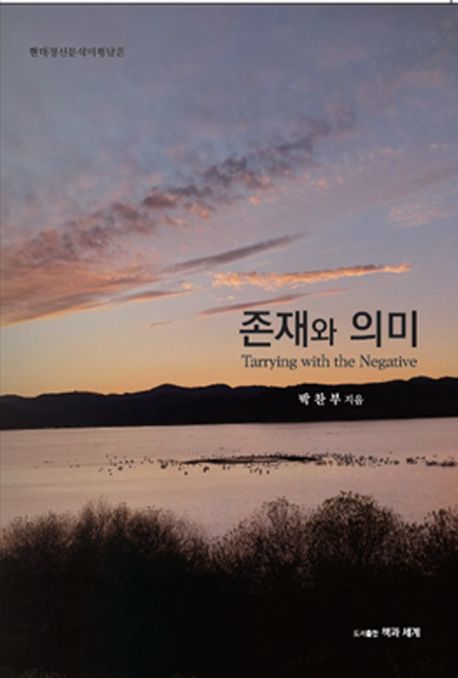프로이트ㆍ융ㆍ라캉 3: Eros, Thanatos
박찬부 | 책과세계
13,500원 | 20240301 | 9791191341805
한 독자 중심의 정신분석 비평가는 ‘비평가여, 그대를 정의하라’는 글에서 “비평가는 자신을 사용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독자”(Schwartz 11)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신을 사용해서〉라는 구문이다. 자신을 사용해서 객관적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비평행위라는 것이다. ‘사용’(use)이 없는 비평은 허구다.
이런 상황은 정신분석적 글쓰기에서도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1900) 표제어 밑에 “천상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면 지하의 세력이라도 동원하겠다”(Flectere si superios, Acheronta movebo)는 버질(Virgil)의 시구를 싣고 있다. 이 것은 ‘억압된 본능적 충동’의 막강함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는 프로이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야심찬 논객 프로이트 자신의 글쓰기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희대의 영웅 오이디푸스와 같이 프로이트는 그때까지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꿈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건 사유의 모험을 감행한다. 최고의 난관은 자신을 드러내는 문제다. 자기 폭로 없이는 타자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운명이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결국 〈프로이트 꿈〉에 대한 해석이었고 해석에 동원된 자유연상은 모두 프로이트 자신에 대한 연상이었다. 프로이트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읽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했다는 말도, 그가 이미 자기분석(self-analysis)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서사를 통독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정신분석적 글쓰기에서 자신의 내밀한 구석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부자연스러운’지는 『꿈의 해석』 곳곳에 산견되는 프로이트의 망설임과 지연술 속에 잘 묻어나 있다. A.그린스타인이 편집한 권위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들』(1980)에는 「이르마의 주사」 「식물학 논문」 등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꿈 19개가 수록되어 있고 그 각각에 따르는 프로이트 자신의 연상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면의 서사의 한계성 같은 것이다. “나보다 더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고 프로이트가 항변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고 박완서 작가가 한 말이 기억난다. 어떤 자전적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글을 쓰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중간에 일인칭을 삼인칭으로 바꿔 허구화했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는 고백이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제1의 정신분석비평가 노먼 홀란드(N. N. Holland) 교수에서도 발견된다. 수용미학, 혹은 독자반응비평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홀란드 교수는 독자에게서 출발하여 텍스트를 거쳐 다시 독자에게로 돌아오는 피드-백 형태의 독자중심 비평(Transactive Criticism)으로 유명한데, 한 때는 비평문에서 서술주체를 주체적 ‘정체성 주제’(identity theme)의 화신인 〈나〉라고 표기했다. 〈나를 사용한〉 글쓰기의 전형적 사례였다. 그러다보니 프로이트가 자기연상과 관련하여 가졌던 한계성과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박완서와 같은 방법을 택했다. 그의 지론인즉, 서술주체가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서술자의 정체성 주제가 작동하여 객관적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그의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집필에서 택한 서술 전략도 이와 비슷하다. 어떤 때는 서술주체를 〈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알파벳 이니셜로 표기하는 등, 서술방식에 변화를 주었지만, 그곳에 실린 모든 글들이 〈자신을 사용해서〉 정신분석 이론서로서의 객관적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드러내려는 기본적 서술전략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일에는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다. 프로이트를 ‘용기 있는 저술가’라고 말할 때의 그 용기 비슷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산물인 정신분석적 진실을 드러내는 일,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은 항상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항상/이미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경구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피분석가의 어떤 말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분석지침이다. 이런 용기와 모험이 배제된 어떠한 글쓰기도 ‘회칠한 무덤’처럼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한 평생을 정신분석과 살을 맞대고 호흡을 같이하며 살아왔다.
서울대 문리대 시절, 교문 앞 길 건너편에 위치한 의과대학의 정신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부영교수를 만난 것이 나의 정신분석 입문 사건이었다. 정확하게 말해서 분석심리학이었고 그것의 창시자 C. G. 융을 정점으로 한 프로이트의 이단그룹이었다. 스위스의 융연구소에서 연구를 마치고 갓 돌아온 이교수는 한국 땅에 단순한 융이론 뿐만 아니라 민담, 민속, 신화 등의 담론을 생산하고 있던 터라 마침 N. 프라이의 신화비평, 원형비평에 들떠있던 이 땅의 문학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튼 나는 이교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정신분석’이 무엇인가 맛도 봤다. 그 당시 그의 추천에 따라 범문사에서 『융 전집』(Bollingen Series) 19권을 사들인 것은 나의 융에 대한 정열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 준다.
두 번째 정신분석과의 조우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 유학시절에 발생했다. 이 대학 영문과 부설 〈정신분석 센터〉는 정통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세계적 요람지였다. 거기에는 세계 제1의 정신분석비평가 노먼 홀란드 교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 강좌 시간에는 프로이트 전집 24권의 핵심 내용을 전부 훑어가는 대장정도 이루어졌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프로이트에 심취하게 되었다. 나의 Ph. D 논문은 프로이트의 중요 개념 ‘전이’(transference)를 바탕으로 한 『전이현상으로서의 해석』(Interpretation as Transference)이었다.
세 번째, 라캉과의 만남은 예일대 객원교수 시절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 예일대 영문과와 비교문학과에는 라캉이론이 도입되어 문학 사상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쇼서나 펠만(Shoshana Felman)교수와 만난 것은 나로서는 큰 행운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안목과 번뜩이는 지혜가 지금도 피부로 느껴지는 듯하다.
나는 바로 피츠버그로 세계적 라캉분석가 브루스 핑크 교수를 찾았다. 그리고 그 후 11년 반 동안 분석을 받았다. 정신분석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의 뿌리가 뽑히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실린 글들의 특징, 변별적 자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론과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론은, 물론, 프로이트, 융, 라캉으로 연결되는 정신분석학의 세 대부들에 대한 이론이고, 실천은 실제적 분석체험에 관한 것이다. 이론 속의 실천이고 실천 속의 이론이다.
나는 그동안 일련의 정신분석학 이론서들을 출간해 왔다: 『현대 정신분석 비평』(민음사, 1995), 『라캉: 재현과 그 불만』(문학과 지성사. 2006), 『기호·주체·욕망: 정신분석과 텍스트의 문제』(창비, 2007), 『에로스와 죽음: 실재의 정신시학』(서울대출판부, 2013). 나는 이런 이론서들을 쓰면서 실천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종합판과 같은 이번의 저술에서는 정신분석적 체험 등, 실천의 측면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그리고 부제로 내걸은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생명본능(Lebenstrieb)과 죽음본능(Todestrieb)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의 저술에서도 논의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명보다는 죽음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는 데에 변별적 차이가 있다. 근자에 집중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사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보니 죽음철학에 대한 탐색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등 종교적 담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에세이 곳곳에 투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체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타자(the Other)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사회,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가 이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해도, 그러나, 내가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한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은 메타포, 즉 은유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어렴풋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들 속에 왔었던 살아있는 부처(生佛) 성철대선사의 열반 직전의 일화가 세인의 관심을 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죽은 듯 누워있는데 그의 상좌 하나가 다가와 “스님 이 시점에 스님의 경계는 어떠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한다. 그랬더니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스승이 벌떡 일어나 그 제자의 뺨을 호되게 올려쳤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또한 성철 자신의 언설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는 말년에 ‘일여’(一如) 논쟁으로 유명해졌다. 자나 깨나 똑 같다는 오매일여(寤寐一如), 혹은 몽중일여(夢中一如)나 숙면일여(熟眠一如), 그리고 병중에서도 성할 때와 똑 같다는 병중일여(病中一如) 등이 그것이다. 그가 몸이 아파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의 상좌 원택 승을 불러 큰 소리로 ‘할’한 첫 마디가 ‘똑 같다’라는 말이었다. 그가 8년간 장좌불와(長坐不臥) 할 때나 10년간 동구불출(洞口不出) 묵언수행 할 때,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신적 경계가 ‘똑 같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도 득도인증서를 받으러 온 그의 문하생들에게도 ‘똑 같더냐?’의 잣대를 들이대곤 했다한다. 똑 같지 않으면 모두가 가짜라는 것이 혹독한 수행과정에서 그가 얻은 체험적 교훈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답이 나왔다. 그가 죽기 직전 그의 상좌가 물어온 질문, ‘스님 이 순간 스님의 경계는 어떠하십니까?’는 죽음의 사신이 어른거리는 이 순간에도 스님의 정신적 경계는 똑 같습니까?라는 또 다른 일여(一如) 문답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궁금증은 여기서 더 큰 세력으로 우리를 압박한다. 여기서도 병중일여 시와 같이 ‘똑 같다’라고 말해주었으면 문제의 그 상좌뿐만 아니라 견성성불(見性成佛)에 목말라하는 많은 우리 중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는가? 그러나 성철 대선사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않은 것인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나는 이 운명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책의 출판을 기획하고 있다. 얼마 전 나는 김우창교수가 주관하는 〈열린포럼: 문화의 안과 밖〉에 초청되어 ‘라캉의 시선으로 본 프로이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이 끝나고 둘만 있는데 김교수가 ‘분석을 통해 정신치료가 되는지 몰라?’하고 물어왔다. 이것은 일견 흔히 듣는 질문이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그것이 위에서 말한 상좌의 성철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큰 하중을 느끼게 하는 무게 있는 질문이었다.
나는 평생 정신분석과 씨름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의 궁극적 표적에 활시위를 당기며 나에게 무거운 질문을 해 온다면 나는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정신적 경계는 무엇이오? 라고 물어 온다면 덕산봉(棒)이나 임제할과 같이 몽둥이와 고함소리로써 답하거나 성철과 같이 물음의 주체에게 보기 좋게 뺨을 한 대 올려줘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대신, 정신분석으로 한 세월을 다 보낸 나의 현재적 정신적 경계를 책 속에 담아보려 한다.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慾不踰矩), 나이 칠십이 되니 마음이 가는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성현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자기 폭로전을 감행하기로 했다. 이 책이 어쩔 수 없이 자전적, 고백록적 성격을 띠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리는 항상/이미 다른 곳에 존재한다.
여기서, 비평가는 자신을 사용해서 〈차이〉를 만들어 내는 독자라는 앞에서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언명에 따라 의식의 반대편에 위치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분석행위는, 자유연상적 언술행위를 통해 주체의 의식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수행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언어적 ‘말하기 치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분석가의 개입, 적극적 듣기 행위이다. 이것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의식에 차이를 가져오고 이 차이가 치료적 효과로 연결된다. 이제 이 책의 독자들은 적극적 듣기의 분석가로 초대되어 텍스트의 의미에 차이/변화를 가져오는 성스런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정신분석학을 심층 심리학(depth psychology)이라고 한다. 이 깊음의 메타포는, 예컨대, 큰 나무의 경우 그 기저구조에 뿌리줄기, 근경(根莖, rhizome)과 같은 결정적 장치가 있어 그 나무를 바르게 세우듯이, 이 학문을 받쳐줄 중요한 개념이 밑에 깔려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 근경같은 열쇄기표(Key Signifier)를 프로이트는 ‘그것’(das Es/Id)에서 찾았고, 융은 ‘원형’(原型, Archetype)에서, 그리고 라캉은 ‘실재’(實在, the Real)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 세 개념 모두가 정신분석학 세 대부들의 학문역정 후반기에 완성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드, 원형, 실재의 세 개념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本能)하고 중요한 의미에서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 본능은 동물생태학자 K. 로렌츠(Lorenz)가 말하는 동물적 본능하고 구별되는 ‘인간적 본능’을 뜻하고 J. 스트래치(Strachey)가 프로이트 전집을 영역할 때, 독일어 ‘Trieb’를 영어 ‘instinct’로 옮긴 이유하고도 관련되는 의미에서의 본능이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구조화된 본능의 문제는 정신분석의 존재이유하고도 맞물려 있는 무의식의 문제와 불가분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신분석학은 무의식(das Unbewusste)의 학문이다. 따라서, 무의식을 말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정신분석일 수 없다.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도 무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하얗게 표백된 의식적 언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정신분석적 담론이 아니다. 무의식은 정신분석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의 궁극적 지향점은 ‘무의식의 의식화’이다. 모르는 사실, 주체에게 은폐되어 감춰진 사실을 의식의 햇빛 속에 드러내어 주체화하는 일이다. 프로이트의 분석지침, “그것이 있었던 곳에, 내가 들어서게 하라”(Wo Es war, soll Ich werden)는 정확하게 이 과정을 말함이다.
그런 무의식의 의식화만큼 어렵고 지난한 과제도 없다. ‘분석에는 끝이 있는가?’를 놓고 치열하게 사유한 프로이트의 말년의 에세이, ‘분석 종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terminal or interminal?)은 분석의 최종 목표인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것의 어려움은 ‘제논의 역설’(Zenon's paradox)로서 설명된다. 아킬레스(Achilles)와 거북이-그 후 트로이 전쟁의 아킬레스와 헥토르(Hector), 그리고 이솝 동화의 토끼와 거북이로 주자(走者)가 바뀌기도 하는데-의 달리기 경주에서, 상식적으로는 전자가 후자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설의 논리를 형성한다. 간격을 무한히(ad infinitum) 좁힐 수는 있지만 전자가 후자를 완전히 추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다 따라 잡았는가 싶은데 그것은 항상/이미 앞에 위치한다. “진리는 항상/이미 다른 곳에 존재한다”(Truth always/already lies elsewhere!)는 것이 만고의 정신분석적 진리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신분석적 해체론에서도 일어난다. 포(Poe)의 「도난당한 편지」를 놓고 벌어지는 현대판 해체론적 삼각구도-포를 라캉이 따라잡고 그 라캉을 뒤따라 온 해체론자 데리다(Derrida)가 또 따라잡는-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바라보는 공간, 혹은 원(圓)의 밖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라보는 순간 참여하기 때문이다. 관찰/참여(participant/observation) 모델의 해체론적 변증법이다.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의식의 무의식성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특징 중의 하나로 그것의 ‘영원성’ ‘무한성’을 꼽고 있는 것도 이 문제와 관련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이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이 시지프스의 신화에서처럼 밀어올린 돌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조건에 필수적이므로 그것의 의식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무의식은 비물질성이므로 그것에의 접근은 물질적 현현체(顯現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니 겉으로 드러난 언어적 기표(the signifier)를 통해 미지의 무의식에 이르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그래서 꿈(dream as text)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인 것이다.
정신분석 현장에서 하는 일은 이 언어적 기표의 분석이 전부다. 학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신분석가들이 하는 분석행위의 전부는-그들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언어적 기표의 분석에 다름 아니다.
성공적으로 수행된 기표의 분석/해석은, 어느 한 분석주체의 표현을 빌려, ‘머리를 쇠망치로 팡팡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기표에 대한 분석적 해석이 무의식적 ‘실재’(the Real)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이 충격, 효과가 ‘병의 치료’로 연결된다. 이 치료는 다름 아닌, 주체의 위치의 변화(change of the subject position), '근본적 판타지의 재구성‘(reconfiguration of the fundamental fantasy)으로 나타난다. 생각의 길(道)이 바뀌고 감정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분석의 시작이고 끝이다.
여기에 실린 에세이들은 나의 저서 『에로스와 죽음: 실재의 정신시학』(2013) 이후 또 다른 책의 출판을 목표로 써 온 것들이다.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독자들의 질정(叱正)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