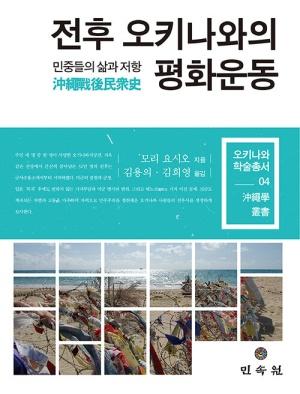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인문학 일반
· ISBN : 9788968497858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1-02-25
책 소개
목차
제1부 일본 설화의 민속과 신앙 / 11
일본 <바보 사위愚か聟> 민담 형성의 사회문화적 맥락 고찰 / 12
일본의 <먹지 않는 아내食わず女房> 이야기의 한국으로의 수용 양상 / 33
『우지슈이 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 권7 제5화의 관음신앙 수용 양상 / 56
제2부 오키나와 설화의 인간과 동물 / 79
오키나와 설화에 전하는 인간과 돼지의 성적 교섭의 양상 / 80
사키마 고에이의 『남도설화南島說話』에 나타난 인간과 동물의 교섭 양상 / 103
오키나와 우의羽衣 설화의 왕권설화로서의 성격 / 123
- 야래자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유로설전遺老說傳』에 나타난 오키나와인의 용궁세계 / 143
제3부 일본 마쓰리의 현장 / 165
오키나와 현 구다카지마久高島 의 샤쿠투이 마쓰리 / 166
후쿠오카 현 에노우라江浦 의 기온마쓰리 / 184
돗토리 현 다케노우치竹內 의 돈도마쓰리 / 200
아이치 현 도에이東榮 의 하나마쓰리 / 215
이시카와 현 미나즈키皆月 의 산노마쓰리 / 229
■ 찾아보기 / 244
저자소개
책속에서
일본 <바보 사위(愚か?)> 민담 형성의 사회문화적 맥락 고찰
1. 일본 민담 속의 <바보 사위(愚か?)>
일본의 민담(昔話) 중에는 연구자들이 ‘소화(笑話)’라는 장르로 분류하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진다. 이들 소화는 동물민담(動物昔話), 본격민담(本格昔話) 과 더불어 일본 민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의 민담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소화는 동물민담이나 본격민담에 비해서 그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 관해서 민담연구가 세키 게이고(關敬吾)는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의 민담연구 경향을 거론하며, 연구자들이 민담 장르 중에서도 소화 연구를 경원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야나기타가 민담을 오로지 일본의 고유한 신앙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주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화는 동물민담이나 본격민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소화가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우스운 이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화의 발생 및 전파과정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동물민담이나 본격민담 못지않게 당시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민담 중에서 <바보 사위(愚か?)>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소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바보 사위>는 <바보 마을(愚か村)>, <바보 며느리(愚か嫁)> 등과 함께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소화 중의 하나이다.
민담의 발생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바보 사위>는 무코이리콘(?入婚)이라고 부르던 일본의 혼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무코이리콘에 수반되었던 무코이지메(?いじめ) 라는 민속적 관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무코이지메란 무코이리콘 방식으로 처가살이를 시작한 새신랑에게 처가 및 마을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제재를 가하던 ‘신랑 괴롭히기’ 및 ‘신랑 다루기’ 관행을 말한다. 혼인과 함께 처가살이를 시작한 신랑의 처지란 매우 궁색했으며, 처가 쪽에서 볼 때에 사위는 마치 ‘타인’과도 같은 외부인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각 지역마다 무코이지메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새로 편입한 ‘타인’을 시험하고자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였다. 이 무코이지메 관습이 <바보 사위> 민담의 형성과정에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보 사위> 민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신랑의 바보스러운 언행은 ‘타인’으로서의 신랑이 처가라고 하는 ‘이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타지에서 장가를 든 신랑의 경우에는 처가 및 처가가 있는 마을은 낯선 이문화 영역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애초부터 신랑이 바보였던 것이 아니라, 처가 및 처가가 속한 마을공동체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제재를 극복하고 이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지고, 그 실수로 인해 ‘바보 사위’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2. <바보 사위(愚か?)> 민담의 유형과 양상
일본의 <바보 사위> 민담은 다양한 유형이 전승되고 있다. <바보 사위>는 야나기타의 『일본민담명휘(日本昔話名彙)』를 계기로 민담자료집에서 그 유형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 야나기타는 모든 종류의 민담을 크게 완형민담(完形昔話) 과 파생민담(派生昔話) 으로 이분하였다. 야나기타에 의하면, 민담의 본래적 의의란 영웅의 일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이 민담을 가리켜 완형민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완형민담에서 일부가 독립하여 떨어져 나간 이야기를 가리켜 파생민담이라고 따로 불러서 구별하였다. 파생민담을 다시 <인연 이야기(因緣話)>, <요괴 이야기(化物話)>, <소화(笑話)>, <조수초목담(鳥獸草木譚)>,
<기타(その他)>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소화>는 <대화(大話)>, <흉내를 내다가 손해 보기(?似そこない)>, <바보 마을 이야기(愚か村話)> 등으로 하위 유형을 설정하였다. <바보 사위>는 이 중에서 <바보 마을 이야기> 유형에 속한다. <바보 사위> 민담에는 사위가 주로 처가에서 저지르는 다양한 실수가 망라되어 있다.
세키 게이고(關敬吾) 는 야나기타의 『일본민담명휘』를 계승하면서도 이와는 체제를 달리하는 민담자료집을 『일본민담대성(日本昔話大成)』 (전 12권)이라는 이름으로 편찬하였다. 이 자료집은 특히 세계적인 시야에서 민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티스 톰슨이 설정한 민담의 유형분류에 기본적인 틀을 맞추었다.
세키 게이고의 『일본민담대성』에서 <바보 사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세키는 민담을 크게 동물민담(動物昔話), 본격민담(本格昔話), 소화(笑話) 로 삼분하여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소화를 <우인담(愚人譚)>, <과장담(誇張譚)>, <교지담(巧智譚)>, <교활자담(狡猾者譚)>, <형식담(形式譚)>, <신화형(新話型)> 등으로 나누었다. <바보 사위>는 <바보 마을(愚か村)>, <바보 신부(愚か嫁)>, <바보 남자(愚かな男)> 등과 함께 <우인담>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바보 사위>의 하위유형에는 총 43 종류에 이르는 화형(話型) 이 존재한다. 야나기타의 『일본민담명휘』에 분류된 <바보 사위>보다도 더욱 세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이 『일본민담대성』에 수록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민담대성』에 이어서 성립한 『일본민담통관(日本昔話通觀)』 (전 31권)에도 다양한 유형의 <바보 사위>가 수록되었다. 이나다 고지(稻田浩二) 와 오자와 도시오(小澤俊夫) 가 편집책임을 맡은 이 자료집에서 <바보 사위>의 위치를 확인하기로 한다.
『일본민담통관』은 전체적으로 모든 민담을 옛이야기(むかし語り), 동물민담(動物昔話), 소화(笑い話) 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세 영역에 각각 하위유형을 설정하여 분류하였는데, 소화의 하위유형으로 <현자와 우자(賢者と愚者)>, <익살맞음ㆍ교활(おどけㆍ狡猾)>, <비교 이야기(くらべ話)>, <어리석은 사람(愚か者)>, <바보 사위(愚か?)>, <바보 며느리(愚か嫁)>, <바보 마을(愚か村)>, <과장(誇張)>, <언어유희(言葉遊び)>, <형식담(形式話)>이라는 유형을 설정하였다. <바보 사위>에는 모두 50 화형에 이르는 하위 유형의 이야기가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이들 민담자료집에 수록된 <바보 사위> 민담을 검토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 다시 말하자면 ‘바보 사위’가 바보스런 언행을 일삼는 공간이 주로 처가살이를 하는 처가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처가살이를 하는 ‘바보 사위’의 우둔한 언행은 처가 및 처가가 위치한 마을의 문화적 향토성과 관련이 있다. 문화적 향토성 중에서도, 바보 사위는 특히 현지 식문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다. 셋째 처가라고 하는 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위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보 사위>라는 민담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사위에 대한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본고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무코이리콘이라고 하는 일본의 혼인제도에서 비롯한 무코이지메 관습과 무관하지 않다.
3. <바보 사위(愚か?)>와 무코이지메(?いじめ) 관습
일반적으로 소화는 민담 중에서도 동물민담이나 본격민담에 비해서 역사적 혹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특정한 소화를 주의해서 읽어나가면, 그 소화의 배경에는 일본사회의 역사적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바보 사위>도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일찍부터 <바보 사위> 민담이 일본의 사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한 연구자로 세키 게이고를 꼽을 수 있겠다. 세키는 일본의 <바보 사위> 민담의 발생에 일본의 전통적인 혼인제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의 혼인제도는 앞에서도 말한 대로 시댁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지만, 전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남자가 결혼하면 처가 쪽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혼인생활을 했다는 점은 거의 분명한 듯하다. 현재 그 중간 형태도 존재한다. <바보 사위> 소화는 오히려 그 같은 혼인제도 하에서 발생했거나 혹은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남자가 혼인에 의해서 생가에서 처가로 옮겨가, 그곳에서 외부인으로서 생활에 적응해가야만 했던 시대의 산물로 여겨진다.
인용문에서 가리키는 처가에서의 혼인생활이란 이른바 무코이리콘(?入婚) 을 의미한다. 일찍이 일본의 전통적인 혼인에는 무코이리콘과 요메이리콘(嫁入婚) 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존재하였다. 무코이리콘이란 처가 쪽에서 혼인의례를 올리고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살림집을 처가 쪽에 마련하는 혼인방식이다. 보통 이 경우에 사위는 처가에서 동거를 하였다. 이에 비해서 요메이리콘은 혼인의례를 시댁 쪽에서 올리고 애초부터 살림집을 시댁에 마련하는 혼인방식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무코이리콘이 먼저 성립하고 후에 요메이리콘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도 한다.
무코이리콘에는 대개의 경우에 무코이지메(?いじめ) 라고 하는 ‘신랑 괴롭히기’ 풍습이 수반되었다. 이와 유사한 풍습을 한국에서 찾는다면 동상례(東床禮) 에 해당하는 혼인 풍습이다. 이 풍습은 신랑 특히 그 중에서도 신부가 거주하는 지역 밖에서 장가를 든 신랑에게 집단적으로 가하는 관습적인 제재를 가리킨다. 마을의 신입자에 대한 일종의 통과의례와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신랑을 괴롭히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물 끼얹기, 진흙 던지기, 많은 밥을 억지로 먹이기, 무거운 석상 들어올리기, 마을 조직에서 제외하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참고하기로 한다.
[사례1]
히타치노쿠니(常陸國) 마카베 군(眞壁郡) 다이호 촌(大寶村) 의 우부스나신(産土神) 제례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 중에는 이 마을로 장가든 새신랑이 많다. 그리고 이 새신랑들에게는 큰 그릇에 가득 퍼담은 밥을 내놓는다. 제례에 사용하는 밥그릇은 대개 아이들 머리 정도로 크다. 이 그릇에 그냥 밥을 담아 놓아도 먹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걱에 물을 묻혀서 누르고 눌러 떡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한 자 높이로 잔뜩 담아 놓는다. 만일 새신랑이 마을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자 정도로 쌓아올린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밥상 한쪽에 비스듬히 밥을 쌓아올려서 먹도록 한다. 쌀 한 대 분량의 밥을 먹어치우는 남자도 다 먹어치우지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우는 자가 있다. 겨우 다 먹고 나면 중년남자가 입회하여 벌주라고 해서 큰 그릇으로 열다섯 잔을 마시게 한다.
[사례1]은 일본 각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던 전형적인 무코이지메 사례 중의 하나이다. 지역을 수호하는 토지신인 우부스나신(産土神) 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을제례를 계기로, 마을 출신의 처녀와 혼인하여 새로 전입한 외부 신입자를 시험하며 호되게 다룬 사례이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새신랑이 정식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로 무코이지메가 행해졌던 셈이다. 새신랑에게 많은 양의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벌주까지 동원하여 마시도록 하였다. <바보 사위> 민담을 개관하면, 사위가 처가에서 식사예법을 몰라서 바보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사례1]과 같은 무코이지메 관행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사례2]
시모쓰케노쿠니(下野國) 하가 군(芳賀郡) 야마무로 촌(山室村) 오아자(大字) 쓰루다(鶴田) 에 기우제 지장(雨乞地藏) 이라고 부르는 1척 정도의 석상이 있었다. 크게 가물었을 때에는 마을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지장 석상을 굵은 밧줄로 묶어서 모두가 논밭으로 끌고 다녔다. 마지막에 그 석상을 지역의 수호신을 모신 신사(鎭守神社) 의 변소 옆 연못까지 끌고 가서, 수심이 깊은 물속에 내던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행사가 있다. 이 행사도 모든 마을 젊은이들이 협력해서 해야 할 터인데, 그 마을 출신 젊은이들은 바라만보고 있고, 새신랑들만이 이 일을 하도록 하였다. 새신랑이 연못으로 뛰어들어, 물속으로 들어가 석상을 껴안고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를 기다리고 있던 마을 젊은이들이 사방에서 물을 끼얹어서 숨을 못 쉬도록 만든다. 새신랑이 숨이 차서 괴로운 나머지 석상에서 손을 놓고 물속으로 빠지면, 이번에는 다른 새신랑이 교대하여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난다. 마을사람들의 미움을 산 새신랑에게는 물을 뿌릴 때에 진흙, 모래, 돌 등을 섞기도 했다고 한다.
[사례2]는 [사례1]에 비해서, 무코이리콘에 의해서 외부에서 마을로 장가를 든 새신랑에게 가하는 제재가 더욱 가혹하다.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에 차별적으로 새신랑들로 하여금 힘든 일을 도맡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신랑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물을 끼얹어 괴롭혔는데, 이는 일본 민속에서 미즈이와이(水祝い) 라고 부르는 무코이지메의 한 방법이다. 미즈이와이는 일본 각지에서 무코이지메의 일환으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민속적 관행이다. [사례2]에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물에 진흙, 모래, 돌 등을 섞어서 새신랑을 괴롭히기도 하였다.
[사례3]
우젠노쿠니(羽前國) 히가시무라야마 군(東村山郡) 마스 촌(增村) 오아자(大字) 야노메(矢野目 )는 옛날에 모미이 촌(?井村) 이라고 불렀다. 이는 오래된 우물에서 벼(?) 가 나왔기 때문이다. 옛날 이 촌에서는 음력 정월 7일에, 작년에 마을로 새로 장가를 든 신랑을 그 우물에 집어넣고 미즈이와이(水祝い) 를 하였다. 만약 신랑 손발에 상처가 생기면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고 전해진다.
[사례3]에는 앞서 [사례2]에 등장하는 미즈이와이 풍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음력 정월에 행하는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무코이지메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례3]의 무코이지메에는 앞서 소개한 [사례1]이나 [사례2]와 달리, 일종의 점복 기능도 있었던 듯하다. 미즈이와이 과정에서 신랑의 손발에 상처가 생기면 헤어진다는 속신이 함께 전해진다.
[사례4]
가이노쿠니(甲斐國) 히가시야마나시 군(東山梨郡) 이와테 촌(岩手村) 에서는 해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작년의 모내기 이후에 마을로 장가를 든 새신랑이 논에 들어가 있을 때를 노려서,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 새신랑에게 논흙을 내던진다. 이를 가리켜 도로카케이와이(泥かけ祝) 라고 한다. 약 30분 정도로 끝나는데, 양쪽 모두 하천에서 몸을 씻고서 끝을 낸다. 그 사이에 신부는 간단한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가지고와, 모두가 논두렁에서 함께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다. 만약 신부가 술과 안주를 대접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새신랑을 따돌렸다.
[사례4]는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새신랑을 괴롭히는 무코이지메의 사례이다. [사례4]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새신랑에게 물 대신에 진흙을 내던졌다. 이를 가리켜 도로카케이와이(泥かけ祝)라고 불렀다. 마을사람들이 논에 들어간 새신랑을 괴롭힌 후에, 신부가 준비한 술과 안주를 함께 들면서 화해를 하였다. 이로써 새신랑도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신랑은 두고두고 따돌림을 받았다. 말하자면 [사례4]의 경우도 새신랑이 마을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적인 성격을 지닌 무코이지메였던 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찰한 무코이지메 사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하게도 사례에 등장하는 사위들은 공통적으로 마을사람들의 가혹한 제재와 불합리한 차별을 순순히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인용한 네 가지 전형적인 사례는 물론이고, 무코이지메에 대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사위가 마을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서 대항하고자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이는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의 사회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겉보리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속담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쌀겨 세 홉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하지 말라(小糠三合あるならば入り?すな)”는 속담이 존재한다.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무코이리콘에 의해서 처가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즉,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의 처지란 보기에도 초라한 매우 궁색한 입장이었다. 처가 사람들은 물론이고, 처가가 위치한 마을 사람들이 그 사위를 제대로 대접하였을 리가 만무하다. 말하자면 처가살이 하는 사위를 ‘바보’처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위를 향한 그 같은 차별적인 시선이 민담에 반영된 결과, <바보 사위> 민담이 탄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보 사위> 민담은 무코이리콘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혼인방식에 수반되는 무코이지메라는 민속적 관습이 반영되어 형성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보 사위> 사례를 검토하며 확인하기로 한다.
4. ‘타자’로서의 바보 사위(愚か?) 의 ‘이문화’ 적응과정
<바보 사위> 민담에 등장하는 사위의 처가에서의 생활, 특히 무코이리콘 방식에 의한 처가생활이란 매우 궁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 생활은 타자에 가까운 사위가 처가라고 하는 ‘이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위는 처가의 문화적 풍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온갖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사고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사위가 범하는 다양한 실수는 <바보 사위> 민담을 재미있게 만드는 모티브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의 여러 가지 실수가 <바보 사위>라고 하는 민담에 모티브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한다.
[사례5]
바보 사위가 살았다. 새신랑(新?) 으로, 어느 날 장인 집에서 신부와 함께 오도록 불렀다. 신부는 신랑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함께 걷기가 싫어서 먼저 가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신랑에게 “가는 길마다 쌀겨를 흘려놓고 갈 테니까 그 것을 보고 따라오면 처가에 찾아올 수 있어요.”라고 일러두었다. 신랑은 나중에 혼자서 쌀겨를 따라서 걸어갔다. 그러자 도중에 신부가 흘려놓은 쌀겨가 바람에 날려서 물이 마른 하천으로 떨어졌다. 신랑은 신부가 당부한 대로 쌀겨가 흩어진 하천으로 들어갔다. 가문이 새겨진 예복을 입은 채로 진흙 속을 헤쳐 나갔다. 그리하여 겨우 장인 집에 도착하였다. 신부는 “그 행색이 도대체 뭐예요.”라고 진흙투성이가 된 신랑을 나무랐다. 아무튼 옷을 새로 빨아 입고서 장인 집에 머물게 되었다. 신부는 그 신랑이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먼저 먹어야할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랑 등에 끈을 달아서 그 끝을 본인이 붙잡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 채지 않도록,‘쑥’하고 잡아당기면 오쓰케おつけ를 먹고,‘쑥쑥’하고 잡아당기면 밥을 먹고,‘쑥쑥쑥’하고 세 번 잡아당기면 생선을 먹도록 정해놓고서 신랑에게 다짐을 받았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고 부부는 처음에 정해놓은 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신랑은 신호대로 먹어서 그 먹는 순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손님들은 신랑이 바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대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지켜보았다. 도중에 신부가 변소를 가고 싶었다. 잠깐 비우는 것은 괜찮겠지 하고서, 끈을 기둥에 묶어두고서 변소를 갔다. 그 잠깐 사이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끈에 걸려 허우적거리면서 끈을 계속해서 잡아당겼다. 신랑은 그것을 신부의 신호로 잘못알고, 때는 이 때라는 생각으로 국이고 밥이고 생선이고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입에 집어넣었다. 이를 지켜보던 손님들은 비로소 역시 이 녀석은 바보였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