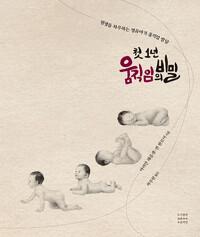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9113082010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3-01-27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문화기억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전제
제2장 기억과 사회
1. 기억의 사회적 성격
1) 알박스의 집단기억
2) 얀 아스만의 문화기억
3)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기억
4) 푸코의 대중기억과 랜즈버그의 보완기억
2.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기억
1) 디지털 네트워크 미디어와 기억 환경의 변화
2) 기억 환경의 변화에 의한 문화기억론의 확장
3. 대중음악과 문화기억
제3장 문화기억과 유튜브
1. 유튜브의 미디어 조건과 위상
1) 동영상 플랫폼
2) SNS 플랫폼
3) 음악 플랫폼
2. 유튜브 공간과 음악적 경험
1) 라이브 영상
2) 커버 영상
3) UCC 뮤직비디오
4) 오피셜 뮤직비디오
5) 오디오 중심 영상
6) 리액션 영상
7) 플레이리스트 영상
8) 기획보도 영상
9) 해석 영상
3. 문화기억 공간으로서의 유튜브
1) 기억의 아카이브로서의 유튜브
2) 기억의 산실로서의 유튜브
3) 사회적 틀로서의 유튜브
제4장 유튜브에 나타난 대중음악의 문화기억 구조
1. 기록과 저장
1) 김연실의 <아르렁>과 안종식의 <단가> 외
2) 엄정화의 <다가라>
3) 군중집회의 360도 영상
4) 조용필의 <허공> 뮤직비디오
2. 선별과 큐레이션
1)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2) 경성시대 추천곡
3. 피처링과 재인식
1) 양준일의 <크레용>?
2)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3)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4) BTS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
4. 패스티시와 패러디
1) 아델의 <헬로>
2) 비의 <깡> 뮤직비디오
3) 포 논 블론즈의 <왓츠 업>
제5장 확장, 순환, 가변의 기억 공간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책속에서
책머리에 중에서
기억은 역사와 더불어 과거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역사가 거시적이고 총체적이며 이미 판정 내려진 고정된 명제의 모습이라면 기억은 불안정하고 파편적이지만 사적이고 친밀해 주체와 더 결부된 느낌이다. 기억은 그러므로 구체적 삶의 서사이자 현존의 모습이다. 존재는 기억들로 입증되기에 기억이 바뀌면 그림자도 바뀐다. 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곧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억은 곧 세계 인식의 기제이다. 인류는 자신이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려 전승하기에 기억이 곧 문화를 이룬다.
우리가 이토록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문화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동력을 잃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암울한 현재와 희망 없는 미래로부터의 도피인 것일까? 선후 관계야 어찌 됐건 지나간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이 문화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에는 분명 유튜브가 있다. 유튜브는 디지털에 힘입은 기록 기술이 인터넷과 만나 만개한 지점에 있다. 이제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기록하고 싶은 모든 순간은 간편하게 촬영되거나 다른 미디어에서 재활용되어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것은 임의로 삭제되지 않는 이상 영원한 존속을 보장받는다. 유튜브는 인류의 방대한 기억 창고가 되었다. (중략)
이 책은 곧 디지털 시대 기억 공간의 총아로서 유튜브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른바 ‘유튜브 시대’는 변화한 기억 환경에 대한 전제이고, ‘어떻게’는 기억 양상에 대한 물음이다. ‘문화’는 기억이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기억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즉 기억은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능동적 과정이라는 것,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기억한다는 것 ― 집단기억, 문화 그리고 문화적 실천과 집단기억 ― 문화기억론, 기록보관소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중음악을 유튜브 문화기억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는 중심 사례로 삼을 것이다.
이 책의 이론적 토대는 알박스의 집단기억론과 그로부터 전개된 아스만의 문화기억론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변화한 기억 환경에서 유튜브의 기억 탐구를 위해서는 동시에 아스만 문화기억론의 응용과 확장이 필요했다. 다행히 ‘디지털 기억’에서 기억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교적 최근 연구성과들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의 기억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전제들을 구상할 수 있었다.
문화기억은 알박스의 집단기억 개념을 확대 계승한 얀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시한 개념이다. 알박스의 집단기억이 기억을 공유하는 단일 집단과 그들의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기억은 ‘문화적 실천’을 통한 재현에 의해 기억이 보존, 전승, 강화되며 그에 따른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획득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또 문화기억은 사회 내 소통되는 다양한 기억 형태들을 포괄하는 보다 유연한 개념으로 설정되고 과거 사실에 대한 인간기억의 외재화, 물화된 차원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대중음악 콘텐츠를 유튜브상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장르 중 하나의 표본집단적 성격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정은 곧 대중음악 콘텐츠라는 표본집단에서 나타나는 문화기억의 양상이 유튜브상의 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경험과 그에 의한 문화기억의 양상을 가늠하게 해줄 수 있기에, 이는 곧 디지털 시대 온라인 공간에서 문화기억의 일면을 대표해줄 수 있으리라는 전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사용자들의 적극적 문화 실천의 장이자 기억의 저장고로서 오늘날 유튜브의 성격과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전제로, 디지털 시대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단기억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유튜브 대중음악 콘텐츠와 이를 통해 구성되는 문화기억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