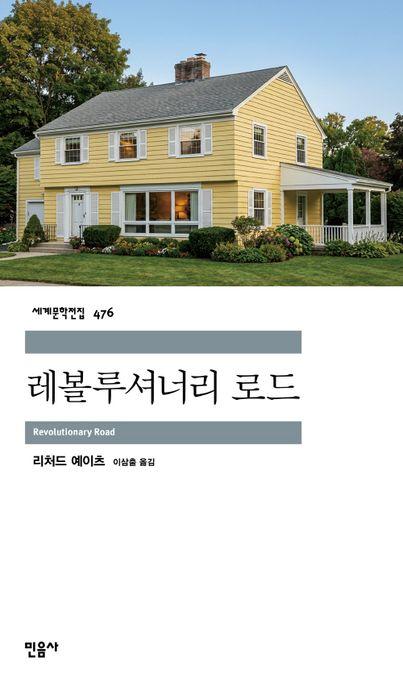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로맨스소설 > 한국 로맨스소설
· ISBN : 9791155120408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13-05-30
책 소개
목차
1. 해고통보
2. 그녀만의 승부수
3. 까칠한 그 남자, 이강우
4. 매니저라는 남자와의 동행
5. 이면계약
6. 거짓 대 진심, 혹은 진심 대 진심
7. 순천여행, 흔들리는 갈대밭, 고백
8. 진도와 진도 사이.
9. 고순영. 안단테 칸타빌레(andante cantebile), 느림보, 현재 그의 약점
10. 불편한 인연
11. 안식처, 린
12. 현대인의 자질, 이기심
13. 젊음과 청춘, 기다림
14. 기다려. 단지 당신 곁에서.
15. 소심한 그녀.
에필로그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순영은 풀어진 얼굴로 웃었다. 이해했던 점인데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처음을 되돌린 그의 얼굴에 미소가 어른거렸다.
“솔직히 말해 봐. 얼마나 기다린 거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는 몰랐어요. 한 시간쯤 된 것 같아요.”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
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묻자 순영은 고개를 내저었다.
“근데 정말 지루 하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오늘 강우 씨 바쁜 것 알고 있었지만 그냥 와보고 싶었어요.”
“그냥 와보고 싶었다, 라…….”
말을 곱씹던 그가 홀연히 물었다.
“말 사이사이에 중요한 말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바싹 다가선 강우가 내리깐 눈매로 자신을 응시하자, 순영 역시 멋모르고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 사이 빠진 말이 뭐예요? 라고 묻듯.
“다리 아프지 않았어?”
“다리는 튼튼한 편이라 괜찮아요.”
“기대.”
갑작스러운 그의 말이 난감해 순영은 얼어붙었다. 꼼짝하지 않는 그녀에게 가슴을 두드려 보이며 고개를 비튼 그가 재촉했다.
“뭐해?”
“괜찮아요. 다리 정말 안 아파요.”
“그렇겠지. 당신은 항상 괜찮은 여자니까. 그런데 내가 안 괜찮아. 기대. 전봇대라 생각하고. 나쁜 짓 안할 테니까.”
그는 손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허리를 감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도 순영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서? 아님 내가 억지로 해? 세상에 움직이는 전봇대가 어디 있나?”
느릿한 재촉. 순영은 용기를 내 조금씩 그에게 머리를 가까이 가져갔다. 마지막 순간 그래도 망설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깨끗하게 관리했어. 고순영한테만 허락된 전봇대니까 안심해.”
이 어색함을 어쩜 좋지? 순영은 어찌할 바 몰라 숨을 참았다. 그리고 강우의 가슴 언저리에 홀씨처럼 살포시 머리를 댔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저 댔을 뿐인데 찬바람이 막아지고 내내 꼿꼿했던 종아리에서 힘이 풀린다. 기다렸던 한 시간이 무색해질 만큼 따뜻했다. 괜히 뭉클해진 마음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머리 위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건 그동안 날 기다렸을 모든 시간에 대한 사과.”
아…….
그렇게 말해주는 강우에게 순영은 할 말을 잃었다. 모두 다 자처했던 기다림. 사과 할 필요 없이 지나버린 일들. 무뚝뚝해보여도 그녀에게만큼은 세심하게 변하는 남자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다. 커다란 독수리 같은 그는 어울리는 큰 날개를 가진 남자였다. 강우의 낮은 저음이 순영의 머리 위에서 독백처럼 울렸다.
“나는 지겨웠어. 할아버지가 길을 내려갈 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지겨웠고, 차를 차고에 세우는 순간도 그랬어. 하물며 여기까지 오는 그 몇 분이 지겹더라. 기다림이란 게……. 그런 지겨움이란 거. 오랜만에 깨달았어. 예전에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될 때까지 비행기에서 느꼈던 그 몸서리치던 지겨움 이후로는 처음이었으니까.”
강우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순영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것들이었다. 예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는 말이 무엇보다 놀라웠다. 늘 건조한 그의 말투가 오늘따라 촉촉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별로.”
뭐라고 묻고 싶어 고개를 들었던 순영은 자신을 내려다보던 강우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바람에 뒤치락댄 순영의 머리카락들이 부스스 일어났다. 가닥가닥이 촉수처럼 그의 가슴에 거미줄처럼 달라붙자 순영은 조용히 머리를 뗐다. 당황해 땀이 날 것 같았다. 이제 머리카락은 얼굴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남자 가슴에 불 지르다 마는 거야?”
순영은 바람 부는 날 그의 가슴에 절대로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고개를 비스듬히 내리고 얼굴이 시뻘게진 그녀를 들여다보듯 바라본 그가 당연한 듯 물었다.
“다 쉬었으면 이제 집 구경 해야지?”
요즘 들어, 선택 할 일이 많아졌다. 업무라면 당연히 따라 갔을 그의 집, 하지만 남녀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순영은 고민 어린 얼굴로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괜찮아. 적어도 새벽 두시는 아니니까. 차 한 잔 마신 후에 데려다 줄 거고, 누구처럼 몰래 온 것도 아니니까.”
강우가 앞서 걸었다. 그가 문을 따는 동안 순영은 버석거릴 정도로 말라버린 입술을 깨물고 미간을 모았다. 징검다리를 걷는다. 그는 아는데, 자신은 모르는 말들로 이루어진 수수께끼의 다리를.
“들어와.”
강우가 그녀를 향해 문을 열어보였다. 순영이 망설이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은 못 가. 차라리 들키지를 말든가, 나처럼.”


































![[세트] 고양이 파견 클럽 1~2 세트 - 전2권](/img_thumb2/K0520315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