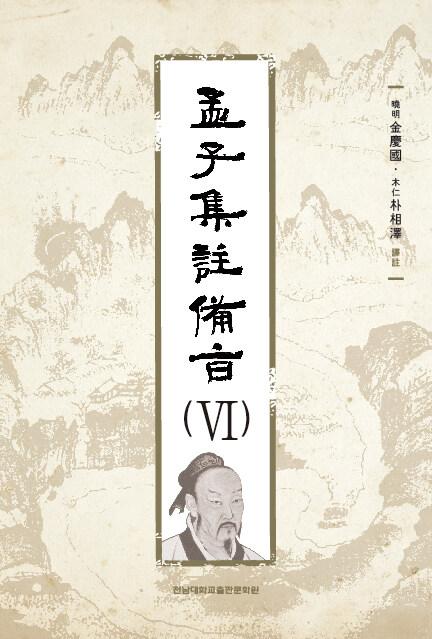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어문학계열 > 중어중문학
· ISBN : 9791193707821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5-02-26
책 소개
목차
Ⅰ. 사서(四書) 해제(解題)
사서(四書) 해제(解題) / 14
1. ≪논어(論語)》 / 17
2. ≪맹자(孟子)》 / 40
3. ≪대학(大學)》 / 63
4. ≪중용(中庸)》 / 113
Ⅱ. 사서(四書) 선역(選譯)
1. 《논어(論語)》 선역(選譯) / 148
2. 《맹자(孟子)》 선역(選譯) / 228
3. 《대학(大學)》 선역(選譯) / 308
제1장 명명덕(釋明明德) / 316
제2장 신민(釋新民) / 316
제3장 지어지선(止於至善) / 317
제4장 본말(本末) / 318
제5장 격물치지(格物致知) / 319
제6장 성의(誠意) / 320
제7장 정심수신(正心修身) / 321
제8장 수신제가(修身齊家) / 323
제9장 제가치국(齊家治國) / 324
제10장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 326
4. 《중용(中庸)》 선역(選譯) / 329
제1장 천명(天命) / 329
제2장 시중(時中) / 334
제3장 선능(鮮能) / 336
제4장 행명(行明) / 337
제5장 불행(不行) / 338
제6장 대지(大知) / 339
제7장 여지(予知) / 340
제8장 복응(服膺) / 340
제9장 가균(可均) / 341
제10장 문강(問强) / 342
제11장 소은(素隱) / 343
제12장 비은(費隱) / 344
제13장 불원(不遠) / 345
제14장 소위(素位) / 347
제15장 행원(行遠) / 348
제16장 귀신(鬼神) / 349
제17장 대덕(大德) / 351
제18장 무(無憂) / 352
제19장 달효(達孝) / 353
제20장 문정(問政) / 355
제21장 성명(誠明) / 357
제22장 진성(盡性) / 358
제23장 치곡(致曲) / 359
제24장 전지(前知) / 361
제25장 자성(自成) / 362
제26장 무식(無息) / 365
제27장 명철(明哲) / 366
제28장 자용(自用) / 368
제29장 삼중(三重) / 370
제30장 돈화(敦化) / 371
제31장 지성(至聖) / 374
제32장 지성(至誠) / 375
제33장 상경(尙絅) / 377
찾아보기 / 378
저자소개
책속에서
Ⅰ. 사서(四書) 해제(解題)
사서(四書) 해제(解題)
사서(四書)란 《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대학(大學)》ㆍ《중용(中庸)》의 네 가지 유학경전을 말한다. 이 사서는 남송(南宋)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朱子)가 이에 대한 주해(註解)를 달아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지음으로써 유학에 있어서 그 지위가 확립되었다. 주자는 《대학》이 공자(孔子, B.C. 552~479)의 제자인 증자(曾子, B.C. 505~435)가 지은 것이고,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것이라고 여기고, 여기에다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와 맹자(孟子, B.C. 372~289)의 언행을 기록한 《맹자》를 한데 묶어 이것을 “사서(四書)”라고 한 것이다. 당대(唐代) 이전의 유학(儒學)이 오경(五經)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에 비하여, 송대(宋代) 이후의 유학은 사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대학》은 본래 《소대예기(小戴禮記)》 49편 중 제42편에 들어있던 것을 전한(前漢)의 유향(劉向, B.C. 77~6)이 그의 《별록(別錄)》에서 《대학》을 〈통론류(通論類)〉에 넣음으로써 《대학》을 유학의 개론서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예기》는 공문(孔門) 칠십제자(七十弟子)의 기록이라고 하나 저작연대가 불확실하여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에 지어졌다는 설과 전한(前漢) 시기에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그 후 당(唐)나라 한유(韓愈, 768~829)가 《대학》을 기본으로 〈원도(原道)〉 편을 지어 소위 ‘도통(道統)’설(堯舜禹湯文武周公)을 주장하면서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을 언급하였고,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처음으로 《예기(禮記)》에서 취하여 《대학광의(大學廣義)》와 《중용광의(中庸廣義)》를 지었다.
《논어》는 모두 20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논어》의 편찬자에 대하여 유향이 최초로 그의 《별록(別祿)》에서 “공자의 제자들이 훌륭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고, 후한(後漢) 정현(鄭玄, 127~200)은 《논어서(論語序)》에서 “《논어》는 중궁(仲弓)ㆍ자유(子游)ㆍ자하(子夏) 등이 찬정(撰定)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대(唐代) 유종원(柳宗元, 773~819)은 〈논어변(論語辨)〉에서 공자와 증자의 나이 차이, 《논어》에 오직 증자와 유자(有子)만이 존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논어》의 편찬자는 증자의 문인인 악정자춘(樂正子春)과 자사의 무리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자는 이 설을 근거로 《논어서설(論語序說)》에서 《논어》는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대(淸代) 최술(崔述, 1740~1816)은 《논어여설(論語餘說)》에서 《논어》의 의심스런 점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논어》 20편 중 전(前) 10편만이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기록한 것이고, 후(後) 10편은 후인들이 속기(續記)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주장들에 근거하면 《논어》가 한 시기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맹자》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ㆍ맹자순경열전(孟子荀卿列傳)》에 의하면 맹자가 자신의 제자인 만장(萬章)의 무리들과 함께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정리한 후, 중니(仲尼)의 뜻을 조술(祖述)하여 지은 것으로 모두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서(漢書)ㆍ예문지(藝文志)》의 〈제자략(諸子略)〉에 《맹자》 11편이 실려 있고, 응소(應劭)의 《풍속통의(風俗通義)ㆍ궁통(窮通)》 편에도 맹자가 《중외(中外)》 11편을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맹자》 최초의 주해서인 조기(趙岐)의 《맹자제사(孟子題辭)》에는 맹자가 “7편의 책을 지었다”고 했으니, 〈외서(外書)〉 4편은 후인들의 위작(僞作)임이 확실하다. 《맹자》에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을 중시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다음이며 인군(人君)은 가장 가볍다.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고 하였다.
《중용》은 본래 《예기(禮記)》 제 31편에 들어있던 것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ㆍ공자세가(孔子世家)》에 《중용》의 저자를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라고 했고, 이정자(二程子)는 《중용》을 “공문(孔門)에 전수되어 내려온 심법(心法)”이라 하였으며, 주자가 이를 계승 발전시켜 《중용장구(中庸章句)》와 《중용혹문(中庸或問)》을 지어 《중용》의 의의를 밝혔다.
1. 《논어(論語)》
1) 《논어》의 유래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의 고본에는 원래 《노논어(魯論語)》ㆍ《제논어(齊論語)》ㆍ《고논어(古論語)》 등 세 종류가 있었지만, 이 원본들은 전한말(前漢末)에 대부분 일실(佚失)되었다.
《노논어》는 노(魯)나라에서 전해온 것으로 모두 20편이고, 《제논어》는 제(齊)나라에서 전해온 것으로 모두 22편인데, 《노논어》보다 〈문왕(問王)〉과 〈지도(知道)〉 두 편이 더 많다. 한(漢)나라 무제(武帝)때 공자의 고택에서 발견된 《고논어》는 모두 21편이며 과두문자(蝌蚪文字)로 기록되었는데 전한 말에 그 원형이 없어졌다.
한편 전한 말 장우(張禹)가 하후건(夏侯建)에게서 배운 《노논어》와 용생(庸生)ㆍ왕길(王吉)에게서 배운 《제논어》 두 가지를 합해서 20편으로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하는 《논어》의 원형이 되었다. 장우가 안창후(安昌侯)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가 편찬한 논어를 《장후론(張侯論)》이라고도 부른다. 《수서(隋書)ㆍ경적지(經籍志)》에 의하면, 《장후론》은 《제논어》의 〈문왕(問王)〉ㆍ〈지도(知道)〉 두 편을 없애고 《노논어》와 같이 20편으로 교정하였다고 했는데, 이 《장후론》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후 후한 정현(鄭玄)이 《장후론》을 근간으로 해서 지은 《논어주(論語注)》가 바로 노(魯)ㆍ제(齊)ㆍ고논어(古論語) 3종을 절충한 현전본 20편으로 당시에는 널리 알려졌으나 지금은 그 일부만이 전할 뿐이다.
오늘날 완정(完整)하게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논어》 판본은 위(魏)나라 하안(何晏, ?~249)이 편찬한 《논어집해(論語集解)》 10권(古註)이다. 또한 양(梁)나라 황간(皇侃)이 편찬한 《논어의소(論語義疏)》 10권도 널리 유행했는데, 이 《논어의소》를 교정한 송나라 형병(邢昺)의 《논어정의(論語正義)》 20권이 현재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에 수록되어 있다. 그 후 남송 주희(朱熹)가 형병(邢昺)의 《논어정의》를 바탕으로 전인(前人)들의 여러 가지 해설을 참고하여 《논어집주(論語集註)》 10권(新註)을 완성했다.
주희는 일찍이 34세 때 《논어요의(論語要義)》를 지었으나 아쉽게도 전하지 않는다. 그 후 43세에 이르러 이정(二程)과 장재(張載)ㆍ범조우(范祖禹)ㆍ여희철(呂希哲)ㆍ여대림(呂大臨)ㆍ사량좌(謝良佐)ㆍ유초(游酢)ㆍ양시(楊時)ㆍ후중량(侯仲良)ㆍ윤돈(尹焞)ㆍ주부선(周孚先) 등 열두 명의 학설을 두루 취하여 《논맹정의(論孟精義)》를 지었다. 이어서 그 정밀한 본지(本旨)를 요약하여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짓고 다시 《사서혹문(四書或問)》을 지었으니, 당시 주희의 나이 48세였다. 이 《사서집주》는 고거(考據)와 의리(義理)를 모두 중시했으나 의리에 치우친 바가 많고, 문자훈고(文字訓詁)를 중시한 반면 명물훈고(名物訓詁)에는 구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