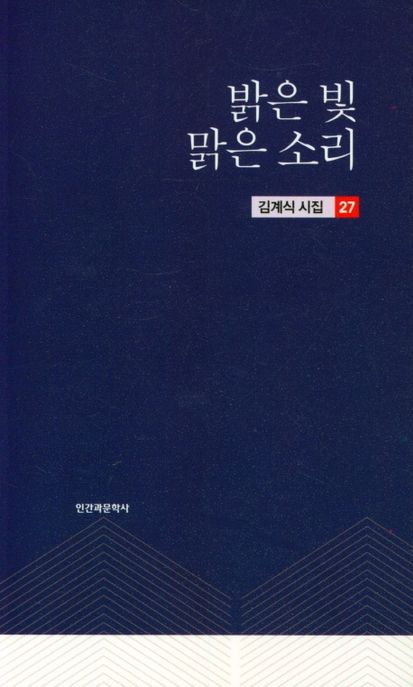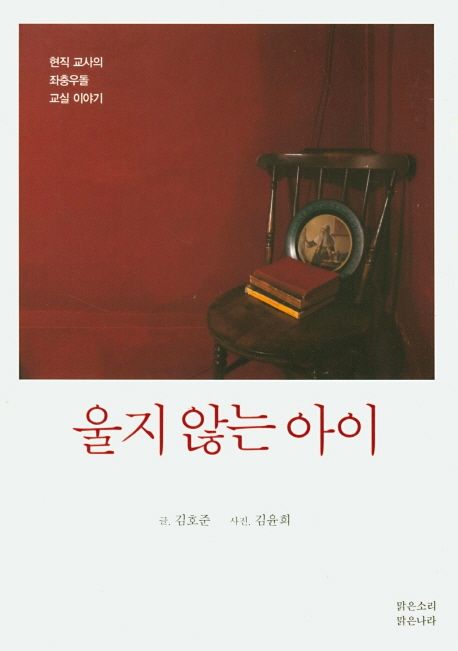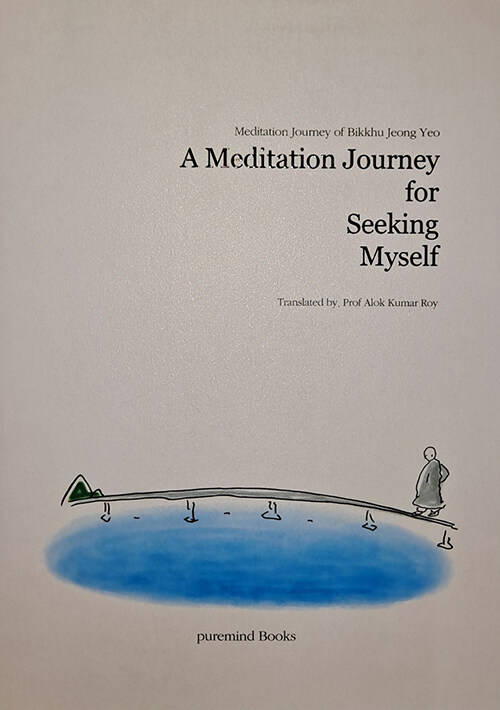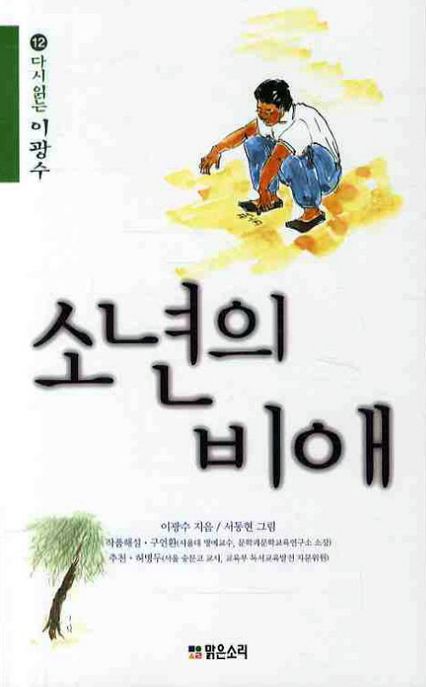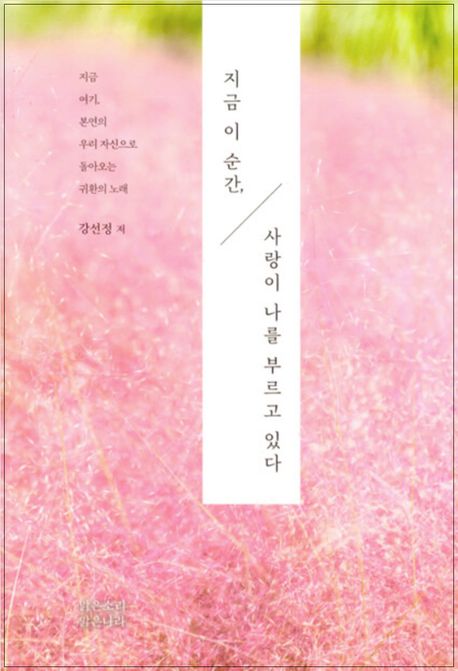인문을 품은 자연 (록명헌 견현여행)
정영석 | 맑은소리맑은나라
16,200원 | 20251029 | 9791193385272
자연의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美不自美因人而彰). 자연도 인문의 향기가 스며야 울림을 준다는 말이다.
소세양은 송순이 만든 정자 면앙정(俛仰亭)에 와서 “산과 물은 무정하여 반드시 사람을 만나 드러난다.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이나 황주(黃州)의 적벽(赤 壁)도 왕희지(王羲之)와 소동파(蘇東坡)의 붓이 없었더라면 한산하고 적막한 물 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반문했다. 중국 사오싱(紹興)에 있는 난정을 가보니 과연 그러했다.
내가 견현사재(見賢思齋)할 곳을 찾아 여행하는 이유는 선현(先賢)들의 발자취를 살펴 새 길을 만들어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록명헌을 부산역과 크루즈 터미널이 맞물린 곳에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정영석
국내외 사적(史蹟) 여행기 『인문을 품은 자연』은 시간을 내어 사적지를 찾아가 어떠한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본 적이 있었는가 라고 되돌아보게 한다. 책에 소개된 각 사적지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사료(史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등을 상세히 싣고 있으며, 이러한 사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에서 저자의 전문가적인 안목과 수준이 엿보인다.
책엔 현장 관리하시는 분의 친절한 안내와 해설을 그대로 옮기고 있어, 사진과 함께 읽다 보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인근에 밥집들도 쉬는 날이라 찾는 이가 거의 없어 좋다. 이렇게 방문객이 적은 날에는 사랑채 아래 창고 문부터 열어 보고 싶었다. 빠듯이 닫힌 문을 도둑질 하듯 삐쭘이 열고 들어가 원하던 남근석 사진을 운 좋게 찍고 나오니 관리 하시는 분이 다가온다. 송구하다 말씀 드리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안채, 대청마루, 곳간, 사당, 침모방(?), 사랑채, 안사랑채를 세세하게 안내 하신다. 호사를 누린 것이다.” - 01 백세청풍 일두고택
어느 고찰(古刹)이든 고승(高僧)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그곳을 방문했더라도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쉽지 않다. 애써 찾아보거나 알아내려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천년 고찰 직지사에 전해 내려오는 사명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사명대사(1544.10.17~1610.8.26)가 출가하기 전, 사천왕문 앞 바위에서 잠자는 모습이 참 선하던 주지의 눈에 승천하는 황룡으로 보여 제자로 삼았다고 하거니와 임란때는 승병을 이끌었고, 강화사절단으로 에도 막부에 가서는 도꾸가와의 간담을 서늘케 한 담판을 해 두고두고 회자된다. “그대는 어느 산에 사는 잡새이길래 감히 봉황의 무리 속에 찾아 왔느냐”고 하자 “나는 본시 청산에 놀던 학으로 오색 구름과 놀았는데 잘못되어 들판 닭무리 가운데 떨어졌노라”라고 대꾸했다고 전한다. “사흘 동안 벼슬살이 한 것은 임금의 명을 어길 수가 없는 까닭이요, 한밤중에 산으로 돌아온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남겼다. - 06 직지사 수미산방 방초정
곧이어, 저자는 가깝지만 먼 나라, 바다 건너 일본으로 발길을 돌린다.
조선과 명나라를 침탈하기 위해 축조한 거대한 히젠나고야성(肥前名護 屋城)을 우중에 둘러보니 만감이 교차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고향 나고야와 같은 발음의 성을 축조하고 야심을 불태우던 곳. -중략-
임진왜란 선봉에 섰던 히라도(平戶) 번주 마츠라 시게노부가 퇴각하면서 조선인 도공들을 끌고 온다, 그 중에 진해 웅촌 도공들도 있었다. 이들이 만든 백자는 1650년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의 주문을 받아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독일의 마이센 자기 탄생의 계기가 된다. 당시엔 그런 자기 제작 기술을 우리와 중국만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는 눈여겨보지 못했으니 안타깝다. -0 07 이마리(伊万里)의 조선도공들
그리고 부산에서 배로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의 대마도에 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백제에서 건너온 비구니 스님이 연 슈젠지(修善寺)에는 이곳에서 순국하신 최익현 선생의 기념비가 모셔져 있고 헌종때 병조판서 김학진의 낙관이 있는 수선(修善) 현액이 있다.
백제스님이 심었다고 전하는 1,500년이나 된 은행나무는 낙뢰, 태풍으로 중앙이 꺽이고 비어 있으나 둘레 12.5m 높이 23m나 되는 거목의 모습으로 왕성하게 버티고 서 있다.
고종의 막내딸 덕혜옹주는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식 교육을 받고 고종이 점지한 정인을 둔 채로 대마도주 아들 소 다께유끼와 정략결혼 하게 된다. 결혼 후 대마도를 방문한 흔적이 기념비로 남아 있다. 외동딸이 실종된 후 실어증, 조현병으로 이어져 이혼하게 되고 해방 후 20년이 다 돼서야 우여 곡절 끝에 1962년 귀국한다. 그분의 지난한 아픔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슬픔으로 남아 있다. - 08 대마도와 조선통신사 문위행
그리고, 조선통신사의 방일 루트 마지막 종착지 도쿄 동본원사를 소개하며, 일본 곳곳에 남아 전해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유적과 일본에 미친 영향력 등을 찾아볼 수 있다.
1811년까지 200년 동안 12차례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일본땅에 한류를 퍼트린 한일 교류의 선구자들이었는데 이 사찰(도쿄 동본원사東本願寺)이 최종 숙뱍지였다. 현재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법주의 부인은 한국인이라고 한다. - 09 조선통신사 종착지 도쿄 동본원사
여행은 이제 중국 심양을 향해 방향을 튼다. 저자는 2019년에 심양사범대 여름학기 수강신청을 하였고, 이는 우리의 아픈 역사 흔적들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따라 길을 안내한다.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원병으로 조선으로 간 틈을 이용해 여진족이었던 누르하찌가 후금(청)을 세우고 1625년 심양에 도읍을 정한다. 누르하찌의 8남 홍타이지가 청으로 국명을 바꾸고 명과 우호적이던 조선을 침공하여 무려 30만 포로를 끌고 온 곳이 이곳 심양 남탑 주변이었다 - 16 열하일기 심양(盛京)
심양을 출발한 연암은 신민, 북진을 거쳐 금주 지나 산해관에 닿는다. - 17 열하일기 산해관(山海關)
산해관은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며, 서복이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구하러 출항한 곳으로도 알려졌다. 그리고, 사당 맹강녀 묘에 전해 내려오는 슬픈 전설과 건륭제 지었다는 라마산장에서 연암과 티벳 승려 반선의 만남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등이 이어진다.
책 후반부에 실린 몽골 여행기가 눈길을 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이야기에 고개가 숙여진다.
이곳에 까지 오셔서 독립운동 하다가 순국하신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선생 기념관은 둘러보고 와야 한다.
함안 군북 출신인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의학교를 나와 안창호의 권유로 비밀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한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고 난징에서 김규식과 상의 끝에 몽골(고륜) 에서 동의의국을 설립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 39세에 순국한다. 여운형 선생은 몽고사막 여행기에서 ”이 땅에 오직 하나인 이 무덤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한 조선 청년의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이다”라고 적었다. - 21 울란바타르와 이태준기념관
책에 실린 모든 여행기엔 영예(榮譽)와 오욕(汚辱)이 공존하는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담겨 있다. 비록 그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는 기준은 언제나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확인하고 있다. 미추(美醜)를 따지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저자의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시각과 세심한 기록이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정용석 작가는 서문에서 견현사재(見賢思齋)할 곳을 찾아 여행한 기록임을 밝히고 있는데, ‘견현사재’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어진 모습을 보면 그와 똑같아지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어질지 못함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하느니라. 子曰(자왈) 見賢思齊(견현사제)하며 見不賢而內自省也(견불현이자성야)니라.”는 내용의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즉 다른 이의 어진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국내외 사적지나 유적지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옮김으로써 “선현들의 발자취를 살펴 새 길을 만들어 알리고 싶었다.”는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글 속에 녹아 있다. 또한 전문적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우며, 상세하면서도 숨은 의미 또한 놓치지 않는 저자의 안목이 돋보인다.
저자 향천 정영석은 부산의 독립유공자 동봉 이인희 선생의 사위로서, 전 부산 동구청장을 지냈으며, 부산역과 크루즈 터미널이 맞물린 곳에 ‘록명헌鹿鳴軒’ 이라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공간을 열어 내외국인들에게 부산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록명헌은 ‘사슴이 우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경의 한 구절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사슴이 울 때는 먹이가 있을 때이고, 반드시 친구와 함께 먹이를 나누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저서 『록명헌견현여행』, 『지중해 낙양 교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