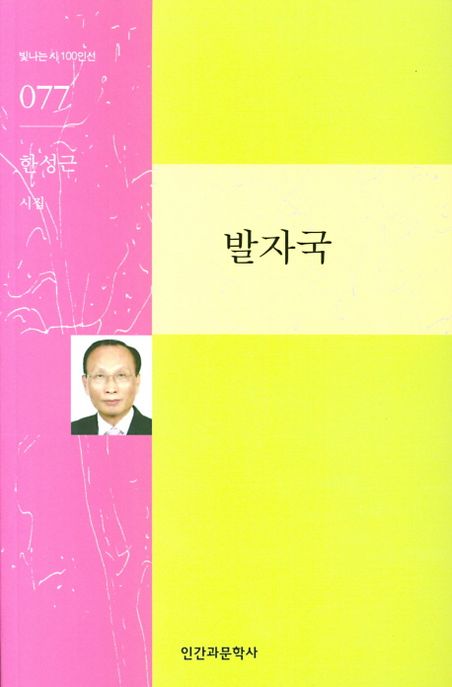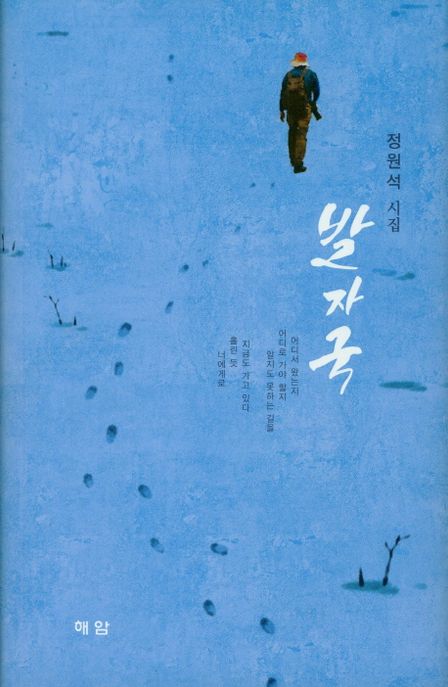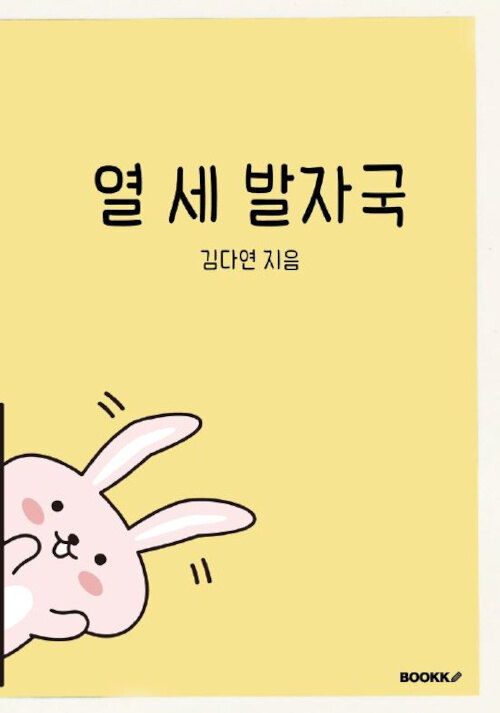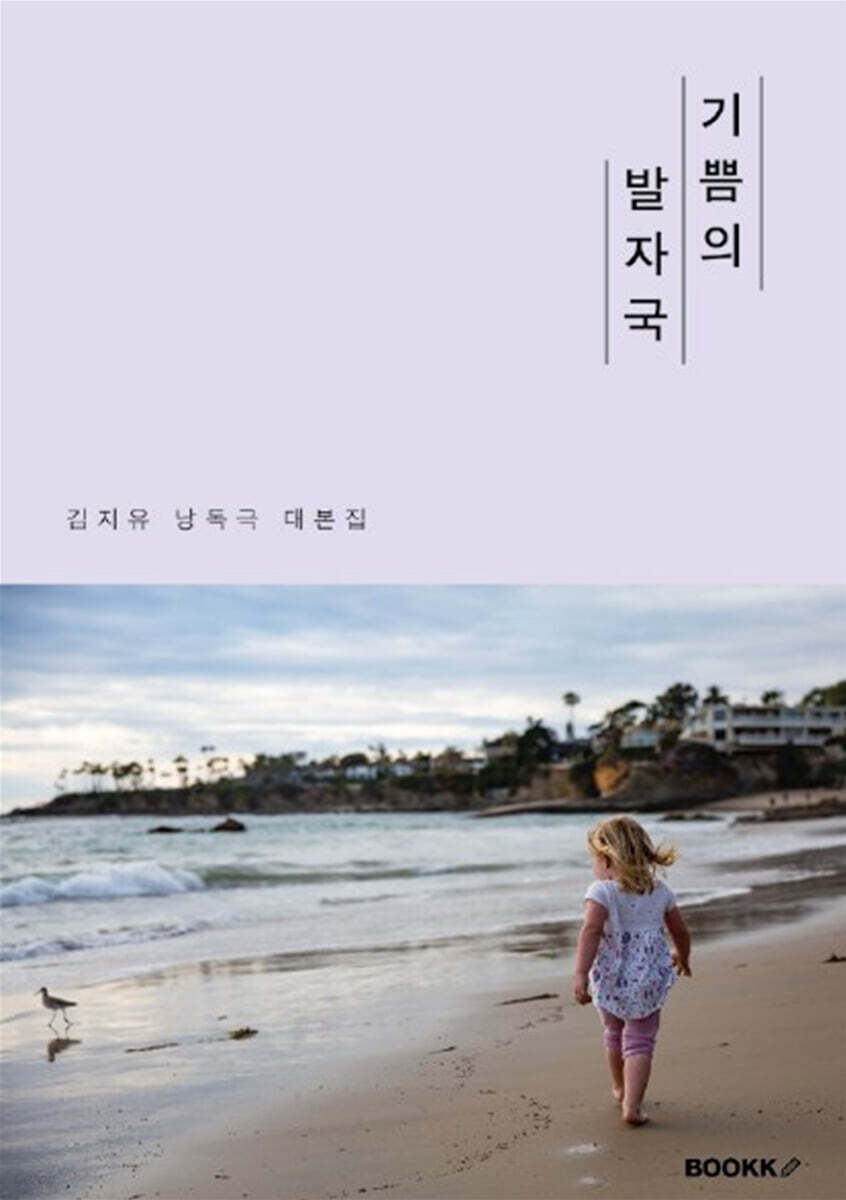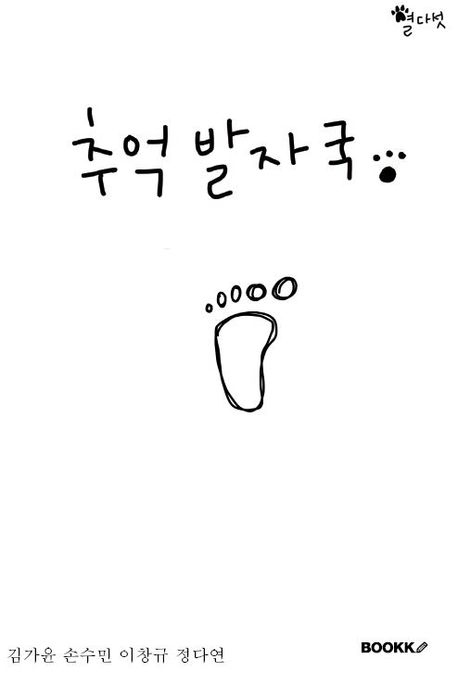물새 발자국 (구연백 시조집)
구연백 | 열린출판
10,800원 | 20250630 | 9791191201888
구연백 시인의 첫 시조집 『물새 발자국』(열린출판)이 출간되었다. 이 시조집은 시조의 정형미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적 감각과 깊이 있는 사유를 응축한 시편들을 담고 있다.
구연백 시인의 시조는 옛것으로 회귀하는 통로가 아니라, 존재를 묻는 사유의 그릇으로 새롭게 조명된다. 『물새 발자국』은 바로 그러한 시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조집이다.
구연백 시인은 “시조라는 문학 양식이 갖는 제약을 자율로 바꾸어낸다”고 평가되며, 고전적 형식을 따르되 그 안에서 언어의 숨결을 덧입히는 시적 실험을 시도한다. 이로써 『물새 발자국』은 시조 장르에 대한 깊이 있는 응답이자, 동시대적 문학적 회신이라 할 수 있다.
‘발자국’은 지나간 자리이며, 동시에 현재를 증명하는 표식이다. 구연백 시인의 첫 시조집 『물새 발자국』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시적 고백이 아니라, 존재의 흔적을 더듬고, 사유의 흔적을 기록한 한 권의 문학적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조집은 형식미와 서정성을 함께 갖춘 3장 6구의 단시조와 연시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조라는 장르가 갖는 고유한 제약을 창조적 자율로 승화시킨 점이 인상 깊다.
『물새 발자국』은 시인이 오랜 시간 다듬어온 언어적 사유의 결정체다. 수록된 시편들은 조용하고 단정한 외양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감각의 진동과 절제된 정념이 겹겹이 배어 있다. 이는 침묵의 형식 속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언어이며, 존재의 고통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해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시조집은 “언어로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를 형식 안에 견고히 녹여낸다. 단순한 회상의 시가 아니라,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문학적 응답인 것이다.
시조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 고유의 정형시다. 구연백 시인은 이 정형을 단지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틀 안에서 언어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전과 현대의 감각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그의 시는 ‘형식’과 ‘내용’의 진정한 융합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리듬감과 현대적 정서의 충돌과 조화를 통해 시조 문학의 현재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낡은 형식으로 오해되기 쉬운 시조가 그의 언어 안에서는 감각적이고 철학적인 장르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시조집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과 인간, 존재와 부재, 기억과 사라짐에 대한 주제들이 반복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는 점이다. ‘물새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모든 존재는 언젠가 사라질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사라짐 속에서도 흔적을 남기려는 시인의 내면이 각 시편에 녹아 있다. 이 흔적들은 독자에게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묻게 만든다. 그의 시는 그래서 정적이지만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형식의 고요 속에서 사유는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은 독자의 의식 속에서 새롭게 깨어난다.
구연백 시인은 충남 당진 출생으로, 한문교육과 청소년 인성교육에도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인물이다. 2022년 한국시조협회 신인상 수상작 「설총」을 통해 시단에 정식으로 등단했으며, 이후 강원시조시인협회 문학상, 문예춘추문학 대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통해 시조시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의 이력은 전통과 교육,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지점이며, 시조라는 장르를 선택한 작가적 선택이 단순한 형식적 실험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 탐구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물새 발자국』은 단순한 데뷔 시집 그 이상이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꺼낸 한 시인의 내면의 언어이며, 시조라는 형식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존재의 흔적들이다. 시인이 시를 통해 걸어간 자리는 물새의 발자국처럼 연약하고 희미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시적 사유와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시조라는 장르가 낡고 고루하다는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시집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문학적 설득력을 지닌다.
“형식 안에서 자유를 구현하고, 언어를 통해 침묵을 말하는” 구연백 시인의 시조집 『물새 발자국』은 독자에게 묵직한 감동과 긴 여운을 남긴다. 시조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이 책은, 시조문학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증명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