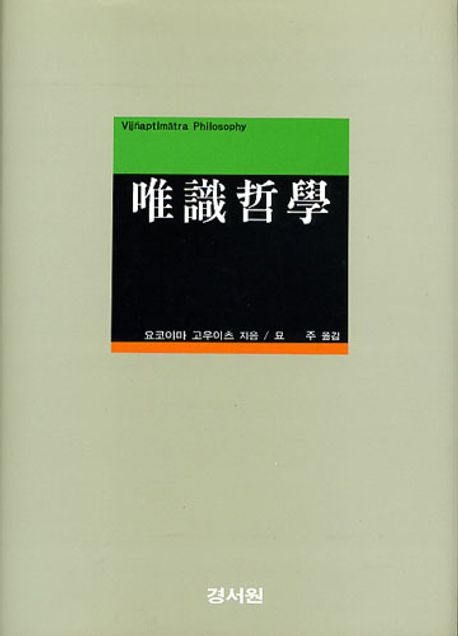주심부와 유식 (불교 공부의 지름길, 유식 법문 이야기)
황정원 | 산지니
25,200원 | 20230927 | 9791168611740
보리(菩提)에 이르는 지름길,
연수대사의 유식 법문을 정리하다
〈주심부〉의 저자인 연수대사는 북송 초기, 선교일치를 설명하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연수대사는 법안종의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교(敎)와 조사(祖師)의 선(禪)이 같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는 점에서, 참 불자의 진면목을 보였다. 그가 영명사 경내에 교종(敎宗)의 각 종파에서 논사들을 불러 모아 동거동식하면서, 수많은 불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각파의 견해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선교일치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편찬된 것이 〈종경록〉 100권이다.
그가 만년에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 〈주심부〉 4권은, 일심(一心)을 7,500자로 노래한 〈심부〉에다 자신이 직접 주석(註釋)을 자세하게 붙인 독특한 저술이다. 내용을 보면 〈종경록〉의 100권을 종횡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심부〉에도 유식(唯識)법문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대사가 유식의 중요성을 시종일관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blockquote〉“만약 결정코, 이 유식(唯識)의 정리(正理)를 믿고 들어가면, 신속하게 보리(菩提)에 이른다”고 한 해설이 〈종경록〉에도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유식학(唯識學)을 불교공부의 지름길이라고 적극 권장한 태도를 알 수가 있다._본문에서
〈/blockquote〉
주역의 대가 야청 황정원은 이번 책에서 영명 연수대사의 〈주심부〉에 나오는 노래 중 유식에 관련된 것을 모아 초록하여, 유식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인도불교의 대미를 장식한 유식학을 만나다
유식학은 인도의 마지막 불교였다. 초기 불교 경전(經典)에는 시방삼세(十方三世)가 실유(實有)라는 사상에서 불법을 설명하는,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다가 불멸 후 600년경에 용수(龍樹)보살이 팔불(八不)을 주장하여 일체개공(一切皆空)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대승불교가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300년 후 무착, 세친의 형제가 가유(假有)인 법상을 설명하면서 만법유식(萬法唯識)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인도불교의 역사를 크게 구분하는 방식인데, 유식학이 인도불교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다.
이렇게 불교가 변화한 시대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대적 요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부파불교는 실유(實有)에 집착했기에 이에 대해 팔불중도(八不中道)라는 처방이 나왔고, 다시 악취공(惡取空)에 빠진 공(空)을 보완하고자 가유(假有)를 강조하는 유식학이 나타난 것이다.
〈blockquote〉일체(一切) 분별(分別)은 자심(自心)을 말미암는다. 일찍이 마음 밖에 다른 경계가 없어서 능히 마음과 더불어 반연(攀緣)된 바가 없다. 왜 그러한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깥 경계가 본래 공(空)하기 때문이다._본문에서
〈/blockquote〉
유식은 마음의 본체인 식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체도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땅에서 물이 나오고 나무가 불을 내는 것처럼 마음을 떠나서는 법(法)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고, 마음이 삿되면 법이 삿될 수밖에 없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두된 유식학은 불교의 심리설을 더욱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대승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유식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유식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래에 등장한 양자물리학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모든 입자는 확률적으로 파동으로 존재할 뿐이고, 관측될 경우에만 고정된 존재로 나타난다”는 양자물리학의 주장은 유식학의 유식무경(唯識無境)과 같은 이론이다. 양자물리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문이지만, 불교의 유식학은 인도에서 완결된 이론이다. 우리가 만약 불교의 유식학을 먼저 학습하면, 장차 양자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대사의 불교가 고려 광종 시절 국내에 도입되면서 왕가의 비호 아래 대승사가(大乘四家)는 우리 불교사의 중심을 차지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억불숭유정책으로 불교가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되면서 대승사가 중에서 유독 유식학이 번성하지 못했고 고려 이후에는 유식학 전문가를 찾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 유식학을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재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지금, 〈주심부〉의 유식법문을 모아 정리한 이 책은, 불자는 물론 불교철학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더하고 지혜를 향상시키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