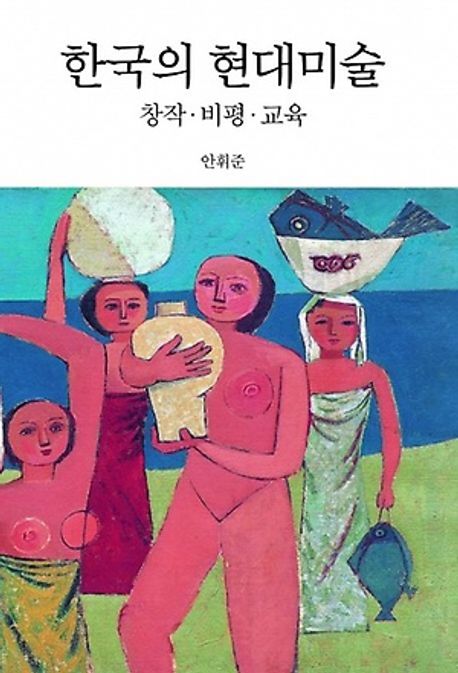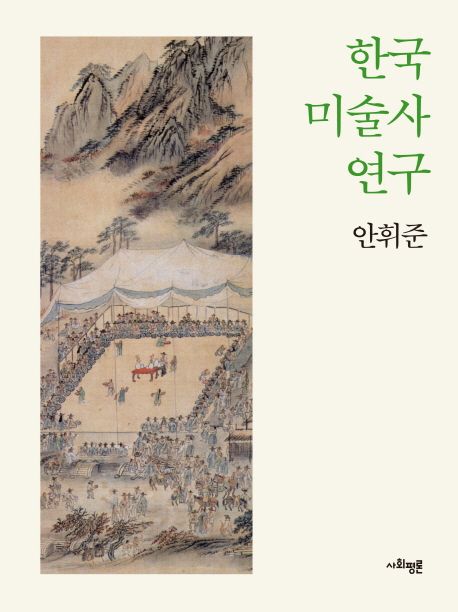나의 한국 미술사 연구
안휘준 | 사회평론아카데미
36,000원 | 20220715 | 9791167070678
미개척 분야였던 한국회화사를 규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미술사가(美術史家) 안휘준.
그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학계에 몸담고 연구, 저술, 후진 양성(교육), 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해온 다양한 일과 성과들을 집성, 정리한 글들을 모았다.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사학자로, 2003년 동아일보의 ‘프로들이 선정한 우리 분야 최고’에서 “문화재 관련 학계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 중 회화사 분야 최고 권위자로 선정되었다.
젊은 시절 인류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안휘준 교수는 초대 국립박물관 관장을 지낸 김재원 박사와 김원용 교수의 권유로 당시 대표적 미개척 분야였던 한국회화사 연구의 절실함이 연구의 계기였다고 말한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미술사 연구를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그곳에서 체계적인 미술사 방법론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미술사적 지식을 쌓았고, 귀국 후 지금까지 한국 미술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학문적 체계를 세우고 정립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안휘준 교수의 『한국회화사』와 고 김원용 선생과 공동 집필한 『한국미술의 역사』는 현재까지도 한국 미술사를 공부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필독서로 손꼽힌다.
안휘준 교수는 한국 미술사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의 제자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한정희 홍익대 명예교수, 홍선표 이화여대 교수, 이태호 명지대 교수, 최성은 덕성여대 명예교수, 장진성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미술사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는 중진 및 소장 교수들로 그가 홍익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길러낸 제자들이다.
한국미술사 연구와 함께한 반세기
『나의 한국 미술사 연구』의 출간에 대해 저자인 안휘준 교수는 크게 두 가지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첫째는 저자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학계에 몸담고 연구, 저술, 후진 양성(교육), 사회봉사 등의 분야들에서 해온 다양한 일들과 성과들을 집성, 정리한 점이다.
이 네 가지 영역들에서 저자가 종횡으로 기여했던 행적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1장 「미술사학과 나」라는 글에서 연대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었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과 가슴 아팠던 사례도 실명만 빼고 숨김이나 가감 없이 적어놓았다.
저자는 한국미술사 전반에 대한 연구, 저술, 강의와 강연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게 행하면서도, 일종의 미개척 분야였던 한국회화사를 규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1장의 글들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제3장에는 그동안 저자가 펴낸 책들의 서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서문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미술사와 회화사의 연구와 저술을 이해하는 데 나름대로 참고가 될 것이다.
“만들어진 미술사가”
제4장에는 이 책이 저자에게 지닌 특별한 이유 두 번째를 밝혀줄 글들이 모아져 있다. 군복무 후 복학하여 고고학이나 인류학을 전공할까 준비 중이던 제대군인을 설득하여 미술사로 전공을 바꾸게 하고 미국 유학까지 주선해준 초대 국립박물관장 여당(藜堂) 김재원(金載元, 1909~1990) 박사와 학부 시절 내내 지도해주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자리를 잡고 미술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준 삼불(三佛) 김원용(金元龍, 1922~1993) 교수, 두 은사들에 관한 글이다. 저자는 이 두 분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사가”에 불과하다고 늘 이야기한다. 저자의 연구, 저술, 교육, 사회봉사에서 혹 이루거나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두 은사들의 공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논문 2편(제5장), 서평과 발간사 등 책에 관한 글들 35편(제6장), 수필과 논설 20편(제7장)이 실려 있어서 기왕에 나온 저자의 다른 책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논문 2편을 비롯하여 모든 글들이 신문과 잡지를 제외하고는 이 책에 처음으로 게재된 것들이어서 나름의 의미와 참고의 편의성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말미에는 저자의 「저작 목록」이 실려 있다. 수백 편의 글들을 저서, 논문, 학술 단문으로 대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국문, 일문, 중문, 영문, 독문 등 언어별로 세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