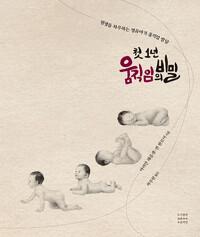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97305025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13-05-30
책 소개
목차
제1부 탈북자의 이동과 경험
1장 탈북자의 정착 과정과 경험: 사회구성론적 접근
2장 탈북자가 경험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3장 ‘장소’로서의 북.중 경계지역과 탈북여성의 ‘젠더’화된 장소 감각
제2부 스크린 위의 탈북자, 스크린 밖의 탈북자
4장 탈북의 영화적 표상과 아시아라는 공간
5장 탈북자의 자기 서사와 정체성
6장 자기 관객으로서의 탈북자
책속에서
“탈북자의 이동은 단순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주뿐만이 아니라 냉전체제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이주이면서, 민족 내의 이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좇아 움직이는 경제적 이주의 성격까지 띤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불법적 상황과 탈북자에 대한 처벌로 인해 야기된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들을 난민적 이주로 봐야 한다는 시각까지 교차시키기도 한다. 그 만큼 탈북자의 이동이 특수한 로컬적 상황의 결과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 층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초국적 경험의 다층성과 이들의 이동의 과정을 관통하는 문화지리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어떤 종류의 이주자보다도 이주의 동기와 과정에서 초국적 경험들을 축척하였고, 이는 북, 중 경계지역부터 동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기나긴 이동 경로에서 초국적 민족 공간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월경의 이유와 경험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귀순자나 월남자의 남한 중심적인 폐쇄된 서사를 반복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탈북자의 이질성과 혼종성을 승인할 사회적 문화와 담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탈북자들의 의미를 정치적인 맥락으로 제한하는 오래된 국가담론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반면 그를 대체할 열린 담론이 부재한 지금의 상황에서, 탈북자가 자신의 준거로 삼을 모델의 영역은 매우 협소하다. 이런 영역이 풍부하게 형성되지 않는 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개인적 경험이 자기서사로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큰글자도서]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img_thumb2/97889364869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