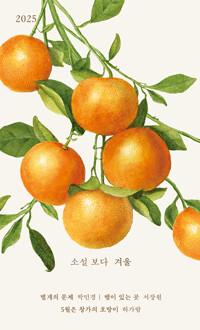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문학의 이해 > 시론
· ISBN : 9788968172366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15-06-2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v
∥백석∥
백석 시의 시간 어휘 3
- 및게, 따디기, 나줏손, 낫대
백석 시의 고어 및 공간 어휘 13
- 산멍에, 산녑, 은댕이, 예데가리밭
백석 시의 전통 어휘 22
- 골갯논드렁, 청눙
고어를 이용한 백석 시의 어휘 몇 가지에 대한 검토 28
북한의 문화어를 중심으로 한 백석 시의 어휘 몇 가지에 대한 검토 57
∥김소월∥
소월 시어의 중의성 87
- 스러지다
왜곡된 소월의 시어 95
- 한긋
소월 시에 등장하는 ‘빗기다’의 의미 연구 99
∥정지용∥
지용 시의 동음이의어 115
- 닥다, 옴짓 아니 긔다, 한양
지용 시의 고어 124
- 삐우다, 니치대다, 키이다
∥김영랑∥
영랑 시의 형용사 133
- 애끈하다, 애닯다
왜곡된 영랑의 시어 141
- 기혀, 호동글, 송긔한
영랑 시의 고어 150
- 그리매, 예사, 달는다
영랑의 시어 ‘사개틀닌’에 대하여 161
영랑의 시어 ‘제우다’에 대하여 177
∥이육사∥
육사 시의 띄어쓰기 문제 201
- 마을 이 한구죽죽한
육사 시의 원전 문제 212
- 못이즐 게집애 집조차 업다기에
육사 시의 인명 222
- 공명이 마다곤들
육사 시의 방언 232
- 가루어서
∥한용운∥
만해 시의 방언 1 245
- 목마치다
만해 시의 방언 2 255
- 싯분우슴
만해 시어의 구조 271
- 사릿드리고
∥김억∥
안서 시의 표기 283
- 읽어지다
안서 시어의 시대성 1 294
- 맘하다
안서 시어의 시대성 2 304
- 바이없다
안서와 소월의 시어 비교 312
- 빗기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의 출처 321
저자소개
책속에서
백석 시의 시간 어휘
및게, 따디기, 나줏손, 낫대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들은 환경이 곧 삶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공간적인 환경은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여행을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시간적인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체험을 하게 된다.
아침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의 시작을 선포하고 밤은 안식과 평안을 선물한다. 나이를 먹으려면 정지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좋든 싫든 모든 사람이 몸과 영혼을 시간의 흐름에 내어 맡겨야 한다.
새삼스레 시간의 위대함에 머리를 숙이며 백석의 시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시어의 어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오리야 네가좋은 淸明및게밤은
옆에서 누가 뺨을처도모르게 어둡다누나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가되여 어둡단다
-「오리」 부분
위의 시는 1936년 <조광>에 발표된 「오리」라는 시의 일부이다. 이 시에서 백석은 ‘淸明및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및게’를 예전에 ‘몇 개’로 풀이한 해석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위의 시에서 ‘밤’은 열매 ‘밤’[栗]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가진 ‘밤’[夜]이기 때문에 ‘몇 개’라는 수량 표현과 어울릴 수 없다. ‘淸明’이 이십사절기 중의 하나인 ‘청명절(淸明節)’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의 ‘밤’은 확실히 시간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청명절’은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의 절기로서 음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 하면 4월 5일 무렵에 해당한다. 대개 이 무렵에 밭갈이를 시작하는데, ‘청명(淸明)’이라는 말 그대로 이날 날씨가 화창하면 그해 농사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다. 4월이면 일몰 시간이 빠른 편인데, 백석의 고향인 평북 정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및게’를 ‘무렵’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그렇다면 ‘및게’가 어떻게 ‘무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흔히 명절을 앞두고 경기(景氣)가 가장 활발한 시기를 ‘대목’이라고 한다. ‘추석 대목, 설 대목’과 같은 표현이 낯설지 않다. 그런데 원래 ‘대목’은 ‘어느 특정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다.’, ‘결정적인 대목에서 실수를 했다.’와 같은 문장에서 ‘대목’의 일반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추석 대목, 설 대목’도 원래는 ‘추석 무렵, 설 무렵’ 정도로 어느 특정한 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명절 무렵에 워낙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 이 무렵에 ‘한몫’ 단단히 챙긴다 해서 ‘대목’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듯하다. 그러나 ‘대목’은 ‘대목’일 뿐 ‘大몫’이 아니다. ‘대목’은 시간적으로는 어느 시기를 즈음한 기간을 뜻하고 공간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부분을 뜻할 뿐이다.
그런데 평안도에서는 시간적인 의미를 갖는 이 ‘대목’을 ‘밑’이라고 한다. ‘명절 무렵’은 ‘멩질 밑’, ‘추석 무렵’은 ‘추석 밑’이라고 하는 식이다.
백석은 ‘밭, 머리맡, 밑’ 등 종성에 ‘ㅌ’을 가진 단어들을 대개 현행 맞춤법과 같이 받침 ‘ㅌ’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유독 ‘볕’은 ‘볓’(「初冬日」, 「夏沓」, 「국수」 등)으로 적고 있어, 같은 종성 ‘ㅌ’이라 하더라도 단어에 따라 받침 표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淸明및게’의 ‘및’은 ‘밑’의 종성을 ‘ㅊ’으로 적은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淸明및’의 ‘및’이 평북 방언인 ‘멩질 밑’, ‘추석 밑’의 ‘밑’과 쓰임이 같기 때문이다. 백석은 ‘아래’의 의미를 가진 ‘밑’과 ‘무렵’의 의미를 가진 ‘밑’을 ‘밑’과 ‘및’으로 구별하여 적었던 것이다.
보통 섣달그믐께를 ‘세밑’ 또는 ‘설밑’이라 하는데, 이 ‘밑’은 평안 방언의 ‘밑’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세밑’(歲-)만 보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밑’이 ‘아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설밑’을 보면 이때의 ‘밑’이 ‘아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세밑’과 ‘설밑’의 ‘밑’은 평안 방언과 마찬가지로 ‘대목, 무렵’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淸明및게’에서 ‘및’은 ‘대목, 무렵’을 뜻한다. 그렇다면 ‘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때의 ‘게’는 접미사 ‘-께’에 해당한다. 접미사 ‘-께’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면 ‘무렵’이나 ‘쯤’의 의미를,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면 ‘근처’나 ‘쯤’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이달 말께, 보름께’는 ‘이달 말쯤, 보름쯤’ 또는 ‘이달 말 무렵, 보름 무렵’을 뜻하고, ‘어디께, 서울역께’는 ‘어디쯤, 서울역 근처’를 뜻한다.
따라서 ‘淸明및게’의 정확한 해석은 ‘淸明 무렵께’가 된다. 백석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의 밤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따디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백석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따디기’라는 시어가 두 번 등장한다.
오리야 네가좋은 淸明및게밤은
옆에서 누가 뺨을처도모르게 어둡다누나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가되여 어둡단다
-「오리」 부분
밖은 봄철날 따디기의 누굿하니 푹석한 밤이다
거리에는 사람두 많이나서 흥성 흥성 할것이다
어쩐지 이사람들과 친하니 싸단니고 싶은 밤이다
-「내가생각하는것은」 부분
위의 시에 나오는 ‘따디기’는 ‘따지기’를 말한다. ‘따지기’는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하는 초봄 무렵’을 의미하는 말로서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낯설게 여겨지지만, 다음과 같이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지기’와 ‘따지기때’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지기: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하는 초봄 무렵. <<표준국어대사전>>
따지기때: 초봄에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하는 때. ¶ 땅이 서너 자씩이나 어는 바람에 매년 따지기때보다 호락질로 두어 배미 좋이 덮었던 객토마저도 이번에는 경칩이 지나도록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이문구, <산 너머 남촌>>, <<표준국어대사전>>
따지기: 이른봄에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또는 그 무렵≫을 이르는 말. ¶ 따지기가 시작되자 냉이들이 파릇파릇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조선말대사전>>
따지기때: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는 이른 봄철. ¶ 만물이 소생하는 ~. <<조선말대사전>>
이 단어가 사전에 등재된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과 게일이 편찬한 <한영자전>(韓英字典, 1897)에 이미 ‘따지기’로 표기되어 수록된 바 있으며, 해방 후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큰사전>에는 ‘따지기’와 ‘따지기때’가 표제어로 수록되었다. 이 단어가 19세기 말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편찬한 대역(對譯) 사전에 표제어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단어가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백석이 사용한 시어 ‘따디기’를 사전 표제어 ‘따지기’와 비교해 보면 둘째 음절의 초성이 ‘ㄷ’과 ‘ㅈ’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평안 방언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평안 방언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중세국어의 ‘둏다[됴타], 뎜심, 뎔’ 등이 현대에 와서는 구개음화 현상의 적용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는 ‘좋다[조타], 점심, 절’ 등으로 발음되고 있지만, 평안 방언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대신 /j/가 탈락하여 ‘돟다[도타], 덤심, 덜’ 등으로 쓰이고 있다.
백석의 다른 시에서도 ‘딜옹배기’<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와 같이 구개음화 현상의 적용을 받지 않은 어휘들이 나오는데, 역시 평안 방언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백석의 시어 ‘따디기’와 사전에 등재된 ‘따지기’는 발음과 표기상 방언적인 차이만 있을 뿐 별개의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안 방언이 구개음화 적용 전의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따지기’ 및 ‘따지기’의 원형은 ‘따디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따디기’에서 ‘따’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자문을 공부할 때 ‘地’를 ‘땅 지’보다는 ‘따 지’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땅’의 옛말이 ‘따’였기 때문이다. ‘따디기’의 ‘따’는 ‘땅’의 옛말인 ‘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불자전>(1880)과 <한영자전>(1897)에서 ‘따’로 표기된 것은 이러한 맥락을 잘 반영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따’가 아닌 ‘따ㅎ’이다. ‘따ㅎ’은 ㅎ곡용어로서, 단독형일 때는 ‘ㅎ’이 발음 및 표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말과 결합할 때는 ‘ㅎ’의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는 이러한 ㅎ곡용이라는 기제가 문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단어에서 화석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안팎(안 + 밖), 암탉(암 + 닭), 수캐(수 + 개)’ 등에서 유기음 ‘ㅍ, ㅌ, ㅋ’이 실현되는 것은 과거에 ‘안ㅎ, 암ㅎ, 수ㅎ’이 ㅎ곡용어로서 합성 과정에서 ‘ㅎ’이 나타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디기’는 무엇일까? ‘디기’는 ‘디-’와 ‘-기’로 나누어진다. ‘-기’는 ‘줄넘기, 내기’에서 보듯이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선행 용언을 명사로 만들어 주는 명사파생접미사에 해당한다. ‘디-’는 어간으로서 지금의 ‘지-’에 해당하는데, 여러 의미 중에서 ‘떨어지다, 없어지다, 약해지다’ 정도의 의미에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겨울철에는 땅속의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흙의 입자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이 입자들이 위로 뜨는 서릿발 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철에 보리밟기를 하는 것은 이 틈을 줄여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보리가 토양에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는 것이다.
봄이 되면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흙 사이의 틈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솟아올랐던 흙들이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부드럽게 풀어지는데, ‘디다’(지다)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디기’는 원래 땅이 풀어지는 현상 자체를 의미했을 테지만, 이러한 현상이 봄철에만 일어나다 보니 ‘봄철’이라는 특정한 때를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용된 듯하다 ‘따지기’를 한자어로는 ‘해토(解土)’라고 한다. 그리고 얼었던 땅이 녹아 풀리기 시작하는 때를 ‘해토머리’라고 한다. <한불자전>(1880)과 <한영자전>(1897)에서 모두 ‘따지기’와 같은 말로 ‘解土’를 제시하였고 <한영자전>(1897)에서는 ‘따토머리’를 아울러 다루었다. 한편 <한불자전>(1880)에서는 ‘따지기’의 동사형으로 ‘따지다’를 제시하였다.
.
다음으로 시간과 관련하여 ‘나줏손’이라는 시어를 살펴보자. 다음은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이렇게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 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꿀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 부분
‘나줏손’은 기존의 해석에서 이미 ‘저녁 무렵’으로 일치를 보이고 있다. 평안 방언에서 ‘나주’가 ‘저녁’을 의미하므로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보다 정밀하게 ‘나좃손’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나줏손’은 일단 ‘나주’와 ‘손’으로 나뉜다. ‘ㅅ’은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시옷이다. 평안 방언인 ‘나주’는 옛말 ‘나조ㅎ’에서 왔다. 옛말 ‘나조ㅎ’은 ‘저녁’을 뜻하며, 홀로 쓰일 때는 ‘나조’로 실현되고 뒤에 다른 말이 붙을 때는 ‘ㅎ’이 살아나는 ㅎ곡용어이다.
‘손’은 옛말에서는 용례를 찾을 수 없으나, 평안 방언에서 ‘기회’나 ‘시기’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평안 방언에서 손을 놓치지 말라고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 ‘손’은 ‘때’[時]를 뜻한다.
평안 방언에 ‘저녁’에 해당하는 ‘저낙’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저녁때’를 별도로 ‘나주켄, 나주켠’ 또는 ‘나준녘’이라고도 하는데, ‘나줏손’이 이러한 표현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옛말과 방언의 표현을 참고할 때 ‘나주’와 ‘손’의 의미를 각각 파악할 수 있고 이것들을 종합하여 ‘나줏손’은 ‘저녁때’ 정도로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낫대’를 살펴보자. 이 시어는 ‘統營’이라는 시에 나온다.
統營장 낫대들엇다
갓한닙쓰고 건시한접사고 흥공단단기한감끈코
술한병바더들고
화룬선 만저보려 선창갓다
오다 가수내 들어가는 주막압헤
문둥이 품마타령 듯다가
열닐헤달이 올라서
나루배타고 판데목 지나간다 간다
-「統營」 전문
백석의 시 중 「統營」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몇 있는데, 위의 시는 1936년 3월 조선일보에 연달아 발표한 「南行詩抄」 중 두 번째 시에 해당한다. 기존의 해석에서는 대개 ‘낫대들다’를 ‘대들다’와 유사한 의미로 보았다. ‘낫대들다’를 ‘낫다’와 ‘대들다’의 합성어로 보아 1행의 의미를 ‘장이 열리자마자 나아가 대들듯이 구경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옛말인 ‘낫ㄷㆍㄷ다’(현대어 ‘내닫다’의 의미)와 ‘들다’가 합성된 것으로 보아 ‘내달아 들어갔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것은 의미상으로 가능한 해석이지만, 표현이 좀 거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백화점처럼 일부 품목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한정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통영장에 그렇게 거칠게 대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통영장에 대한 시인의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시적으로 극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낫대들다’라는 표현을 옛말이나 방언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좀 걸린다. ‘낫다’는 옛말에서 ‘나아가다’[進]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어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을 막론하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낫달다’도 옛말에서 ‘내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낫달다’와 ‘들다’의 합성어가 ‘낫대들다’가 되기에는 형태의 변화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낫대들다’를 ‘낫대’와 ‘들다’로 나누고 ‘낫대’를 ‘낮때’로 볼 가능성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사실 백석의 시에서 ‘낮’을 ‘낫’으로 적은 경우는 없다. 그러나 「南行詩抄」 네 수를 보면 유독 받침으로 ‘ㅅ’을 즐겨 사용한 흔적이 눈에 띈다. ‘듣다가’를 ‘듯다가’로, ‘귀밑이’를 ‘귀밋이’로, ‘볕이’를 ‘볏이’로, 심지어는 ‘숨었다, 갔다, 퓌였구나’의 받침 ‘ㅆ’을 모두 ‘숨엇다, 갓다, 퓌엿구나’와 같이 ‘ㅅ’으로 표기하였다.
시 전체를 읽어 보면 장에 갔다가 선창 갔다가 주막에 들르는 과정에서 열이렛날 달이 떠오른다. 물론 시인이 이른 아침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터를 누비고 다녔을지도 모르지만, 낮에 장에 갔다가 저녁에 나룻배를 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낮때’라는 의미로 ‘낫대’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본다면 ‘統營장 낫대들엇다’는 ‘통영장에 내달아 들어갔다’라기보다는 ‘통영장에 낮에 들어갔다’라고 해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