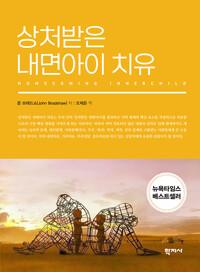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언어학
· ISBN : 9788968174254
· 쪽수 : 510쪽
· 출판일 : 2016-11-25
책 소개
목차
제1장 언어학에서의 의미론의 위상
1.1. 언어학의 패러독스
1.2. 통사론적 의미론
1.3. 의미론의 고유적 난삽성
1.4. 의미 이론의 난립성
제2장 의미론 발달의 역사
2.1. 세 가지 특징
2.2. 제1기: 인문주의 시대
2.3. 제2기: 과학주의 시대
2.4. 제3기: 후기 과학주의 시대
제3장 어휘 의미론의 양상
3.1. 어휘적 의미의 특성
3.2. 생성 어휘론
3.3. 자연의미적 메타 언어론
3.4. 복합어와 관용구
제4장 문장 의미론의 양상
4.1. 위상과 기여
4.2. 몬태규 문법
4.3. 통사론과의 관계
4.4. 화용론과의 관계
제5장 담화 의미론의 양상
5.1. 당위성과 실상 간의 괴리
5.2. Sueren의 담화 의미론
5.3. 담화적 대용어
5.4. 담화 해부와 담화 처리
제6장 과제와 전망
6.1. 의미론 발달의 이중적 양면성
6.2. 과제
6.3. 전망
■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1장
언어학에서의 의미론의 위상
1.1. 언어학의 패러독스
20세기 초에 과학적 인문학의 시범학문으로 등장한 언어학은 한 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전진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향도적 학문으로 성장했다. 이 세기가「언어학적 전향의 시대」로 불리게 될 만큼 이 학문이 그동안에 다른 학문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언어학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데 주역의 역할을 한 사람은 변형주의이론의 창시자인 Chomsky였고, 그 전에 그의 언어이론의 전신에 해당하는 구조주의 이론을 창안한 사람은 Saussure였다.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에 Saussure가 일으킨 현대 언어학의 학세는「촘스키의 혁명」의 바람으로 바뀌어서 그것은 드디어 인문학 전체를 뒤덮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의 이런 눈부신 발전 뒤에는 작게는 이 언어학 자체의 아픈「아킬레스건」이고, 크게는 지난 2천 수백 년에 걸친 언어연구 전체의 아픈「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었다. 의미론이 바로 그 아픈 아킬레스건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내내 언어연구는 형식과 의미의 융합체라는 자명한 진리를 망각한 채 그 실체를 밝히는 방책으로서 두 요소 중 오직 한 가지, 즉 형식만을 구명하는 방법을 택해왔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물론 언어는 결국에 의사소통이나 의미전달의 한 도구거나 아니면 형식은 의미표현의 한 수단이라는 또 하나의 상식적인 진리와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는 일찍이 Saussure가 과학적 언어연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나섰을 때는 물론이고, 그 후 Chomsky가 문법구조에 대한 기술적 적절성보다는 그것에 대한 설명적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을 언어연구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을 때도 이들의 안중에는 이미 의미의 문제는 없었다. 이들이라고 해서 형식이 곧 언어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기에 의미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Saussure는 기호이론을 내세워서 의미는 과학적 언어연구의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고, 또한 Chomsky는 통사론에서는 문장의 의미성이 아니라 구조적 정형성을 밝히게 되어있다고 말하면서「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무색의 녹색 상념들이 사납게 자다.)」와 같이 아리송한 예문을 논쟁거리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자면 이들은 적어도 속내로는 자기네들의 언어연구가 기껏해야 언어의 실체를 구성하는 두 부분 중 어느 한쪽만을 연구하는, 일종의 반쪽짜리 연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진짜 지혜로움은 의미의 문제는 아직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이 문제는 결국에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언어연구의 과학화 작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훼방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들의 학문적 대성공은 연구 과제와 대상 중 오직 절반만을 택하면서 나머지를 완전히 버리는 지혜로부터 비롯된 셈이었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의 이런 태생적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업적의 빛이 밝아짐에 비례해서 그것의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언어학의 발달이 사상 초유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것의 패러독스는 바로 의미론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 것인데, 그 이유는 형식에 대한 연구가 앞서가면 앞서 갈수록 의미에 대한 연구의 후진성은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견해와는 정반대로 그동안의 형식에 대한 연구의 놀라운 진전은 자연히 의미에 대한 연구의 촉진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최근에 아무리 의미론에 대한 연구의 양과 질이 그전과 달라졌다고 해도 형식론 내지는 통사론과 의미론 사이의 원래의 간격이 별로 좁아지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는 의미론적 연구의 속도를 그 수준이 형식론의 그것과 맞먹을 수 있을 만큼 높아질 때까지 가속화하는 것이 언어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의 현상은 더 악화되면 되었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언어학의 현실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바라는 것처럼 두 연구 간에 균형이나 조화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에 점점 차별성이나 대조성만이 더 두드러져가는 현상, 즉 형식론의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질수록 의미론의 그것은 점점 더 뒤처지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언어연구는 하나의 통합적 이론이나 모형의 창출을 지향하는 양태 대신에, 형식론적 연구와 의미론적 연구가 평행선을 그어가는 양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언어의 실체는 하나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중의 어느 한 면이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무리 진전되었다 해도 그것에는 으레 그래서는 결코 언어의 실체는 밝혀질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성이 주어져 있게 마련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론보다는 의미론이 더 본질적일 수 있다는 언어학의 속성을 무시한 채,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형식론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언어학자들 스스로가 자기네 학문의 모습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의 현상과 관련하여 또 한자기 유념할 사실은 학문도 일종의 현실이지 당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 언어학의 발전이 Saussure나 Chomsky와 같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그전까지의 그것도 그때그때의 선각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학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학리적 당위성에 맞추어서 미리 정해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들의 산발적 노력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라고 해서 이런 발전의 기본 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리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과거처럼 앞으로도 형식론의 학세가 의미론의 그것을 억누른 상태에서 언어학 전체를 이끌어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
1) 난삽성
이상과 같이 의미론의 장래를 자못 비관적으로 내다볼 수밖에 없는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울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것은 이것의 난삽성이다. 의미론이 난해한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일반적인 지식의 크기는 언어지식의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물론 일찍이 Saussure는 언어특징에 관한 한 그것의 형식에는 정교한 구조성이 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 후 Chomsky는 문법은 곧 유한한 규칙으로 무한한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구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언어의 형식적 탁월성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이들은 하나같이 언어의 형식적 탁월성은 오직 익히 검증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위대함은 언어의 형식은 아무리 오묘할 정도로 정교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과학적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반하여, 그것의 의미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파지한 데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지혜롭게도 의미의 문제는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난삽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언어연구의 영역에서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학문적 대성은 바로 이들의 이런「정확한」 의미관에 위에서 이룩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들의 판단이 결국에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앞에서 제시된 Chomsky의 예문을 분석해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가 이 예문을 제시한 것은 문법기구의 첫 번째 특성은 그것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자리였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는 이 예문은 문법적인데 반하여,「Furiously sleep ideas green ideas.」는 그렇지 못한 사실로 미루어서 1)문법적 문장은 관찰된 문장이 아니라는 것과, 2)문법적이라는 말은 유의적이라는 말과 같지 않다는 것, 3)문법적이라는 말은 통계적 근사성이 높은 것이라는 말과 같지 않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Chomsky, 1962, pp.15~16)
그가 여기에서 대조시키고 있는 정문과 비문 사이에는 분명히 어순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그는 그러니까 설사 의미적 해석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장은 얼마든지 정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적인 예문을 만들어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두 문장들은「똑같이 무의미한」 문장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론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연 그의 주장대로 이 예문을 하나의 무의미문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할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문을 하나의 유의적인 문장으로 볼 수도 있는 데, 그 이유는 문법적 일탈성이나 하자성은 단순 논리로 파악이 될 수 있는데 반하여 의미적 애매성이나 모순성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하나의 무의미문으로 치부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모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의도적으로 무려 이 짧은 문장의 세 군데에서나 의미적 모순관계가 있도록 한 것인데, 그중 첫 번째 것은「Colorless green」이라는 수식부이고, 그중 두 번째 것은「ideas sleep」라는 주술부이며 그중 세 번째 것은「sleep furiously」라는 술어부이다. 그러나 경우와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들 세 표현들을 의미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통사론과 의미론의 근본적 차이점은 바로 이런 점인 것이다.
예컨대 이런 확대된 의미론적 해석법을 이 예문에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무의미문이 아니라 하나의 유의미문이라는 사실이 당장 드러난다. 먼저「Colorless green」이라는 수식부의 문제성을 분석해보자면, 그것은 먼저「Colorless」의 의미를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무색의」가 아니라「색이 흐릿한」으로 잡은 다음에「green」의 의미를「녹색의」가 아니라「싱싱한」이나「친환경적인」으로 잡으면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ideas sleep」라는 주술부의 문제성으로 넘어가보자면, 그것은 일상적 언어에서「weeping willow(수양버들)」이나「Fortune smiles on us.(행운이 우리에게 웃음 짓는다.)」와 같은 의인법적 표현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로써 익히 해결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sleep furiously」라는 술어부의 문제성을 분석해보자면「furiously」라는 부사의 의미를「사납게」 대신에「맹렬히」나「깊게」로 잡으면 익히 해결이 된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마지막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는 비상식적인 억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시인 같은 사람은 시에서 이런 예외적인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다. 그러니까 Chomsky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것의 의미를「흐릿한 녹색의 상념들이 깊게 잠자고 있다.」 정도로 잡으면 이 문장을 굳이 무의미문으로 볼 필요가 없어진다.
통사론자답게 그의 주된 관심은 원래부터 문장의 문법성이나 정형성을 구명하는 데 있었지, 그것의 의미성을 밝히는 데 있지는 않았는데, 그것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만한 사실이 바로 그는 언어지식을 이 세상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는 언어 지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그것의 보편성과 내재성을 들면서 그 점을 밝히는 것을 그가 언어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와 같은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밝히는 일은 통사론과 대치적인 위치에 있는 의미론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언어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2002년에 낸「자연과 언어에 대하여(On Nature and Language)」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통해서 익히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그는 비동일지시의 원리는 일종의 보편적 지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He said that John was happy.]」는 비문인데 반하여,「John said that [he was happy.]」와「The people who saw [him playing with his children] said that John was happy.」는 정문이라는 사실을 내세웠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차이는 우리의 일반적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앞의 비문의 경우, He와 John이 서로 다른 사람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Chomsky, 2002, p.7)
또한 그는 의문사 의문문의 보편성과 언어 간 차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겉으로 보아서는 중국어의「Ni xihuan shei?(You love who?)」는 영어의「Who did you meet─?」와 크게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차이는 의문사 이동을 명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암묵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느 언어에서나 의문사는 으레 높은 통사적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는 보편적 원리는 지켜지게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설명은 영어에서와는 다르게 중국어에서는 의문사가 논리형식이 사고체계와 인터페이스 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동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의문사 변형과 관련하여 그는「*[How do you wonder who solved the problem─?]」의 경우처럼, 의문부사는 삽입절에 부가시킬 수 없다는 원리도 일종의 보편적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았다.(Ibid, p.18)
언어지식을 일반적 지식과 구별하는 그의 언어이론과 연관해서 또 한가지 유념할 것은 그는 언어지식을「우리 종의 생물학적 재능의 일분인 인지적 능력」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여기에서「이런 능력은 인간의 두뇌에 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연과학의 안내도내에서 익히 연구가 가능하다.」와 같은 말도 하였다. 결국 이런 견해는「언어=정신=두뇌」로 표현될 수 있는 그의 생물언어학적 언어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는 과학화라는 미명하에서 언어의 기능이나 의미의 문제 등을 언어연구의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언어를 자연적 대상으로 본 점은 Saussure가 일찍이 그것을 사회적 대상으로 보았던 것과는 크게 대비가 된다.(Ibid, preface)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바로 언어지식이 우리의 인지적 능력의 일부라는 점만을 내세웠지,(일부라는 의미를 부정관사인「a」로써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인지적 능력 가운데는 그 밖에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인간의 지적 활동이나 능력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 이상, 내재적인 인지능력이 아무리 크고 중요하다고 한들, 그것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일반적인 지식과 합쳐져서 작동하게 되어있다는 말은 했어야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는 마땅히 내재적 언어지식은 직관이나 본능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적용 절차가 단선적이면서 즉각적인 데 반하여, 학습된 일반지식은 인지적 필요성이나 의도성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선적이고 지연적이라는 말도 했어야 했다. 예컨대 그는「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라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시간도 걸리지 않지만 이것이 의미적으로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있는 말 정도는 했어야 했던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따지자면 일반적 지식의 적용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모적인 것은 우리의 머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의 크기가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지나 언어 심리학의 능력으로 일반 지식의 크기를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Aitchison이 일찍이 영국 대학생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를 최소한 5만으로 잡은 점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없다. 영어의 총 어휘수를 45만으로 잡고 보면, 그것의 1/9을 개인은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은 물론 개념적인 것 이외에 사실적인 것과 절차적인 것도 있다. 특히 우리는 논리력이나 연상력 등에 의해서 개별적 지식들을 상호 연결시켜서 더 큰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일반적 지식의 크기는 지력에 의한 개념적 지식의 확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응당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Aitchison, 1987, p.7)
무의미하고 무모한 일이어서인지 아직까지는 누구도 영어에서 쓰이는 문법적 규칙의 수를 계산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추산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최대한 1000개 이내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결과일 것이다. 이 숫자는 물론 5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Chomsky는 늘 유한한 규칙으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법력이 바로 언어적 창조력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근원은 극도로 제한된 언어지식, 즉 문법력이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일반적 지식력일 것이다.
의미론에서 다루는 것은 결국 이렇게 크고 복잡한 일반적 지식이라는 사실만큼 왜 그것이 지극히 난해한 영역일 수밖에 없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사실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난해한 영역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일반적 지식의 유동성을 들 수가 있다. 우선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문법성이나 정형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다분히 고정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렇지만 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절차를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지적 정보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심상을 유발시키면서 새로운 지적 정보로 산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미파악의 절차가 이렇게 유동적이고 개별인 것이라는 것은 곧 기존의 일반적 지식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의 산실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어휘나 문장이 은유적으로 쓰이고 있는 현상이다. 은유란 쉽게 말해서 기존의 어휘를 매개체로해서 새로운 지적정보를 창출해내는 장치이다. 예컨대「All nature smiled.」라는 은유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으레 그것은「만물이 모두 미소 지었다.」라는 자의적 의미 이외에「모두가 몹시 행복했다.」나「자연이 무척 아름다웠다.」와 같은 오직 은유적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의미, 즉 일종의 심리적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은유가 가장 편리한 시적 표현법 중 한 가지라는 것을 시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즐겨 쓰는 표현법 중의 한가지이다.
의미론을 난삽한 영역으로 만드는 세 번째 요인으로는 언어적 의미에는 적어도 어휘적인 것과 문장적인 것, 상황적인 것 등의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가 있다. 의미표현의 최소단위는 물론 어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의 기본단위는 문장이고, 그것은 으레 일정한 상황 속에서 담화의 일부로 쓰이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문장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구성어휘의 의미의 합산 이상의 것일 수가 있고, 상황적 의미는 문장적 의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의미론은 일찍부터 어휘 의미론과 문장 의미론, 화용 의미론 등으로 나뉜 까닭이다.
의미론을 난해한 영역으로 만드는 네 번째 요인으로는 어휘 의미의 추이 현상을 들 수가 있다. 발음이나 문법도 세월이 흐르면서 으레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의 폭이나 정도가 낱말의 의미의 변화의 그것만큼 심하지는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특징은 어휘 의미의 유동성의 특징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텐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선 언어연구의 통시성대 공시성의 구분을 놓고서의 부질없는 논쟁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어휘적 지식의 문법적 지식과의 차별성이 한층 더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휘적 지식이 문법적 지식처럼 다분히 고정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어휘의 의미가 송두리째 바뀌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런 특징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에 역사언어학적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미론적 연구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의미론에 관한 다른 연구보다 작게는 의미론이고 크게는 언어연구 전체의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의 가장 비근한 근거로는 Traugott의 말대로「과거에는 비체계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의미변화의 현상이 최근에는 특히 범언어적으로 중요한 체계성과 일방향성을 가진 현상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이것의 근거로 의미변화의 표준적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은유와 환유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은유와 환유적 절차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접근법은 아직까지는 의미론에 관한 다른 어느 연구에서도 쓰인 적이 없다.(Traugott, 2006, p.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