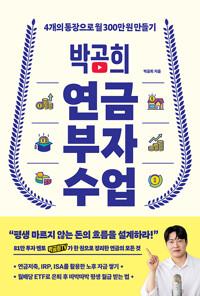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96430582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12-03-26
책 소개
목차
여는 글
프롤로그: 재벌과 모피아의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1부 한국경제 종단: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1장 신자유주의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경제 이데올로기
비틀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
중상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구자유주의 확립
2장 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두 행복해지는가 - 국민경제 성장과 위기
성장률이 왜곡하는 세상
성장과 위기 사이의 롤러코스터
금융위기 앞에 무력한 경제 이론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 산업별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
만병통치약일 수 없는 개방 정책
4장 기형적 양극화는 왜 계속되는가 - 기업구조
부실기업과 관치금융의 관계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재벌도 안전하지 못하다
2부 한국경제 횡단: 구조 분석과 개혁 방향
5장 성장의 엔진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한국에서만 가능한 삼성공화국
비난이 쏟아져도 재벌이 그대로인 이유
재벌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6장 동반성장은 허구인가 - 중소기업과의 상생 전략
반복되는 을사(乙死)조약
거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7장 시장 중심인가, 은행 중심인가 - 금융개혁
미국·독일과는 다른 한국식 금융
엄격하지만 유연하게 다뤄야 할 난제 ‘금산분리’
눈먼 돈처럼 떠도는 공적자금
8장 이중노동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가 - 노동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의 4대 함정
스웨덴·덴마크 모델이 주는 교훈
부록: 통계 원문 정보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1부(한국경제 종단)에서는 신자유주의(이념ideology) → 국민경제(거시macro) → 산업(중위meso) → 기업(미시micro) 순으로 추상 수준이 높은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감으로써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자 한다. 즉 한국경제에 부과된 경로의존성의 제약이 어떤 내용들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부(한국경제 횡단)에서는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주요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고, 개혁과제와 대안을 고민할 것이다. 물론 각 부문별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잘 설명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족함은 내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일부나마 메우려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부문별 개혁 프로그램의 상호보완성 문제에 특히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상충하는 개혁목표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웃기지 않은가? 흔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新자유주의의 과잉이라고들 진단하는데, 자칭 타칭 진보경제학자라는 김상조가 첫 번째로 제시한 과제가 구자유주의의 확립이라니 말이다. 웃기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렇다. 레토릭을 섞어 표현하면, 나는 ‘신자유주의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을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제시한다. 물론 구자유주의의 확립만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자유주의적 과제의 실천이 자신의 역사적 책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대비하여,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로 구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진보적이다. 나아가 소유권에 기초한 개혁의 성공 경험을 누적함으로써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진보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혁과 진보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건설업의 비중을 보면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심한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2장(국민경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을 무색게 하는 토건국가임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09년 국내산출액 기준 6.8%, 부가가치 기준 6.3%, 취업자 기준 7.3%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우 침체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거시경제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건설업에 대한 과잉의존 상태를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집권세력은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모르핀 주사를 포기해야 하고, 국민은 그로 인한 금단증세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