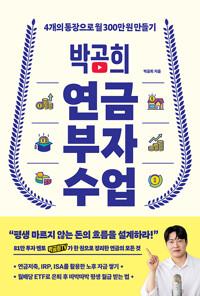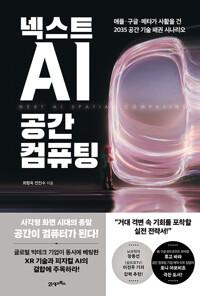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91172248581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5-09-19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저성장의 시대, 무엇을 다시 써야 하는가
part 1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 멈췄다
01 GDP는 오르는데, 체감경기는 왜 추락하는가
02 잠재성장률 1%대, 구조적 위기의 신호
03 중산층 붕괴와 소비위축의 악순환
04 성장률보다 낮은 생산성 증가율
05 혁신 없는 투자, 효율성의 한계
06 노동시간은 긴데 성과는 낮은 구조
07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 중소기업의 침식
08 분배 없는 성장의 끝
09 인구절벽이 불러온 수요의 위축
10 부채로 연명하는 경제의 민낯
PART 2 저성장의 뿌리, 어디에서 비롯됐나
01 산업구조 고착화와 신성장동력 부재 063
02 규제의 덫에 갇힌 창업과 혁신 068
03 교육과 인재정책의 미스매치 073
04 금융의 생산적 자금 배분 실패 077
05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081
06 부동산 중심의 부의 축적 구조 085
07 기술 추격에서 기술 선도국으로의 이행 실패 089
08 내수와 수출, 양날의 구조 불균형 094
09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청년실업 099
10 정치·사회 갈등과 사회자본의 붕괴 103
PART 3 기업, 혁신과 생산성의 재설계
01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111
02 낡은 산업정책에서 미래 산업전략으로 115
03 디지털 전환, 말이 아닌 실행 119
04 유니콘 육성보다 생태계 전반 혁신 123
05 플랫폼 기업 규제와 공정경쟁 질서 127
06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 중심 인사체계 132
07 규제 샌드박스, 왜 효과가 없었나 136
08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대한 대응 140
09 R&D 투자 구조의 전면 개편 144
10 ESG와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 148
PART 4 정부의 역할, 성장 촉진자로 거듭나야
01 정부지출 확대, 그 방향이 문제다
02 포퓰리즘 복지 대신 생산적 복지
03 정책 일관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04 공공부문 개혁, 효율성과 민간유인 강화
05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권한 재조정
06 행정 혁신과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07 규제 완화, 선언이 아닌 실행
08 미래 예산 구조로의 개편
09 산업정책 vs 시장의 역할
10 기회정부로서의 전환 선언
PART 5 노동과 인재, 성장의 새로운 동력
01 노동의 질, 어떻게 높일 것인가
02 평생학습과 재교육의 국가 시스템
03 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04 여성·고령층의 경제참여 확대
05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
06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의 균형
07 고용 안정과 유연성의 조화
08 공공일자리보다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09 이민정책, 인구절벽의 전략적 대응
10 교육혁신이 인재혁신이다
PART 6 미래를 위한 투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0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미래산업의 주력화
02 반도체 이후, 새로운 수출 동력은 무엇인가
03 그린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04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
05 농업·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06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
07 인프라 투자, 물적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08 국부펀드와 전략적 국익 투자
09 과학기술기반의 중장기 성장전략
10 국방산업과 우주산업, 성장의 숨은 동력
PART 7 저성장 탈출을 위한 국가대전략
01 ‘성장의 목적’을 다시 묻다
02 성장과 공정의 균형 있는 재정의
03 사회적 자본 회복과 신뢰 기반 재구축
04 기회의 사다리 복원, 교육·복지·금융 재설계
05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체계 확립
06 대타협 기반의 거버넌스 혁신
07 성장 패러다임 전환: 속도에서 지속가능성으로
08 포용적 성장의 제도화 방안
09 성장지표를 넘어선 삶의 질 지표
10 대한민국 성장 대전환 로드맵
맺는말 덫을 넘어, 전환의 문턱을 넘어서
참고문헌
책속에서
셋째,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기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에게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훈련, 재취업 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자산 불평등, 교육 기회, 직업 선택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경제적 포용성과 직결된다.
결국, 포용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오래 성장할 수 없다. 분배를 외면한 채 추구한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함께 성장했는가?”로. 성장은 나눌 때 지속된다.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성장이다.
왜곡된 노동시장, 청년을 밀어낸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이중 구조’다. 한쪽은 정규직·대기업 중심의 고소득·고안정 일자리이고, 다른 한쪽은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기반의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첫째,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지만, 스펙 경쟁과 학벌 중심 채용 구조, 필기시험 중심의 채용 체계는 실무 역량이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교육 왜곡과 입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탈락자의 좌절감을 증폭시킨다.
둘째,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 낮다.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복지나 경력 개발 체계도 미흡하다. 청년은 “억지로 들어갔다가 금세 그만두는 일자리”라고 인식하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회전문’이 된다.
지속 가능한 ESG 생태계를 위한 전략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ESG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G 통합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최고경영진이 ESG를 기업 전략의 핵심축으로 선언하고, 재무성과와 ESG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지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전사 ESG KPI 도입 등이 필수적이다.
둘째, 중소기업 ESG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표준화된 ESG 대응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전용 공시플랫폼, ESG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 및 인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