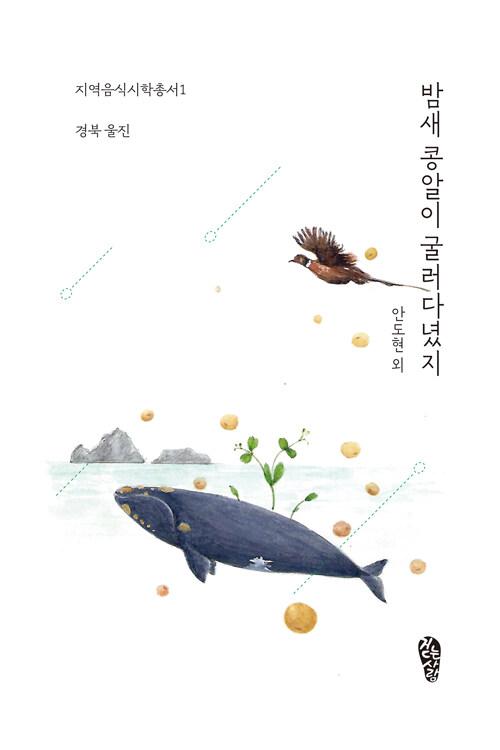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시 > 한국시
· ISBN : 9788939207349
· 쪽수 : 148쪽
· 출판일 : 2015-07-28
책 소개
목차
1부 내 마음아 아직도 너는 그리워하니
내 마음아 아직도 기억하니(이성복)|낙화, 첫사랑(김선우)|늦가을(김사인)|병산서원에서 보내는 늦은 전언(서안나)|생은 과일처럼 익는다(이기철)|봄, 가지를 꺾다(박성우)|데드 슬로우(김해자)|숨거울(손택수)|너의 눈(김소연)|오서산(장철문)|미친 약속(문정희)|여자비(안현미)|수평선에의 초대(박용하)
2부 오늘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파꽃(안도현)|옛 노트에서(장석남)|길(이하석)|기억제 1(정현종)|높새바람 같이는(이영광)|짐-어머니학교 6(이정록)|가여운 나를 위로하다(박두규)|오늘 나는(심보선)|영영이라는 말(장옥관)|물수제비(박현수)|적도로 걸어가는 남과 여(김성규)|여름꽃들(문성해)
3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가 왔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황지우)|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나희덕)|잠들기 전에(이시영)|터널(조용미)|혼잣말(위선환)|오므린 것들(유홍준)|그네(문동만)|아픔이 너를 꽃피웠다(이승하)|나무 아래 와서(배창환)|토막말(정 양)|시인들(박후기)|12월(김이듬)|공백이 뚜렷하다(문인수)
4부 내가 계절이다
그리운 나무(정희성)|외계(김경주)|불을 지펴야겠다(박 철)|강 건너는 누떼처럼(엄원태)|내가 계절이다(백무산)|무언가 찾아올 적엔(하종오)|마루에 앉아 하루를 관음하네(박남준)|우물(박형권)|눈이 내리는 까닭(복효근)|태산이시다(김주대)|꽃은 자전거를 타고(최문자)|황홀(김연자)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병산서원에서 보내는 늦은 전언
서안나
지상에서 남은 일이란
한여름 팔작지붕 홑처마 그늘 따라 옮겨 앉는 일
게으르게 손톱 발톱 깎아 목백일홍 아래 묻어 주고 헛담배 피워 먼 산을 조금 어지럽히는 일 햇살에 다친 무량한 풍경 불러들여 입교당 찬 대청마루에 풋잠으로 함께 깃드는 일 담벼락에 어린 흙내 나는 당신을 자주 지우곤 했다
하나와 둘 혹은 다시 하나가 되는 하회의 이치에 닿으면 나는 돌 틈을 맴돌고 당신은 당신으로 흐른다
삼천 권 고서를 쌓아 두고 만대루에서 강학(講學)하는 밤 내 몸은 차고 슬픈 뇌옥 나는 나를 달려 나갈 수 없다
늙은 정인의 이마가 물빛으로 차고 넘칠 즈음 흰 뼈 몇 개로 나는 절연의 문장 속에서 서늘해질 것이다 목백일홍 꽃잎 강물에 풀어 쓰는 새벽의 늦은 전언 당신을 내려놓는 하심(下心)의 문장이 다 젖었다
“목백일홍 꽃잎 강물에” 점점 홍홍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여름날인가. 모르겠다. 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사계절이 다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데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마음의 풍경인가. 이른 봄 해바라기 하는 마음이 보이는 듯도 하고, 늦가을 밤 어디선가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시 어디쯤에선가 서릿발이 느껴지는 듯도 하고, 봄날 아지랑이 같은 숨결이 감지되는 듯도 하다. 계절은 무슨 소용. 다만 인연, 오는 것들을 맞이하는 설렘이 어떤 짧은 만남의 격렬한 파동을 거쳐 마침내 떠나가는 것들의 잦아듦이 처연할 따름이다.
사람의 발이 있기는 있는 걸까. 그늘을 따라 옮겨 앉는 일도 햇살을 따라 자리를 바꾸어가는 일도 다 헛된 것만 같다. “내 몸은 차고 슬픈 뇌옥 나는 나를 달려 나갈” 발이 없다. 결국 내려놓느니 마음이다. 은근 축축하다. 체감은 시리기까지 하다. 하긴, 사람 사이에 꽃잎이 지는데 봄가을을 가리겠는가 여름겨울을 나누겠는가.
여자비
안현미
아마존 사람들은 하루종일 내리는 비를 여자비라고 한다
여자들만이 그렇게 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우는 아이보다 더 길게 울던 소리
오래전 동냥젖을 빌어먹던 여자에게서 나던 소리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젖 먹는 아이보다 더 길게 우는 소리
오래전 동냥젖을 빌어먹던 여자의 목 메이는 소리
‘∼이라고 한다’는 이 시의 화법을 빌려 나도 거들 말이 있다. ‘자비慈悲’라는 말이 있다. ‘慈’의 상형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하고, ‘悲’의 상형은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마른 젖을 물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 모순된 글자들을 한 데 묶어 최선의 사랑이라고 한다.
기쁨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슬픔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도망치지 않는다.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의 아픈 몸을 대신 아파 줄 수는 없지만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배고픈 아이를 보거든 먹을 것을 찾아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거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자비다. 무연자비無緣慈悲, 인연이 없을수록 더.
이 시처럼 세상에는 배고파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안고 아이보다 더 길게 우는 어미가 있다. 이 아픈 사랑을 외면하는 기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慈’와 ‘悲’는 늘 말로만 하나로 묶여 있지 현실은 따로 국밥이다. 이 시에서처럼 아이만이라도 배가 부를 수 있다면 자신은 굶어죽어도 좋은 어미의 혀를 씹는 슬픈 사랑만이 외롭다. 여자비, 여‘慈悲’? 혹독하게도 내 눈에는 여전히 여자‘悲’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