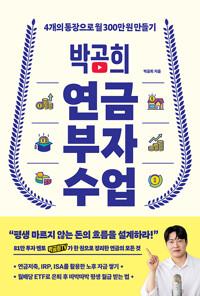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50955366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14-05-16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장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
일등 국가 일본
반면교사가 된 일본
한국은 어디로?
일본화란 무엇인가?
2장 ‘성숙을 넘어 조로로’ 퇴조하는 한국 경제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 경제의 진화
최대의 위협, 초고속·압축 고령화
또 하나의 암초, 근로정신의 퇴화
성숙 단계 조기 졸업과 노화의 본격화
3장 불균형 성장 전략의 종언
‘낙수 효과’의 소멸과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탈공업화와 서비스화의 한국적 특징
디커플링 경제의 출현
그래도 수출만이 살길이다? 엔저공습론 유감
4장 한국 경제의 뉴 노멀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언과 역자산효과
4저불황의 먹구름
부채 축소가 본격화되면 ‘대차대조표 불황’
피할 수 없는 재정 건전성 악화
5장 국가 쇠락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실패’
‘민주 대 독재’ 구도의 종언
‘공화 없는 민주’의 비극
표의 노예가 된 여의도 정치
두 개의 인구보너스기 그리고 대한민국
맺음말
저자소개
책속에서
2장 ‘성숙을 넘어 조로로’ 퇴조하는 한국 경제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 경제의 진화
‘한강의 기적’은 이제 아련한 옛 추억이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최근 수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건국 이래 최초로 2011년 2분기 이래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했다. 다행히 2013년 2분기와 3분기에 전기 대비 1.1% 성장률을 기록해 0%대 행진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4분기에 또다시 0.9%로 주저앉았다. GDP 성장률은 2012년 2.0%, 2013년 2.8%로 3.6~3.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문제를 냉정히 파악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지니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구가하지 못하고 저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문제인가? 현재의 저성장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제2의 한강의 기적’처럼 고도성장을 재현할 수 있다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한 진단은 경제 발전에 있어 현 단계가 지니는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의 정체는 20년 혹은 50년 주기로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식의 경기순환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대의 위협, 초고속·압축 고령화
‘연령지진’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피터슨Peter G. Peterson의 저서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와 월리스Paul Wallace의 저서 『Agequake』7에서 유래한 말로 연령Age과 지진Earthquake의 합성어다. 갑작스런 고령화로 발생하는 충격과 사회적 문제를 일컫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를 “초기에는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이라고 묘사하였다. 피터 드러커는 고령화를 “국가 전체의 집단적 자살행진”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기존 경제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이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받을 사람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재정부담의 증대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 은퇴자들은 늘어난 기대여명에 대한 대비책으로 씀씀이를 줄인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근로자 수가 줄어드니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은 일본보다 더 심각
고령화는 노동공급 능력의 저하 그리고 부양률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비 위축을 불러오는 특징이 있다. 소비 위축은 재고 증가, 신규투자 중단, 생산 감축,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이 패턴을 거쳐왔다.
일본의 고령층은 첫째, 전통적 가족 형태가 사라지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2011년 한 해 무려 3만 2000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 둘째,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중위소득층 기준으로 35.7%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0.8%(2008년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 등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다.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일본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56%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도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규모는 40~50대에 비해 작았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 정부는 2012년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 세금을 감면 또는 유예해주는 사전상속 장려 방안과 손자손녀의 교육비를 조부모가 낼 경우 1500만 엔까지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지갑을 열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젊은 층의 주거부담과 교육비를 줄여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그렇다면 일본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 고령층의 소비 여력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13년 현재 20%에도 못 미쳐 일본보다 낮다.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에 의하면 은퇴자 1인당 평균 순자산은 1억 243만 원으로 일본보다 적다.
더 큰 문제는 포트폴리오다. 일본의 가구별 자산구조를 보면 ‘금융자산 59.1%-부동산 27%-기타 13.9%’인 반면, 한국의 경우 ‘부동산 70%-금융자산 25%-기타 5%’로 확연히 차이난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은 유동성과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인 5221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1억 8322만 원으로 2009년의 1억 9403만 원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