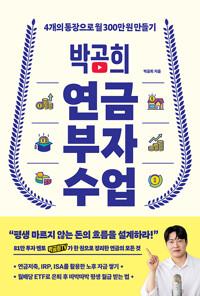책 이미지
![[큰글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한국경제 이야기 2](/img_thumb2/9788952230744.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52230744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15-01-28
책 소개
목차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노태우 시대
경제는 실패, 개혁은 성공, 김영삼 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를 말하다, 김대중 시대
비주류 대통령, 노무현 시대
CEO 대통령, 이명박 시대
한국경제 일지(1988~2012)
주요 경제지표(1988~2012)
저자소개
책속에서
노태우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북방 정책에 관한한 뽐낼 만하다. 당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노태우는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재임 기간에 수교한 공산권 국가가 무려 37개국이나 됐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가 시대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북방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던 결과였다.
사실 정부 안에서 조차 북방 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렸다. 외무부(지금의 외교부)는 북방 정책에 적극적이었지만, 경제부처들은 소극적이었다. 공산국가들이 대부분 수교를 대가로 경제협력이라는 막대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야 할 경제부처들은 자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가 “돈이 들더라도 공산권 수교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로 북방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자신만만했다.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 시장을 과감히 개방했고, 신생 종금사들이 홍콩 금융시장에서 외자를 끌어들여 한국기업에게 빌려 주는 일도 예사로 벌어졌다. 그들은 돈만 빌려 오는 것이 아니고, 대박을 노리고 위험부담이 높은 싸구려 정크본드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국내 금리보다 낮은 외채가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기업들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신규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부채비율(30대 재벌 기준)은 350~400%로 높아졌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한 기업은 외채를 많이 빌릴수록 좋았다. 재수가 좋으면 싼 금리에 더해 환차익까지 누릴 수도 있었다.
외국투자자들도 ‘설마 한국에 돈을 떼일까?’ 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한국기업들에 돈을 빌려 줬다. 수출이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데도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원화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는 같은 기간에 20~30%씩 절하되는 판에 유독 한국의 원화만 3년 내내 평균 환율이 달러 당 800원대를 유지됐으니 수출은 죽을 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출은 부진한데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해외여행 자유화까지 겹쳐 급기야 1996년에는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보유고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기관들이 해외영업 규제에서 풀려 마음대로 외자를 끌어들였다. 그것도 정부가 장기 차입은 규제하고 단기 차입만 허용했기 때문에 1년 만기 이하의 단기 외채 도입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총 외채는 1993년 439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1,047억 달러로 급속히 불어났다.
“금고 열쇠를 넘겨받아 열어 보니 1,000원짜리 한 장 없고, 빚 문서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G7조차 약속했던 80억 달러를 못 주겠다고 한다. 외채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모라토리엄(moratorium, 채무 불이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대중은 훗날 자서전에서 “달러가 생긴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야 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이었던 66일 동안 이미 그는 사실상의 대통령으로서 IMF와의 협상을 지시하고 주도했다.
김대중이 당선되자 일부에서는 불안해 했다. 그동안의 주장과 노선을 감안할 때 ‘좌파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IMF도 그런 점을 미심쩍어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좌·우파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김대중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장한 ‘대중경제론’이 아니라 IMF와 미국의 신뢰를 얻는 일이었다.
IMF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의 재무차관이 워싱턴에서 날아와 김대중 당선자를 만났다. 과연 구제금융을 해 줄 만한 지 저울질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에서 김대중은 정리해고 등 노동 시장 개혁과 과감한 개방 정책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면접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였다.
김대중은 벼랑 끝 상황에서도 노련하게 대처했다.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선거 공약들 대신 위기 타개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우선 인사부터 예상을 깼다. 경제 분야는 선거 캠프 때부터 활약했던 측근들을 배제하고 전문 관료 위주로 내각을 구성했다. 측근이었던 김태동을 첫 경제수석에 기용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경질하고 경제기획원 관료출신인 강봉균을 앉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과 은행의 부실 문제를 감당해야 할 금융위원장에는 적군 이회창 캠프의 경제참모였던 이헌재를 앉히고 전권을 일임한 것도 전혀 뜻밖이었다. 이헌재는 비록 적진의 참모였으나 김대중의 신임 속에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하며 재벌 개혁과 은행 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었다.
















![[큰글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한국경제 이야기 2](./img_thumb2/9788952230744.jpg)












![[큰글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한국경제 이야기 1](/img_thumb2/978895223073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