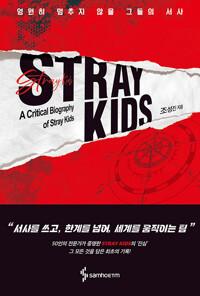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예술/대중문화 > 미술 > 미술사
· ISBN : 9791186921654
· 쪽수 : 744쪽
· 출판일 : 2018-11-30
책 소개
목차
서문 5
1장 일제강점기 일본인 화가들의 작품 11
2장 경성 일본인 화가들의 중심 시미즈 토운 13
3장 야마모토 바이카이의 「눈 내린 풍경」 25
4장 야마모토 바이카이 「조선 사찰 풍경」의 서글픈 운명 57
5장 조선 풍속을 주제로 한 시미즈 토운 그룹의 그림엽서 65
6장 조선남화원을 조직한 구보타 텐난의 「묵매」 81
7장 시미즈 토운의 최제우·최시형 참형도 115
8장 일제강점기 학교 미술 교육을 담당한 일본인 화가들 131
9장 조선을 사랑한 화가 가토 쇼린 161
10장 고무로 스이운의 화집 『남선북마책』 175
11장 조선 도자기의 신, 아사카와 노리타카의 그림 189
12장 1932년 경성의 시장 풍경, 야마구치 호슌의 「시장」 225
13장 평양의 명소 연광정, 가와무라 만슈의 「조선 풍경」 239
14장 히라후쿠 햐쿠스이의 「조선 을밀대」 261
15장 조선미술전람회 초대 심사위원 가와이 교쿠도의 「유음한화」 279
16장 가장 조선적인 일본인 화가 가타야마 탄 293
17장 문화학원 미술과 창설자 이시이 하쿠데이의 한국 인연 309
18장 마에다 세이손의 「조선 노상 풍속」 339
19장 가타야마 탄의 「구」와 김기창의 「엽귀」 349
20장 하시모토 간세쓰의 「발」 371
21장 쿠보이 스이토의 「조선의 거리」 1920년대 경성 청계천 주변 풍속 377
22장 교토 출신 화가들의 조선 풍속 목판화 그림엽서 393
23장 일본 만화가들이 조선 풍속을 그린 목판화 그림엽서 407
24장 경성의 멋쟁이 화가 히로이 고운 431
25장 탐험화가 미사코 세이슈의 「광산 풍경」 447
26장 개성의 절경 박연폭포, 레이카 가이시의 「박연폭포」 457
27장 1939년 조선에서 보낸 한 철, 야마카와 슈호의 「조선 부인」 467
28장 가와베 가도 「채반을 인 조선 부인」 493
29장 일본 근대 서양화단의 선구자 아사이 추의 한국 체험 507
30장 이중섭의 스승 쓰다 세이슈의 유화 「조선 풍경」 513
31장 가와마타 코호의 「수원아루」 523
32장 오쿠보 사쿠지로의 「의자에 앉은 조선 여인」 529
33장 일본인 남화가 11인의 『한국명승첩』 537
34장 장애를 극복한 선전의 기린아 우노 이쓰운
35장 금강산을 사랑한 화가 도쿠다 교쿠류
36장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 시마다 사이가이의 「산장 방문」
37장 금강산의 은은한 비경, 이와다 슈코의 「금강산 영원암」
38장 가와카미 코류의 「금강산 만물상」
39장 조선 고적 발굴의 선구자 하마다 고사쿠의 「고물이 잇소」
40장 진정한 고고학의 딜레탕트 시라가 주키치
41장 일제강점기 교토의 디아스포라, 한국인 화가 정말조
42장 재일 한국인 남화가 유경순
43장 일제강점기 한일 미술계의 좌장 시미즈 도운과 해강 김규진의 조우
44장 이한복과 이마무라 운레이의 교유
45장 풍운아 황철과 외팔 남화가 요시츠구 하이잔의 만남
결론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1. 일제강점기 일본인 화가들의 작품
현재 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된 일본화들은 당시 최고 수준에 있던 작가들의 작품이지만 개화기에서 일제강점 36년에 이르는 반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기에는 당시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다. 당시 총독부, 이왕가, 창덕궁 등에서 사들였지만 이들 작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그려진 것도 아니며, 한국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한국에 거주했던 화가들의 작품도 아니다. (...) 그동안 박물관의 일본화들이 60여 년을 수장고에 숨어 있었듯이 박물관 관계자 중 누구도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던 작품을 수집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기관에서 사들였던 작품의 소재조차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일본과 관련된 것은 모두 사악한 것이 되어버리거나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위조되어 팔리기까지 하였다.
3. 최초의 서양화 강습소를 설립한, 야마모도 바이카이의 <눈 내린 풍경>
우리는 그동안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근대미술 형성기를 몹시 부끄러워 한 일면이 있었다. 그래서 때론 외면하기도 하고 숨기기까지 한 측면도 있었다. 물론 일제 강점의 아픔이 있었지만 문화의 전파는 역사를 넘어서는 다른 가치가 있음을 알았어야 하는데, 슬픈 역사 뒤로 문화조차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실정이었다.(...) 어떤 미술사학자의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는 근대미술관이 없는 나라’라며, 근대를 너무 모른다고 하던 그의 자조적인 말이 가슴을 울린다.
7. 시미즈 도운(淸水東雲)의 최제우·최시형 참형도(慘刑圖)
<최제우 참형도>와 <최시형 참형도>는 한국인을 위한 민족정신이 담겨 있는 정신사적 단체 행동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우리의 쓰라린 기억이 한국인 화가가 아니라 일본인 화가의 손으로 그려졌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억울한 일이다. 이 작품이 그동안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것도 어쩌면 해방 후 이러한 사실이 부끄러워 처박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시 이 그림을 마주 대하는 것도 편치 않은 일이다. 그래도 이 그림에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 동학과 관련된 특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전에 걸려 있던 작품을 다시 그렸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미즈 도운의 당시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인물화를 잘 그렸다고 전해오는 화풍의 모습을 처음으로 실제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