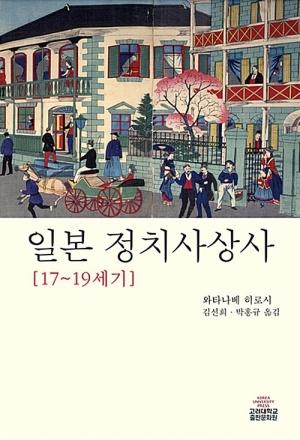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일본사 > 일본고대/중세사
· ISBN : 9791198063984
· 쪽수 : 242쪽
· 출판일 : 2023-01-23
책 소개
목차
차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들어가는 말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 1 장 ‘일본적’ 문화의 형성 . . . . . . . . . . . . . 19
1.1 이른바 ‘일본적’인 것과 근세 . . . . . . . . 19
1.2 일본 고전 문화의 영상 완성 . . . . . . . . 28
1.3 이국취미 문화의 일본화-선 . . . . . . . . . 40
1.4 선종 문화와 일상생활 . . . . . . . . . . . 48
1.5 일본적 유학의 성립 . . . . . . . . . . . . . 55
1.6 일본의 문화적 자립 . . . . . . . . . . . . . 66
1.7 쇄국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75
제 2 장 새로운 국가의 성장과 전개 . . . . . . . . . 83
2.1 ‘일본적’ 문화 형성의 배경 . . . . . . . . . 83
2.2 국가의 공백기 . . . . . . . . . . . . . . . . 86
6
2.3 공의公儀의 성립 . . . . . . . . . . . . . . . 94
2.4 가정家政에서 국정으로 . . . . . . . . . . . 104
2.5 다테 사회를 향한 저항의 좌절 . . . . . . . 115
2.6 행정 관료의 역할 . . . . . . . . . . . . . . 124
2.7 근세 사회의 맹점 . . . . . . . . . . . . . . 137
2.8 ‘사私’ 세계의 성장 . . . . . . . . . . . . . . 144
제 3 장 ‘근대화’ 일본의 기반 형성 . . . . . . . . . 151
3.1 우민관의 수정 . . . . . . . . . . . . . . . . 151
3.2 민중의 지식욕 . . . . . . . . . . . . . . . . 160
3.3 문화의 상품화 . . . . . . . . . . . . . . . . 166
3.4 지적 시민 사회 . . . . . . . . . . . . . . . 176
3.5 외래문화의 수용 . . . . . . . . . . . . . . . 196
3.6 새로운 격물궁리 . . . . . . . . . . . . . . . 204
나오는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219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
장별 주요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223
에도시대 막부 관직 구조 . . . . . . . . . . . . . 227
역자 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231
찾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235
책속에서
일본 문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외래문화, 특히 중국에서 전래된 것임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적’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은 전래된 당초에는 ‘이국적’이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에게 환영받았다가, 근세에 들어선 후 그것이 ‘일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첫손가락에 꼽을 만한 것이 바로 선(禪)이다.
근세의 쇄국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서술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특히 정책 실시에 관한 후세의 논평은 그 의의와 공과라는 점에서 심히 부당한 부담을 지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현대 일본인의 국제성 결여조차 근세 쇄국의 후유증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일본인의 섬나라 근성이 단순히 쇄국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기타무라 도코쿠는 『도쿠가와 시대 평민적 이상』에서 “겐로쿠 문학을 비하하여 일본 문학의 치욕”이라 간주하는 설에 반대하며 “일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평민의 목소리”라 주장하면서 평민적 이상의 발로이자 일본의 생명 표현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도쿠가와 3백 년의 저변에 흐르는 큰 강물이 눈앞을 가로지를 때 나는 이를 즐겨 관찰한다. 누가 알겠는가. 도쿠가와 시대에 땅 밑에서 흐르던 큰 강물은 메이지의 정치적 혁신에 막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님을”이라고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