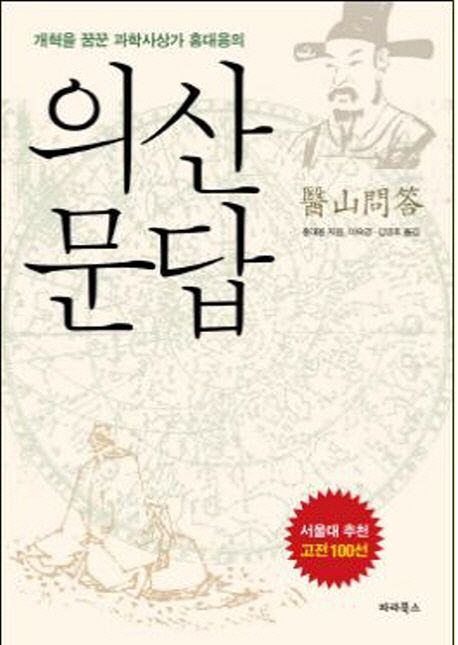홍대용 평전 2 (실천적 정주학자)
강명관 | 푸른역사
35,100원 | 20251029 | 9791156123071
지전설을 주창한 탁월한 과학자?
신분제 철폐를 내세운 사회사상가?
화이론을 부정한 내재적 민족주의자?
‘실학자 담헌’을 둘러싼 ‘신화’는 잊어라
‘담헌 신화’의 비판적 읽기 결정판
조선 후기에 활약한 홍대용은, ‘4천 년 동안 사상에 빛나는 학자’ 6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 대표적 실학자다. 지은이는 방대한 관련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이런 통설에 설득력 있는 이의를 제기한다. 홍대용의 대표적 저술이라 할 《의산문답》, 〈임하경륜〉은 물론이고 그가 북경의 청나라 지식인들 주고받은 편지며, 《수리정온》 등 당대 서양 수학ㆍ과학 저술까지 섭렵해 홍대용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16년 전 원고 집필을 시작해, 편집에만 3년이 걸린 원고지 5,500여 매-그사이 새로운 사료가 드러나 원고지 1,000여 매 분량이 추가되기도 했다- 분량의 이 책은, 볼륨 자체만으로도 우리 출판사에서 보기 드문 대작大作 평전이다.
평전의 전범-종합적ㆍ입체적 인물상 복원
‘대작’인 것만이 이 책의 미덕이 아니다. 여태 경학經學, 역사비평, 천문학과 자연학, 수학, 음악학, 실학 등 분절적으로 이해됐던 홍대용의 성취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 그가 종래 알려졌던 ‘실학자’가 아니라, 진시황의 ‘분서’가 정당한 것이라 평했을 정도로 철저한 정주학자였음을 밝혀냈다. 여기 더해 그의 집안이 넉넉한 경화세족이었다든가, 십대 시절의 방황, 스승 김원행에 대한 비판적 의문 제기, 부친 홍역이 연루된 부패 사건, 북경행 전까지 홍대용의 수학 수준 등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내 홍대용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홍대용이 쓴 수학책 《주해수용》을 이해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수학책까지 들춰봤다니 더 말할 게 없다. 깊게 파고들고 넓게 살피는 지은이의 저술 방식에는 어지간한 동료 연구자들이 토를 달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게 해서 홍대용이 정주학의 진리성을 부정한 적이 없고, 단지 실천을 도외시 하는 주자朱子 맹신을 비판한 ‘실천적 정주학자’였음을 논증하는 데 성공했다.
한계 뚜렷한 ‘조선의 코페르니쿠스’
흔히 홍대용은 전근대적 우주관을 무너뜨린 ‘조선의 코페르니쿠스’라 평가된다.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지구 자전설과 우주 무한론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은이는 홍대용의 자연학은 관측과 수학에 의거한 ‘과학’이 아니라, 정주학의 기론氣論에 입각한 선언적 상상력으로 구성된 것이라 한계를 지적한다. 물류상감설과 같은 재래의 동기감응설을 끌어오는가 하면 도가의 수련을 통해 천체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황당한 말까지 태연히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담헌이 제작했던 혼천의가 관측기구가 아니라 천체 모형이었으며, 자신의 서재 천장에 별자리 그림을 붙여 놓고 천문학 연구에 열중했다든가 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전설은 지구 자전만 이야기했지 공전에 대해서는 침묵했기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구중심설을 깨뜨린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과 궤를 달리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홍대용의 지구 자전설이 담긴 《의산문답》이 인쇄되어 읽히지 않았기에 그 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했다는 것이다.
민과 동떨어진 신분제 해체론
지은이는 홍대용이 신분제 타파 등 평등을 강조한 사회사상가라는 주장 역시 ‘신화’라고 논증한다. 우선 그가 남긴 모든 글에서 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사회의 계급과 신분적 차별에 반대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평가는, 그가 〈임하경륜〉에서 ‘놀고 먹는’ 유식遊食 사족을 비판한 대목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는 오독誤讀이라는 것이다. 담헌 자신이 노비를 거느린 지주였으며, 음직으로 벼슬을 살았다. 그러니 재능과 학문이 있는 농부나 장사꾼의 자식이 조정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공경의 자제가 관청의 하인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은 진실성 혹은 실천성이 결여된 수사로 보았다. 민이 수탈당하는 사회 모순에 대해 말하기는커녕 영천 군수로 있을 때 진휼곡을 착복하고 그것을 군민에게 빌려주어 갑절로 받아내려 했다고 꼬집는다. 또한 그가 그린 이상사회는 농민은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농민은 거주를 이전할 수 있고, 농토를 분배받을 수 있는 통제사회였다. 다산 정약용이나 연암 박지원과 달리 토지 소유제 등 〈임하경륜〉에 담긴 그의 ‘개혁책’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단편적이라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화이론 부정의 진짜 이유와 그 실체
조선에서의 ‘화이론’은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준 명에 대한 충절의식을 내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홍대용이 북경행 이후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엄성ㆍ반정균 등 중국인 벗들은 이미 청 체제를 인정하고 있었다. 담헌이 귀국길에 만나 희원외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간단한 논리로 복색을 들먹이며 화와 이를 구분하려는 담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니 담헌이 이후 저술한 《의산문답》에서 화ㆍ이의 구분은 그저 허구라고 역설한 데는 개인적 동기가 있었다고 지은이는 해석한다. 귀국 후 벌어진 논쟁에서 김종후가 엄성 등을 명에 대한 충절 의식도 없이 오랑캐 조정에 벼슬하고자 하는 비루한 자로 몰아붙이자 그들과의 사귐을 중히 여겼던 담헌이 이를 논파하기 위해 화ㆍ이의 구분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구는 둥글다, 따라서 중국도 당연히 중심이 아니라는 지원설地圓說에 근거한 것이기도 해도 이를 그저 ‘민족의 주체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지은이가 그려낸 홍대용은, 우리가 ‘교과서’로 익힌 홍대용상과 사뭇 다르다. 그러나 홍대용의 성취와 의미에 대한 주류의 해석은, 20세기 이후 한국인들이 있기를 바랐던 ‘자생적 근대화의 싹’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1,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지만 ‘담헌학’-만약 있다면-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책이다. 덧붙이자면 역사 바로 보기를 원한다면 무의미한 여정은 아닐 것이다.
지은이|강명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조선 중기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에서 활동했던 여항인의 역사적 실체와 문학을 검토해 한문학의 지평을 넓혔으며, 방대한 한문학 텍스트에 근거한, 풍속사, 사회사, 음악사, 미술사를 포괄하는 다양한 저서들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근래에는 조선 시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인간의 사유와 행위로 연결되어 어떤 인간형을 만들어 내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 《냉면의 역사》, 《노비와 쇠고기》, 《이타와 시여》, 《가짜 남편 만들기》, 《조선 풍속사》(전 3권), 《열녀의 탄생》,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독서한담》,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조선 후기 여항문학 연구》,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