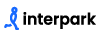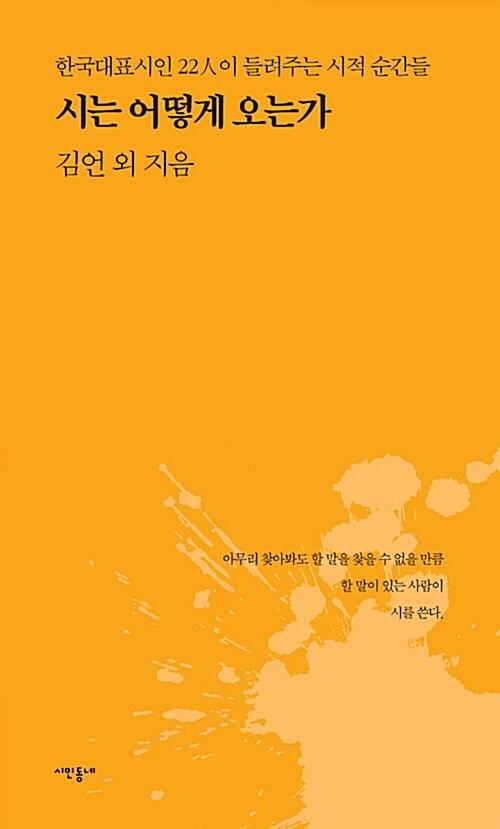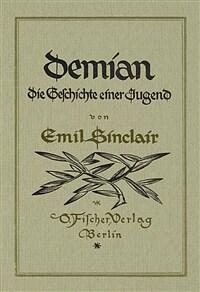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시 > 한국시
· ISBN : 9788932017501
· 쪽수 : 127쪽
책 소개
목차
시인의 말
제1부
새의 길
자갈밭
새떼를 베끼다
가락지
손바닥
육탈
마디
쇠못
협착
하늘못
대병
목어 1
목어 2
가면
발자국
파문 1
파문 2
중심
휨
새의 잠은 어둡다
제2부
화석
속도가 허물을 벗는다
이슬방울 떨어지는 법
섬에서 내다보다
지평선
월인보
거짓말
나뭇잎을 딛고 걷다
혼잣말
동디 무렵
재회
등자국
안개
홍예
일식
일박
진달래
주름살
빌미
언제나 며칠이 남아 있다
만월
발길질
제3부
소리
수평선
비안도 1
비안도 2
비안도 3
석모도
천수만
다도해
우중
물길
노숙
수화
동면
탐진강 18
탐진강 19
탐진강 20
탐진강 21
해동기
백목련꽃
오월
모항에서
토악질
해설 - 위선환의 고전주의 / 황현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새떼를 베끼다
새떼가 오가는 철이라고 쓴다 새떼 하나는 날아오고 새떼 하나는 날아간다고, 거기가 공중이다, 라고 쓴다
두 새떼가 마주보고 날아서, 곧장 맞부닥뜨려서, 부리를, 이마를, 가슴뼈를, 죽지를, 부딪친다고 쓴다
맞부딪친 새들끼리 관통해서 새가 새에게 뚫린다고 쓴다
새떼는 새떼끼리 관통한다고 쓴다 이미 뚫고 나갔다고, 날아가는 새떼끼리는 서로 돌아다본다고 쓴다
새도 새떼도 고스란하다고, 구멍 난 새 한 마리 없고, 살점 하나, 잔뼈 한 조각, 날갯깃 한 개, 떨어지지 않았다고 쓴다
공중에서는 새의 몸이 빈다고, 새떼도 큰 몸이 빈다고, 빈 몸들끼리 뚫렸다고, 그러므로 空中이다, 라고 쓴다
발길질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두텁게 내려서 겨울과, 겨울에 깊어진 온갖 것들이 묻혔다.
상태가 죽고
죽은 친구와 도수 높은 뿔테 안경과 허옇게 앞부리가 벗겨진 구두를 함께 묻었다.
친구는 젊었다.
죽어서도 제 손으로 매달아 죽인 제 주검을 걷어차고 있었다. 정강이가 푸르렀다.
갈비뼈 한 개를 빼냈다고 씌어 있었으므로
처마 아래가 반 넘게 묻힌 그해 겨울의, 눈이 깊이 빠지는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며 나는 휑하게 뚫어진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곤 했다. 친구가 떨면서 언 손을 질러 넣던 그 구멍이다. 구멍으로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다.
이맛살에 힘중리 뻗쳐 있던, 나를 어깨 위로 들어올려 눈 덮인 벌판과 벌판 너머 바다를 보여주던, 방학에 내려와 손등에다 송곳을 꽂았던
삼촌이 그만 죽어버렸다는 것을, 휘파람 소리가 문득 그친 한참 뒤에야 뒤늦게 알았다.
여기저기가 고요했다. 등허리로, 등골로도 조바심이 기어오르는 불편한 날들이 지나가고
나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늦도록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두워져도 눈은 내렸으므로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중략)
친구와 신은 젊어서 죽는다 그들은 너무 일찍 죽어버린다, 라고
나는 혼잣말을 했다. 머물며 기다리며 서성대며 밟히는 돌부리들을 걷어찼다.
겨울에는 왜 눈이 내리는지 왜 내가 걷어찬 돌부리들은 내 정강이를 때리며 떨어지는지
눈이 그쳤고, 겨울이 갔고, 다시는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머물려 기다리며 서성대며 나를 때리고 떨어지는 돌부리들을 되밟으며
지금도 나는
돌부리를 걷어차는 짓을 그만두지 못한다. 내 정강이는 푸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