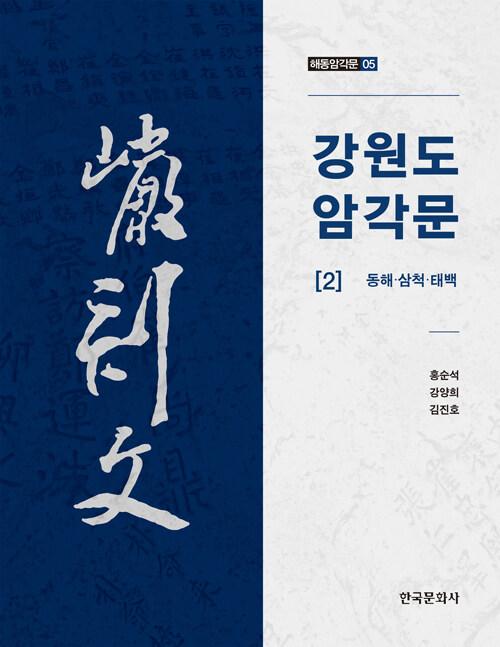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문학의 이해 > 한국문학론 > 한국고전문학론
· ISBN : 9788968176845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8-10-31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제1장 포은 시문의 간행과 전파
1. 『포은집』 간행과 시문학 작품
1) 『포은집』의 간행
2) 『포은집』의 유통
3) 『포은집』 작품
2. 국내 문헌에 소재한 포은의 시문학작품
3. 중국에 전해진 포은의 시작품
1) 『조선시선』
2) 『열조시집』
3) 『명시종』
4. 포은시문학 연구의 과제
제2장 『포은시고』 판본에 대한 고찰
1. 『포은시고』 간행과 판본비교
1) 초간본
2) 신계본
3) 『포은시고』 초간본과 신계본 판본 비교
4) 개성본과 황주병영본
2. 『포은시고』 판본의 표기 체계
1) 중첩자(重疊字)
2) 고자(古字)
3) 이자(異字)
4) 오탈자(誤脫字)
5) 시제(詩題)
제3장 포은 한시의 시어와 그 쓰임새
1. 포은한시의 시어·용자(用字) 분석
1) 포은 한시의 시어 분석
2) 포은 시어의 역방향 분석
3) 포은 한시의 용자 분석
2. 포은한시의 시어·용자의 쓰임새
3. 포은 시어의 의미망
제4장 포은의 삶과 시에 나타난 ‘매화’의 형상
1. 포은의 삶과 매화
2. 포은 한시에 나타난 매화의 형상
1) 유배시기 김해에서 만난 매화
2) 봉사일본시 큐슈에서 만난 매화
3) 정권교체기 난파원에서 만난 매화
제5장 여말선초 봉명사신의 행적과 시
1. 여말선초 봉명사신의 사행 행적
1) 정몽주의 사행노정
2) 권근의 사행노정
3) 이첨의 사행노정
2. 봉명사행시를 통해본 명대 문인과의 교류
3. 여말선초 문인들의 사행시에 나타난 등주
4. 여말선초 봉명사행시 연구의 과제
제6장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 연구
1. <단심가> 작자의 변증
2. <단심가>의 이본
1) 한글 <단심가>
2) <단심가>의 한역시
3. <단심가>의 전승
4. <단심가>의 진실
제7장 조선시대 문인들의 선죽교에 대한 인식과 시적 형상
1. 선죽교의 ‘혈흔’과 ‘읍비’에 대한 인식
2. 선죽교시에 표출된 시적 형상
1) 회고(懷古)
2) 애도(哀悼)
3) 포은의 ‘값진 죽음’을 찬미함
4) 충절(忠節)
5) 강상(綱常)
제8장 포은 이적(異蹟)의 서사와 전승
1. 포은 이적의 유형
2. 포은 이적의 서사
1) 포은의 탄생과 개명
2) 포은의 순절
3) 혈교읍비
4) 영천의 포은사당, 포은영정, 효자비
5) 포은의 묘소
6) 포은 신주와 신도비의 관작
7) 용인 숭현서원의 이적
3. 포은 이적의 전승
제2부
제1장 영일정씨의 용인지역 정착과 세거양상
1. 영일정씨의 용인지역 정착 배경
1) 포은의 천장과 세장지의 형성
2) 영일정씨의 용인지역 정착 시기
2. 영일정씨의 용인지역 세거양상
1) 별좌공계
2) 판서공계
3) 포천공계
4) 주부공계
3. 영일정씨의 용인지역 세거와 분파
제2장 포은종가의 계승과 세거지
1. 포은종가의 계승
1) 포은 봉사손의 녹용과 시혜
2) 포은 봉사손의 입계
3) 포은종가의 통혼
2. 포은종가의 세거지
제3장 포은종가의 제례에 관한 고찰
1. 포은종가 제례의 연원
1) 포은이 찬술한 <제의(祭儀)>
2) 『사례편람』에서의 제례
2. 포은종가 제례의 실상
1) 제수와 진설
2) 제례 절차
3. 포은종가 제례에 나타난 특징
1) 제례 관행
2) 제수와 진설
3) 제례 절차
4) 기타
4. 포은종가 제례의 전통과 계승
제4장 설곡 정보의 사적 변증
1. 설곡 정보의 가계
2. 설곡 정보의 사적
1) 출생과 성품
2) 관직
3) 참화와 유배
4) 묘소
5) 신원과 배향
포은학연구논저목록
찾아보기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4장 / 포은의 삶과 시에 나타난 ‘매화’의 형상
동아시아의 문학과 예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은 매화다. 중국 길림대학에서 발행한 『고대영화시사감상사전』(1990)에는 사군자를 비롯한 83종의 꽃을 소재로 한 시사 2,30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매화시가 157수로 가장 많다. 일본에서도 매화시가 많이 창작되었다. 『만엽집(萬葉集)』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꽃은 일본 재래종인 싸리꽃(140여수)이다. 그 다음으로 매화를 노래한 시가 120여수에 달한다. 벚꽃을 노래한 시가 40여수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매화가 당대 일본인들 관념 속에 형성된 꽃의 가치관을 바꿔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라말 최광유의 <정매(庭梅)>에서 시작되어 고려조의 이규보·이색·정몽주·김구용·이숭인 등이 여러 편의 매화시를 남겼다. 조선전기에 매화시로 주목되는 문인은 권근·이직·정도전·서거정·김시습·김종직·조위·김안국·김인후·이황?기대승 등이다. 조선후기에는 이수광·이안눌·이인상·신흠·이덕무·박제가·유득공·신위·김정희 등이 유명하다. 특히 이황은 『매화시첩(梅花詩帖)』에 91수의 매화시를 남겼으며, 문집에 소재한 작품까지 포함하면 107수나 된다.
조선전기에는 사대부 문화가 정착되면서 매화도(梅花圖)나 매화시(梅花詩)가 성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각문인인 서거정의 경우이다. 그는 매화도를 대상으로 여러 편의 제화시(題畵詩)를 지었다. 김종직, 조위 같은 사림파 문인들도 많은 매화시를 지었다. 그런가 하면 방외인으로 대표되는 김시습도 많은 매화시를 지었다. 작품 수는 적지만 불가(佛家)의 매화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로써 보면, 매화에 대한 관심은 당대 문인들의 공통적인 취향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매화시 연구는 이황의 『매화시첩』을 근간으로 점화되었다. 이어서 매사동인(梅社同人)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별작가의 매화시에 관심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색·정도전·서거정·김시습·서사원·이수광 등의 매화시 연구가 그것이다.
필자는 최근 고려조의 매화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송대에 이르러 매화시 뿐만 아니라 매화도를 그리는 풍조가 확산되었으며, 여말선초의 정권교체기에 매화시가 많이 지어졌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실제 한국의 매화시는 송대의 임포·왕안석·소식·육유·주희·양만리 등의 매화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본 장은 고려시대 매화시 연구의 첫 작업이다. 우선, 포은의 매화시에 주목하고자 한다. 『포은집』에 전하는 시작품 260수에서 매화시는 13수에 지나지 않으나, 단일 소재로 형상화된 빈도수를 보면 비중이 크다. 구체적으로 ‘梅窓’, ‘梅村’, ‘梅花’, ‘梅花樹’, ‘早梅’, ‘黃梅’와 같이 매화와 관련된 시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포은은 송대의 문천상(文天祥)과 비유된다. 문천상은 송나라 수도 임안이 함락된 뒤 단종을 받들고 근왕군을 일으켜 원나라의 군사에 대항하였으나 사로잡혀 처형된 사람이다. 그가 옥중에서 지은 <정기가(正氣歌)>는 포은의 <단심가>와 같이 그의 절개를 읊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 중기의 문인 윤두수(尹斗壽)는 두 사람의 순국사적을 정리해 『성인록(成仁錄)』을 간행하였다. 문천상의 시 가운데 매화시가 중시되고 있음을 볼 때, 포은시에 나타난 의 매화의 형상을 살피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1. 포은의 삶과 매화
포은의 삶과 시에서 매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다음 몇 가지 사실 때문이다. 우선, 유방선(柳方善)이 포은선생의 옛집을 찾아갔을 때 지은 <방포은선생구거소부(訪圃隱先生舊居小賦)>에서 포은선생이 매화를 남달리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해당하는 시구만 보인다.
今歲月之幾何兮 지금 세월 얼마나 지나갔는가
令人思慕之益深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 더욱 깊은데
宅舍沒於榛蕪兮 잡목과 잡초 속에 집이 묻히고
獨梅竹之蕭森 매화와 대나무만 쓸쓸히 있어
羌覽物而興懷兮 사물을 보매 회포가 일어나므로
終日攀撫而悲吟 종일토록 어루만져 슬피 읊도다
유방선은 이 시의 자주(自註)에서 “선생께서 손수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심으셨는데 아직도 있으므로 편중에 언급하였다.[先生手種梅竹尙存 故篇中及之]”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에서 포은은 이미 순절하여 세상에 없음에도 그가 심은 매화와 대나무만 남아 있기에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깊다고 하였다. “잡목과 잡초 속에 집이 묻히고/ 매화와 대나무만 쓸쓸히 있어”라는 시구에서 포은의 위상을 상상할 수 있다. 유방선이 포은의 옛집에서 직접 목도한 실상을 묘사한 것이지만, ‘잡목과 잡초’, ‘매화와 대나무’는 상호 대비되는 존재로 소인배와 군자의 형상을 대신한다. 매화는 대나무와 함께 이른바 사군자(四君子:梅蘭菊竹), 세한삼우(歲寒三友:松竹梅)에 모두 포함되는 식물이다. 대나무는 겨울철에도 잎의 푸른색을 잃지 않는다. 매화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운다. 이 때문에 대나무와 매화는 지사(志士)나 인자(仁者)의 불굴의 정신에 비유된다.
포은이 중국을 사행하던 시기의 작품에서는 매화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 사행 시기의 작품에서는 비중 있게 등장한다. 일본 큐슈에서의 주변 환경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포은이 10개월간 머물렀던 태재부와 주변의 관음사, 천만궁은 수 만 그루의 매화가 있어 고대부터 매화연을 베풀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