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문화/문화이론 > 한국학/한국문화 > 한국문화유산
· ISBN : 9791169192576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4-12-20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일러두기
제1부 한국 암각문의 이해
1. 암각문의 개관
2. 암각문의 조사와 정리
3. 암각문의 보존과 활용
제2부 한국 암각문의 실제 1
1. 삼국~고려시대 암각문
2. 고려·조선시대의 매향埋香 암각문
3. 한국 암각문의 변증
제3부 한국 암각문의 실제 2
1. 괴산 화양구곡華陽九曲 암각문 · 298
2. 화서학파華西學派 문인들의 암각문 · 322
3. 거창 수승대搜勝臺의 제시題詩 암각문 · 372
부록
1. 한국 암각문 문헌자료 일람
2. 한국 암각문 논저목록
3. 해동암각문연구회 보도기사
저자소개
책속에서
암각문의 개관
암각문은 금석문의 한 갈래이다. 바위에 새겨진 문자를 지칭한다. '바위 글씨'라는 한글 명칭이 가장 합당한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데는 이견이 있다. 신라시대에 조성된 암각문의 명칭으로 '신라시대 각석刻石' '석각石刻' 또는 '각석명刻石銘'을 사용하였고, 암벽에 새겨진 경우는 '마애명磨崖銘'으로 지칭하였다. 울산 반구대의 '암각화 巖刻畵'가 공식 명칭이 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바위나 암벽에 새겨진 문자도 '암각화'로 지칭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안내판에 '죽서루 암각화'라 표기하였다. 아직도 '석각石刻' '각석刻石' '마애명磨崖銘' 등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암각문巖刻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필자가 1993년도에 경기도 포천시 옥병동에서 한석봉 필적의 선조윤음宣祖綸音 암각문을 발견하고, 이를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 보다는 '암각문'이란 명칭에 대해서만 논쟁했던 적이 있다. 이제는 각 지방에 등록된 문화재에 암각문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암각문이란 용어를 통용하는데 30년이 걸린 셈이다.
암각문은 금석문의 한 갈래
금석문이란 글자 그대로 금속金屬이나 석류石類에 새긴 문자를 말한다. 그냥 '금석金石'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금석학金石學'이라 한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종이에 쓴 문자 외에 갑골문 甲骨文·새인璽印·전폐문자錢幣文字·봉니封泥·목간木簡·죽간竹簡 등의 문자까지 포함한다.
금석문의 유래는 일찍이 중국의 은殷나라 때부터 시작한다. 은나라에서는 청동기로 된 여러 종류의 제기祭器에 그림이나 명문銘文을 새겨 넣었다. 처음에는 씨족의 칭호나 이름 등을 새기는데 그쳤으나, 은나라 말기부터 문장을 지어 넣기 시작하였다. 주周나라에서는 그 제기를 만든 사연·연대 및 관계된 사람의 이름 또는 의식적인 어구까지 새겼다. 어떤 것은 문학적 수준이 뛰어난 운문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이런 것을 통틀어 '금문金文'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종鐘·정鼎·이彛·반盤 등에 새긴 금문을 '종정鐘鼎'이라고 통칭하였다. 금문은 이외에도 악기·무기 등에 새겨진 문자도 포함하였다. 이 금문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송나라 설상공薛尙功의 『종정이기관지鐘鼎彛器款識』, 청나라 완원阮元의 『적고재종정이기관지 積古齋鐘鼎彛器款識』 등이 있다.
석문石文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전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고石鼓가 있다. 어로와 수렵의 사실을 아름다운 시가의 형태로 서술한 장편서사시를 이 석고에 새겨 놓았는데, 석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진시황제 때 글자체를 소전小篆으로 정리하고, 태산泰山·낭야瑯? 등 석벽에 자기의 공적을 새긴 석각石刻[巖刻文]이 있다. 한漢나라 이후에는 묘비와 기념비 등이 많이 세워졌다.
이밖에도 금석문에 들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재질이 꼭 금속과 석류가 아니더라도 금석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은나라의 유물로 출토된 갑골문甲骨文도 금석의 재질은 아니나, 넓은 의미에서는 금석문에 포함할 수 있다.
한국의 금석문은 그 종류에 있어서 중국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 중국에서는 금문이 앞서고 석문이 그 다음이 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약간의 청동기가 출토된 바 있으나, 명문이 있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금문보다는 석문이 주가 된다. 우리나라의 금문으로는 종명鐘銘 및 여러 종류의 불기佛器에 문자를 새기거나 입사入絲한 것들이 있고, 석문으로는 석비石碑와 암각巖刻이 주류를 이루며, 석비의 유형으로는 신도비神道碑·사적비事蹟碑·탑비塔碑·묘비墓碑·묘지墓誌 등이 있다. 자기류磁器類에 새겨진 것도 재질은 다르나, 금석문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묘지墓誌는 석재보다는 백자류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한국의 금석문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석각石刻'이란 명칭으로 알려진 자료를 보인다.
선사시대의 금석으로는 여러 곳의 암각화가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는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盤龜臺의 암각화와 울주군 천전리의 암각화가 있다. 그 규모에 있어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천전리 각석刻石[암각문]도 이와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된다. 새긴 수법도 반구대 암각화는 선만을 그어서 새긴 선각과, 선으로 그림의 윤곽을 먼저 그려 놓은 다음에 윤곽의 안 부분을 다 쪼아내는 면각面刻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천전리 각석刻石에는 선각이 있고, 또 점선을 쪼아서 그린 점각이 있다. 그리고, 시대는 다르지만 삼국시기의 신라부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에까지 걸쳐 많은 사람들의 제명기가 새겨져 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 논의되고 있는,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하리에 있는 '상주리 석각尙州里石刻'은 자연암에 새겨진 그림 문자로 경남기념물(1974.02.16.)로 지정되었다. 가로 7m, 세로 4m의 평평한 바위 위에 가로 1m, 세로 50㎝ 넓이로 새겨져 있다. '서불과차徐市過此' 또는 '서불제명각자徐市題名刻字'라고 부른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의 명령으로 방사方士인 서불이 삼신산三神山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 3천여 명을 거느리고 이곳 남해 금산을 찾아와서 한동안 수렵을 즐기다가 떠나면서 자기들의 발자취를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새겨 놓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시황제 때는 이미 한문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의 고문자로 추측되기도 한다.



























![[큰글자책] 원서발췌 용재총화](/img_thumb2/979114301128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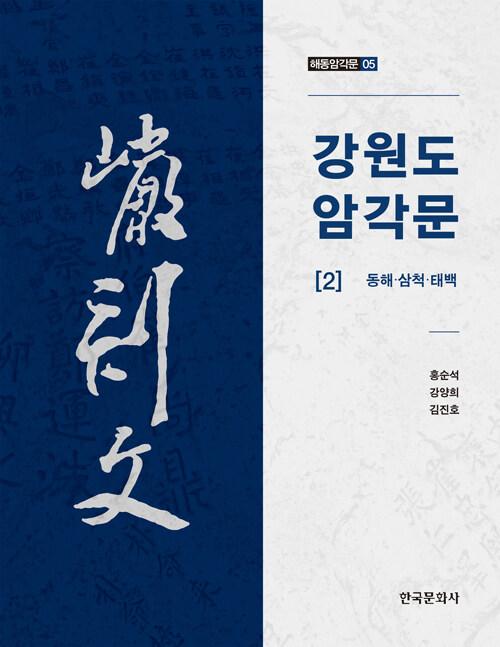










![[세트] 로고테라피 + 빅터 프랭클 - 전2권](/img_thumb2/K8920344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