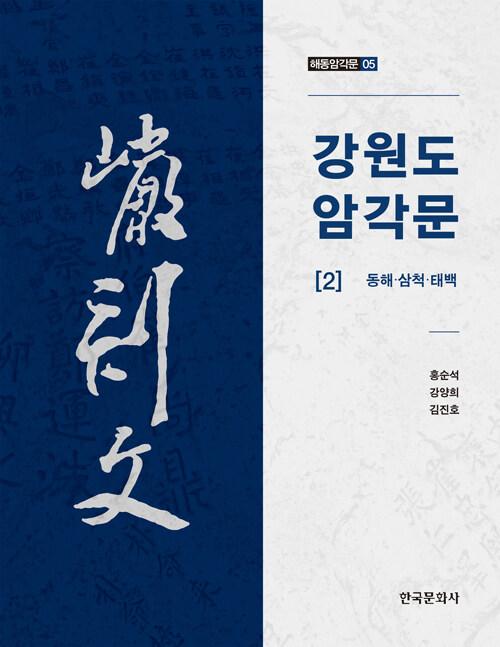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문화/문화이론 > 한국학/한국문화 > 한국문화유산
· ISBN : 9791166850806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22-02-25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 금강산 암각문
· 고성군 암각문
· 속초시 암각문
영랑호
계조암 석굴
계조암 동암
비선대
· 양양군 암각문
[부록] 강원도 영동북부지역 암각문 일람참고문헌지원협찬
저자소개
책속에서
머리말
금강산 암각문조사를 기대하며
‘암각문巖刻文’은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뜻하는 말이다. 그동안 금석문 분야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석각石刻’ ‘마애명문磨崖銘文’ ‘바위글씨’ 등으로 금석문자료에 포함되었다. 울진 반구대의 ‘암각화巖刻畫’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암각문’이란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최근에 이르러 각 지역에서 암각문에 관심을 갖고, 지방문화재로 등재하면서 ‘암각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기다린 30년만의 성과인 셈이다. 더욱이 전국에 암각문 애호가들이 적지 않다. 등산객 가운데 암각문만 찾아다니는 동지들이 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뜻이 같으니 동지同志로 느껴진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 남북 암각문 연구자가 함께 금강산 암각문을 조사하려고 추진하였다. 2017년에 암각문 탁본을 함께 해온 저자들이 뜻을 모아 ‘해동암각문연구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외교 정세의 급변으로 공동조사를 추진할 수 없었다. 기왕 발족한 암각문연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경기도 암각문 조사이다. 2019년에 출간한 ��경기도 암각문��이 그 성과물이다. ��경기도 암각문��이 해동암각문연구회의 가시적 성과의 시작이라면 이번에 간행하는 ��강원도 암각문��은 암각문 연구의 초석이라 할 것이다. 암각문 연구에서 가장 중시되는 지역인 관동팔경을 포함하고 있는 강원도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에는 한반도의 대표적 명산인 금강산이 있고, 옛날부터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관동팔경이 있다.
강원도의 관광지를 금강산 지역과 설악산·춘천·치악산·강릉 태백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듯이 강원도 암각문의 분포도 금강산권역(고성·통천),설악산권역(속초·양양·인제),춘천권역(철원·화천·양구·춘천·홍천),치악산권역(원주·횡성·평창·영월),강릉태백권역(강릉·동해·삼척·정선·태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살필 수 있다. 이들 지역의 현장자료를 영동지역 3책, 영서지역 1책으로 출간할 예정이었다. 2021년 강릉시 암각문을 조사하면서 예상외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별도로 ��강릉시 암각문��을 출간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간행하는 ��강원도 암각문�� 1책에서는 금강산·고성·속초·양양 지역의 암각문을 엮게 되었다. 금강산의 암각문에 대해서는 임병목 부회장이 전담하여 정리하였다. 임병목 부회장은 수년간의 자료 수집과 금강산 기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금강산��이란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금강산 관련 자료 가운데 암각문만 정리하는 셈이다.
고성군의 암각문은 홍순석이 봉래 양사언을 연구하면서 수년간 관심을 갖고 고문헌 자료를 검토해 왔으며, 고성 향토사학자 김광섭 선생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문헌에는 금강산과 인접한 고성군의 암각문 자료가 적잖이 소개되고 있으나, 군사 제한지역이기에 만족스럽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김광섭 선생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도 부실한 사유가 된다.
속초시의 암각문은 홍순석·강양희·김진호가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현장 조사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군부대, 신흥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계조암까지 사다리를 메고 올라가서 탁본한 열정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양양군의 암각문은 양양의 향토사학자 김재환 선생의 안내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양양 지역에 산재한 여러 기의 금표禁標 암각문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개운사지에서 설영당 사준雪影堂思浚의 암각문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물이다.
��경기도 암각문��, ��강릉시 암각문��에 이어 출간되는 ��강원도 암각문�� 1책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암각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관동팔경의 명소에 남긴 유적을 암각문을 통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금강산의 암각문을 남북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강원도 암각문 조사는 2000년 초기부터 시작하여 이제야 갈무리하여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강원도 암각문�� 1책‧2책‧3책으로 구성할 만큼 자료도 많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함께 조사에 참여한 동지들이 모두 각 지역의 향토사연구가이다. 이 책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줄 동지들이 지속적으로 이 방면에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강원도 암각문�� 1책을 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다. 군사보호지역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해당 군부대와 국립공원 자원보전처의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강원도 관내의 문화원장님, 향토사연구회장님과 해당 지역의 암각문 자료와 현장 안내를 해주신 여러 동지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암각문��을 간행해준 한국문화사의 김진수 사장과 김태균 전무, 편집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봄에
강원도 영동북부
강원도는 타지역에 비해 많은 암각문 자료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대관령을 기점으로 크게 영동, 영서지역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편의상 강릉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인 고성‧속초‧양양을 북부, 동해‧삼척‧태백‧정선을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 책에서는 강릉시의 암각문은 2021년도 6월에 별도로 간행한 바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영동 북부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영동은 대관령의 동쪽을 가리킨다.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명승지가 많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관동팔경이라하여 정자나 누대가 있어 많은 문인들이 풍류를 즐기고 빼어난 경치를 노래하였다. 고려말의 문인 안축安軸은 경기체가인 <관동별곡>에서 총석정·삼일포·낙산사 등의 경치를 읊었고, 조선 선조 때 정철鄭澈은 가사인 <관동별곡>에서 금강산 일대의 아름다운 산수와 더불어 관동팔경의 경치를 노래하였다. 관동팔경으로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고성의 삼일포三日浦, 간성의 청간정淸澗亭, 양양의 낙산사洛山寺,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삼척의 죽서루竹西樓, 울진의 망양정望洋亭, 평해의 월송정越松亭을 꼽는다. 평해의 월송정 대신 흡곡의 시중대侍中臺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현재 망양정과 월송정은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삼일포·총석정·시중대는 북한에 속한다. 결국 강원도 영동북부 지역의 암각문은 고성·속초·양양을 범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강산의 암각문을 포함하였다. 남북 분단 이전에는 고성지역에 포함되었던 권역이기도 하며, 암각문의 보고는 금강산이기 때문이다.
고성군
북한에서 남으로 달리는 태백산맥을 따라 향로봉香爐峯·마산馬山:1,052m·신선봉神仙峯:1,204m·칠절봉七節峯:1,172m 등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들이 줄지어 있으며, 간성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길목에 진부령陣富嶺: 520m이 있다. 이들 산세는 해안 쪽으로 급사면을 이루다가 해안 근처에 좁은 평야를 이루며 동해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동해안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미시령 사이로 인제군, 남쪽으로는 속초시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 고성군과 접한다. 옹진군·철원군과 함께 남북한에 모두 존재하는 군이다. 남한이 대부분을 차지한 철원군과 달리 고성군은 남(664.55㎢)과 북(518.56㎢)의 면적 차가 크지 않다. 남북이 절반 정도를 각각 나눠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옛 간성군 전역과 옛 고성군 고성읍 남부 4개리, 수동면 동부 8개리를 남한이 차지했고, 나머지 지역을 북한이 차지하고 있다. 면적으로만 보면 남쪽의 원래 고성군 영역이 더 넓지만, 고성읍, 장전읍 등 분단 이전의 주요 행정·경제 중심지는 북쪽에 있다. 6·25 전쟁 이후 군청 소재지였던 고성읍 일부가 남한으로 넘어갈 정도로 경계선이 북쪽으로 올라오자 북한은 군청을 최북단이었던 장전읍으로 옮기고 통천군 임남면 일대를 고성군에 편입하였다. 현재는 북한의 고성군 면적이 조금 더 넓은 편이다. 1913년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간성군 영역은 남한이, 고성군 영역은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성·간성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강릉과 더불어 동예의 땅이었다. 고성은 고구려의 달홀達忽이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후 경덕왕 때 고성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간성은 고구려 수성군䢘城郡이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후 경덕왕 때 한자가 다른 수성군守城郡으로 바꿨다. 고려 때는 간성현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