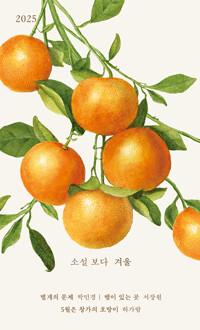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문학의 이해 > 한국문학론 > 한국시론
· ISBN : 9788980694419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21-02-05
책 소개
목차
005 책머리에
1
012 방황과 저항에서 포용과 관조로
— 박훈산의 시세계
027 이데아에의 꿈, 따뜻한 휴머니티
— 박방희 시집 『사람 꽃』
050 올곧은 사유와 서정의 변주
— 정 훈 시집 『식스시그마』
071 서정적 서사, 질박한 휴머니티
— 이무열 시집 『묵국수를 먹다』
089 향수와 회귀의 시학
— 이행우 시집 『그 바람은 꽃바람』
106 자기 성찰과 그리움의 정서
— 김봉용 시집 『저녁 무렵의 랩소디』
2
128 정갈하고 단아한 서정
— 구영숙 시집 『오래된 풍경』
150 온전한 사랑과 본향 회귀의 꿈
— 황세연 시집 『음표와 음표 사이』
168 활달한 상상력과 내면 풍경
— 권분자 시집 『엘피판 뒤집기』
190 꿈꾸기, 그 번짐과 스밈
— 김건화 시집 『손톱의 진화』
211 초월을 향한 사유의 변주
— 김정아 시집 『채널의 입술』
231 신성 추구와 전복적 상상력
— 김건희 시집 『두근두근 캥거루』
3
252 서정적 자아와 시적 변용
— 김종택, 김상환, 김청수, 김 석, 김찬일, 이정애의 시
264 복고적 서정과 현대적 서정
— 서지월, 황인동, 김숙이, 박숙이, 강해림, 김주완의 시
275 화해와 나눔, 연민과 무상, 환상과 초현실
— 김병해, 박윤배, 김상윤, 박상옥, 방종헌, 이재하, 정 숙, 이인주의 시
290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의 시
— 장하빈, 박지영, 신윤자, 유가형, 이자규, 정하해, 이진엽의 시
302 서정시의 다양한 개성과 변주들
— 김창제, 곽도경, 함명숙, 한선향, 장혜랑, 최규목, 서 하, 김찬일의 시
315 은유, 인유, 환유, 해학과 언어유희
— 김상환, 강문숙, 손영숙, 김욱진의 시
4
328 존재와 내면 탐구
— 최애란, 지정애, 장혜승의 시
338 사랑, 비움, 지움, 야성의 시학
— 이진흥, 김연대, 박태진, 김정옥, 이진엽의 시
349 순수 서정시와 서사적 서정시
— 윤희수, 이희춘, 유종호, 김주완의 시
359 세 시인의 세 시각
— 윤일현, 손영숙, 이희숙의 시
368 낯설게 하기, 절제와 함축
— 김민정, 김정신, 이채운, 권국명, 이진흥, 박방희의 시
377 이상理想 세계 꿈꾸기와 그 변주
— 나의 시, 나의 길
저자소개
책속에서
광복을 맞은 직후인 등단 초기부터 6·25 한국전쟁의 처참한 비극을 겪고 난 1958년까지의 작품들을 담은 시집 『날이 갈수록』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시기, 휴전休戰 이후 몇 년간의 역사적 변전과 맞물려 있는 시편들을 보여 준다.
시인은 당시 자신의 처지를 “눈[眼]만이 호흡할 수 있는 이 세계는 / 나 혼자 살 수 있는 기막힌 영토領土”(「위치位置」)라면서 당대 현실에 대해 “헤쳐도 헤쳐도 가시밭길”(같은 시)이라고 한탄한다. ‘눈만이 호흡할 수 있다’는 말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의 다른 말이라면, 그 세계가 왜 자신만 살 수 있는 ‘기막힌 영토’였다는 것이었을까. 시 「위치位置」의 문맥으로 보아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곧 자신의 삶이라는 등식 때문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다. 아무튼 당시 그의 현실공간은 그런 기막힌 영토이며, 끝 간 데 없는 가시밭길에다 어둠 속의 벼랑 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칼날 선
벼랑 한 끝에
아스라이 서 있는
나의 모양
한발 내어 디딜
위태로운
나의 모양.
-「절벽 위에서」 부분
이 시를 보면 그 벼랑도 칼날이 서 있는 데다 어두운 밤(한밤)의 벼랑이라 발을 내딛기가 위태롭기 그지없던 상황이었다. 시인은 그런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처절하게 들여다본다, “산산이 / 구겨 넘어진 / 세월 안에 / 줄을 탄 눈짓이 말없이 흐르고”(「바라보는 얼굴」)라거나 “밟히어도 밟히어도 / 끊어버리지 못하는 목숨이라서 / 보내는 세월에 / 삭막한 안개가 낀다”(「다시 부산에서」)는 한탄도,
하나하나 또 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슬픔을 넘지 못한
욕된 삶을
홀로 중얼거리고…….
모두 떠나 버렸는데도
오늘
이렇게 나는
여기 섰노라.
-「홀로 거리를 지나치며」 부분
라는 처절함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비극적 현실인식은 대상에도 거의 그대로 투사되게 마련이다. 밤하늘의 유성流星을 바라보면서 “아픈 생채기 / 어디다 지녔길래 / 저토록 먼 나라로 / 푸른 불을 지고”(「흐르는 별 하나」) 간다고 보며, 그 “떠나가는 것에게 / 나는 / 손짓해야지”(같은 시)라는 대목이나 “누렇게 익은 저 이삭이랑 / 숱한 사람 사람의 절망을 / 함께 싣고서 물굽이 황토 빛깔은 / 그냥 흐른다. <중략> 나를 멀리 / 또 머얼리 실어간다.”(「탁류濁流」)는 구절 역시 마찬가지로 읽힌다.
그런가 하면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어둡고 무거우며, 전망 부재의 도가니에 다름 아니었다. “잘나면 쫓겨난다는 이 거리엔 / 짐승들의 아우성으로 소란”(「무더운 날에 있은 이야기」)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나 “오늘도 네거리를 가로막고 곡예단이 논다.”(같은 시)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은 “앞으로 나아가는 바른 자세는 / 비틀거리는 걸음 틈에 / 가로막”(「실향기失鄕記」)힐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인은 “어제와 꼭 같이만 / 되풀이되는 오늘”(「돌팔매나 치던 날」)이라거나 “내일이란 / 오늘로 되도는 / 어긋난 바퀴”(「실향기失鄕記」)라고 여기듯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비관적인 전망 부재의 어둠으로 바라볼 따름이다. 심지어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감옥의 구형矩形진(직사각형의) 방에 갇혀 의지意志대로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수인囚人(사형수)의 생활에 비유되기까지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
부시지 못하는 창살문
저 바깥 벌에는
태양이 붉게 타고
저렇게 퍼졌는데
파리한 얼굴을 쬐여보지 못하고
무엇을 기다려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주검만을 믿고
내가 죽을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날이다
-「영어囹圄」 부분
감옥 생활은 형벌 때문에 하게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크나큰 비극悲劇이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감옥의 창살 너머의 바깥과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창살문을 부수면 태양이 작열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럴 자유가 없으면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인은 그럴 자유가 없이 목숨만 일정하게 부지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은 시인에게 “죽는 것보다 / 미치는 것보다 / 더 무서운 굴욕屈辱”(「억압抑壓된 상황」)이며, 삼킬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던 것 같다. 게다가 “어디서 / 야무지게 나를 겨눈 / 돌멩이나 철鐵붙이가 / 날아올지 모른다”(같은 시)는 극도의 피해의식에 빠져들게 하는가 하면, 불안과 공포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