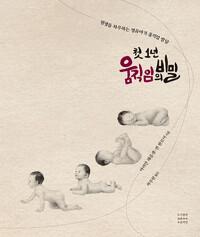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88952120441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19-10-25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도론(導論)
Ⅰ. 신묘년(1711) 필담
1. 문사기상(問槎畸賞)
2. 조선통신사일행시문필담집(朝鮮通信使一行詩文筆談集)
3. 평회전집(萍會前集)
4. 한객창화집(韓客唱和集)
5. 정덕화한창수록(正德和韓唱酬錄)
6. 양동창화록(兩東唱和錄)
7. 한객증답별집(韓客贈答別集)
8. 조선객관창화시병필어(朝鮮客館唱和詩幷筆語)
9. 좌간필어(坐間筆語)
10. 강관필담(江關筆談)
11. 조선국빙사록(朝鮮國聘使錄)
12. 광릉문사록(廣陵問槎錄)
13. 계림창화집(鷄林唱和集)
14. 칠가창화집(七家唱和集)
15. 호저풍아집(縞紵風雅集)
Ⅱ. 기해년(1719) 필담
1. 성사답향(星槎答響)
2. 남도창화집(藍島唱和集)
3. 양관창화집(兩關唱和集)
4. 한객창수록(韓客唱酬錄)
5. 상한창수집(桑韓唱酬集)
6. 부한인문․광릉문사록(附韓人文․廣陵問槎錄)
7. 매소시고(梅所詩稿)
8. 화한창화집(和韓唱和集)
9. 한객창화(韓客唱和)
10. 항해헌수록(航海獻酬錄)
11. 객관최찬집(客館璀璨集)
12. 봉도유주(蓬島遺珠)
13. 향보기해한객증답(享保己亥韓客贈答)
14. 조선대화집(朝鮮對話集)
15. 신양산인한관창화고(信陽山人韓館倡和稿)
16. 상한훈지집(桑韓壎篪集)
참고문헌
부록: 통신사 행로도(行路圖)
日文要約
Abstract
찾아보기
발간사
저자소개
책속에서
마사카즈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삼한정벌의 기록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현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지식인의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 비단 이현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 국내의 지식인도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일본 지식인들은 19세기에 들어와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하면서 급기야 정한론(征韓論)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식민사관의 연원은 여기까지 소급된다.
통신사는 일본의 이런 도발적 발언에 대체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일본을 문화적 후진국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보여 준다. 일본을 ‘이(夷)’, 조선을 ‘화(華)=소중화’로 여기는 화이론적 관점을 취한 것이다. 유교 문화를 가치 기준으로 승인할 때 가능한 관점이다.
이처럼 필담창화집에는 일본 문사가 조선을 보는 시선과 조선 문사가 일본을 보는 시선 간에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문사들은 조선이 조회(朝會)하러 왔다고 보았지만 조선 문사들은 결코 그리 보지 않았다. 선린우호를 위해 일본에 왔으며 조선의 우월한 유교 문화를 보여 줄 기회로 보았다. 한편 조선의 문사들은 일본이 문화적으로 열등한 오랑캐이며 문명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일본 문사들은 결코 그리 생각하지 않았다.
양자의 시선 간에 존재하는 이런 비대칭성을 ‘시선의 비대칭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 여기서 논한 이 세 개의 비대칭성은 비단 신묘년 사행 때의 필담창화집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찰한 18세기의 필담창화집 모두에서 확인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필담집을 읽으면서 가장 애석하게 생각되는 점은, 당시 일본에서는 이 책들이 간행되어 널리 읽혔지만 조선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필담집에는 곳곳에 일본인의 그릇된 조선관이 피력되어 있다. 가령 삼한이 고대에 일본의 속국이었다느니, 지금 조선 사신이 조공을 하러 왔다느니, 조선은 일본을 사모한다느니 하는 등의 언설이 그것이다. 일본 문사가 필담 중에 혹 이런 언설을 하면 조선 문사는 대개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게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간행된 필담집의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조선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인식을 더욱더 강화해 갔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조선으로서는 필담집이 간행된 적이 없기에 일본에 만연한 조선에 대한 그릇된 역사관과 인식을 심각하게 직시할 기회가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대응 방안이 모색될 수 없었다. 그러니 통신사가 파견될 때마다 문제는 되풀이되었다. 일본에서 19세기 초에 대두된 정한론(征韓論)의 배경에는 이렇게 다져져 간 ‘굴절된 조선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책에 수록된 외교문서는 이와 같은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선사절 대우의 간소화와 국휘(國諱)의 문제이다. 막부 측이 쇼오군의 세자에 대한 통신사의 배알을 폐지하고 로오쥬우에 대한 서계도 폐지하자고 한 이유는 외교의례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밖에도 통신사 응대를 위한 경비를 삭감하고 싶다는 막부의 의향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휘 문제는 결국 양국이 서로 국서를 고쳐 쓰고 개서(改書)한 국서를 츠시마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조선 측은 ‘光’을 ‘克’으로 개정하고, 일본 측은 ‘懌’을 ‘戢’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귀국한 후 조태억을 비롯한 삼사 및 역관들은 이 국휘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큰글자도서] 김시습·서경덕](/img_thumb2/9788936480523.jpg)










![[큰글자도서] 선비, 사무라이 사회를 관찰하다 2](/img_thumb2/9788936483678.jpg)
![[큰글자도서] 선비, 사무라이 사회를 관찰하다 1](/img_thumb2/97889364836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