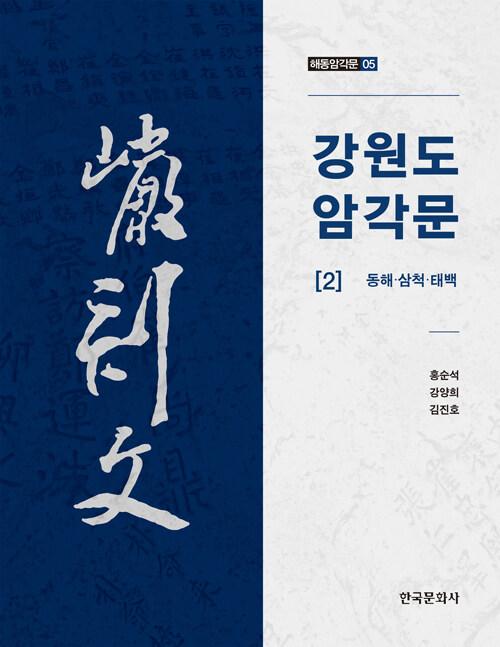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고대~고려시대 > 고려시대
· ISBN : 9788968179020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20-06-30
목차
•책머리에 / viii
•일러두기 / xviii
제1부 인연의 땅 1
제2부 좌주와 문생 53
제3부 사행의 길 75
제4부 역사의 전환점 115
제5부 포은의 주변 사람들 167
제6부 포은의 선택과 죽음 203
제7부 포은에 대한 평가 243
제8부 포은종가 275
•포은선생연보 300
•포은의 삶과 선택 306
저자소개
책속에서
포은 가문의 뿌리를 내린 곳 오천烏川
정씨의 시조는 사로육촌의 촌장 중 한 사람인 지백호智伯虎이다. 영일정씨의 시조인 종은宗殷은 그의 후손이 되는데 계보를 파악할 수 없다. 종은의 후손 또한 계보가 실전되었다.
<영일정씨대동보>에 의하면, 영일정씨는 고려 인종 때 추밀원 지주사 정습명鄭襲明을 시조로 하는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 감무 정극유鄭克儒를 시조로 하는 감무공파監務公派, 자피子皮를 시조로 하는 양숙공파襄叔公派가 있다.
영일정씨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지주사공파의 포은 정몽주이다. 포은의 9대손 정유성鄭維城은 조선 현종 때 우의정에 올랐고 청빈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정제두鄭齊斗는 강화학파의 태두로 주자학 일색이던 당시 사회에 지행합일의 양명학을 일으켰다. 감무공파의 후손으로는 가사문학에 크게 기여한 정철鄭澈이 유명하다.
쟁신諍臣의 혈통을 계승한 영일정씨 가문
영일정씨가 영일迎日로 관적을 삼게 된 것은 신라 때이다. 간관을 지낸 종은宗殷이 언사로 폄출되어 후손 의경宜卿이 영일지역의 호장으로 정착하면서 비롯한다.
포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섭균燮均·겸목謙牧·지태之泰·인수仁壽·유裕는 동정同正 또는 검교를 역임하였다. 인신麟信·종흥宗興·임林은 태학박사·진현관제학·판도판서를 역임하였다. 지태之泰의 경우 전서典書를 역임했다고 하지만, 현손인 광후光厚의 장적에는 주부동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실직을 역임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포은 가문은 영일지방에서 거주하던 사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습명 이전의 영일정씨 인물 가운데 <고려사>에 기록된 인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조부 유裕가 직장동정을, 부친 운관云瓘이 성균관 복응재생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재지사족으로서의 위치는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사실은 포은 가문이 고려 후기 권문세족과 연결 지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당시 신진사대부의 출신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포은의 활동 기반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이다.
포은은 고려 의종 때 추밀원지주사를 지낸 정습명의 10세손이다. 정습명에 대해선 <고려사>?열지?에 전한다. 정습명은 예종 때 향공 문과에 급제하여 내시에 들어갔고, 인종 때 국자사업·기거주·지제고를 지내면서 김부식·임원애·최자 등과 함께 시폐10조를 올렸다. 의종이 즉위하던 무렵에 예부시랑이 되어 훗날 예종이 된 태자에게 글을 가르쳤다. 공예왕후가 둘째 아들 대령후를 태자로 세우려는 것을 저지하여 인종의 신임을 얻고 승선에 올랐다. 인종이 유언으로 의종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이후 한림학사·추밀원지주사를 지냈다. 인종의 유명을 받들어 의종의 잘못을 거침없이 간하다가 왕의 미움을 샀다. 결국은 김존중·정함 등의 무고를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다. 병이 들었을 때 김존중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자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정습명의 작품으로 <동문선>에 <석죽화石竹花> 등 3편의 시와 2편의 표전表箋이 전한다. <석죽화>는 초야에 사는 자신을 패랭이꽃에 비유하여 세속에서 사랑받는 모란꽃과 대응시키면서 당시의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다.
세상에선 붉은 모란만 사랑하여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건만
누가 알랴 이 거친 초야에도
좋은 꽃떨기가 있는 줄을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꿰뚫었고
향기는 밭두렁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외진 땅에 있노라니 귀공자들 적어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네
世愛牡丹紅 栽培滿院中
誰知荒草野 亦有好花叢
色透村塘月 香傳隴樹風
地偏公子少 矯態屬田翁 (<동문선>,권9 )
이 작품은 <동문선> 외에 <청구풍아> <기아> <대동시선>에도 전한다. 그리고 <파한집>에는 “어느 환관이 <석죽화>를 읊조렸는데, 예종에게까지 들리니 예종이 감탄하여 정습명을 옥당에 보임하였다”라는 일화가 전한다. <석죽화>는 바로 정습명의 출세작이 된 셈이다. 평범한 산문을 연상하게 하면서도 작품의 의취는 격조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현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에는 정습명의 단소壇所와 남성재南城齋, 신도비가 있다. 단소는 실전했던 묘역을 현몽에 의해 되찾고 설치한 제단이다. 남성재는 정습명의 제향을 위한 재실이다. 1752년(영조28)에 재사를 건축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와 개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성재 입구 좌측에 신도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