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철학 일반 > 교양 철학
· ISBN : 9788972976608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11-09-30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글
프롤로그
chapter 1
사랑이란 험난한 길, 히스테리와 강박증을 넘어·이성복과 라캉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시인/우리는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히스테리와 강박증 사이에서
chapter 2
돈으로 매개되는 세속 도시의 냉담한 삶·최승호와 짐멜
대도시의 삶을 차갑게 응시한 시인/자본주의 혹은 완성된 종교/돈을 경배할수록 사물의 차이에 둔감해진다
chapter 3
차이의 포용 혹은 여성성의 문화·문정희와 이리가레이
유방암 검사를 받으며/여성의 몸과 감수성, 그리고 차이의 문화를 위하여/여성의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자
chapter 4
그리스도의 정신 혹은 해방신학적 전망·고정희와 시몬 베유
주여, 이제는 여기에/불행한 이웃을 사랑하라/진짜 돈, 진짜 밥, 진짜 사랑을 위하여
chapter 5
그저 덮을 수밖에 없는 타자·김행숙과 바흐친
내가 당신을 안은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나를 안은 것인가요?/나의 유일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가르쳐주는 타자/너무도 심오한 포옹의 의미
chapter 6
미디어가 매개하는 우리의 사랑·채호기와 맥루한
섹스, 그 근본적 소통의 세계를 찾아서/차가운 미디어와 뜨거운 미디어/미디어가 매개하는 인간의 삶과 감각
chapter 7
진정한 자유인의 길·신동엽과 클라스트르
불가능한 꿈을 통해 삶을 직시한 시인/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본 사람들/우리는 새빨간 알몸이 될 수 있는가
chapter 8
사랑이란 내밀한 세계·한용운과 바르트
고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킨 한 송이 연꽃 /님의 침묵에서 사랑의 담론으로/님과 나 사이의 격정적인 침묵
chapter 9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방법·김정환과 마르크스
역사는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대상적 활동이 없다면 역사도 없다/그럼에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인간의 숙명
chapter 10
너무도 풍요로운 감각의 세계·백석과 나카무라 유지로
란과 자야, 그리고 나타샤/공통감각의 논리/촉각 혹은 체감의 세계를 찾아서
chapter 11
글쓰기와 존재의 관계·김종삼과 블랑쇼
바흐와 브람스를 좋아했던 시인/바깥과 관계하는 방법/타자에게 죽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글쓰기의 숙명
chapter 12
대중문화의 유혹을 거부하며·함민복과 기 드보르
시각적 세계에 갇힌 시인의 발버둥/스펙타클에 포획된 우리의 삶/구경꾼에서 활동하는 주체로
chapter 13
저주받고 배척되는 삶을 긍정하기·황병승과 보드리야르
처음을 희망했던 우리 시대 젊은 시인/중심이 해체되었을 때 드러나는 풍경 /저주받은 채로 혹은 배척된 채로
chapter 14
자유와 한계의 변증법·허연과 카뮈
반항이란 푸른 유리 조각을 가슴에 품은 시인/반항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에필로그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인문학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고유명사’의 학문입니다.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은 자기만의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노래하거나 논증합니다. 그들의 시와 철학에는 유사성은 있지만 공통점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의 시와 신동엽의 시, 그리고 바흐친의 철학과 바르트의 철학이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인과 철학자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의 궁극적 유사성은 바로그들이 자기만의 제스처와 스타일을 완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와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정신의 소망입니다. _17~18쪽_<프롤로그> 중에서
클라스트르는 권력, 즉 국가 기구를 막지 못하면서 억압과 지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에 애써 대항하려고 했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주인과 하인이란 위계성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간적 공동체, 즉 진정한 문명을 지향했던 ‘자유로운 공동체’가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정식처럼 등장하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란 해묵은 분업 논리가 국가의 효율성을 정당화하는 원초적 담론으로 출현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일 겁니다. _167쪽_7장 <신동엽과 클라스트르> 중에서
헤겔처럼 세계정신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스탈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력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마르크스의 영민함은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자신이 바라는 꼭 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간혹 ‘대상적 활동’이 가진 능동성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노출되곤 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면, 주어진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은 악몽과도 같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른다”라고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_205쪽_9장 <김정환과 마르크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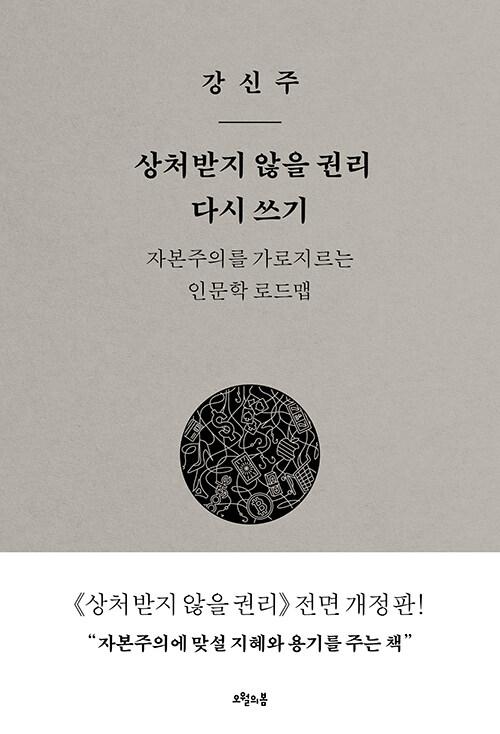


![[세트] 강신주의 장자수업 1~2 - 전2권](/img_thumb2/K4029353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