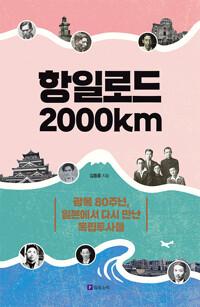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일제치하/항일시대
· ISBN : 9788994079486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11-05-13
책 소개
목차
서문
제1부 식민지 시대를 다시 읽는다
1. 서로 경합하는 공공영역들 - ‘식민지 근대’와 ‘민중사’를 넘어서
2. 농민: 초월과 내재의 경계 - 일제 하 농민운동 연구 검토
제2부 표상과 번역의 매체 공간
1. 표상공간 속의 쟁투 - 《개벽》의 표지·목차 분석
2. 모방과 차이로서의 ‘번역’ -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
3. 제 3의 길 - 《개벽》 주도층의 버트란트 러셀 소개
[보론] 매체 연구의 도달점 - 최수일의 《《개벽》 연구 》 서평
제3부 개념에 비친 식민지 사회
1. ‘대중’을 통해 본 식민지의 전체상 - 주요 잡지의 ‘대중’ 용례 분석
2. 집합적 주체들의 향방 - ‘국민·인민·민중·대중’을 중심으로
3. ‘종교’ 개념을 둘러싼 충돌 - 1930년대 천도교와 좌익 언론의 사상 논쟁
주석
찾아보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이 글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하는 새로운 역사담론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의 식민지 경험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자는 것이었다. ‘식민지’는 근대 국민국가의 ‘미달’·‘결여’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에 상반되는 혹은 넘어서는 요소들을 풍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장소로 보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식민지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와 ‘민중사’ 논의를 검토했다. 양 입장에 대한 검토의 깁노틀은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이었다. 비판적 역사담론은 양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되, 식민지 경험의 재현과 현실정치의 측면에서 두 입장을 검토했다. … 그리고 식민 지 경험의 새로운 재현방향을 ‘서로 경합하는 공공영역’으로 제시해 보았다. 그 핵심은 ‘차이에 기초한 소통’이었다. 박영은 등의 논의를 거쳐, 강상중, 쇼미시 준야가 제시한 ‘세계화의 원근법’에서 중요한 인식틀을 빌려 왔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경험’이 1990년대 이후 오늘날의 세계화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나는 그동안의 식민지 공공성 논의가 강상중 등이 제시하는 ‘서로 경합하는 다차원의 공공공간’ 논의와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