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철학 일반 > 교양 철학
· ISBN : 9791166842238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3-08-14
책 소개
목차
초대장 4
1부 입문
1장 철학이란 무엇인가? 15
1 일상을 통해서 본 철학 17
1.1 철학에 대한 속견들 17
1.2 철학의 본질을 암시하는 일화 둘 27
2 애지로서의 철학과 인간의 중간성 34
2.1 『향연』과 에로스의 중간성 35
2.2 철학의 중간성 43
2.3 이 장의 결론: 인간의 유한성과 의무 50
2장 과학과 철학 53
1 철학과 과학의 관계 54
1.1 보편학으로서의 철학과 ‘과’로 나뉜 학문으로서의 ‘과’학 54
1.2 과학의 분립과 성장은 철학의 지양을 의미하는가? 58
2 철학은 과학을 ‘앞서간다’ 68
2.1 전제의 학문과 무전제의 학문 69
2.2 생물학적 설명의 한계 84
2.3 과학의 전제와 철학의 물음 102
3장 무전제자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 108
1 전제 위의 과학과 무전제자를 향하는 철학 108
1.1 테지스, 히포테지스, 안히포테톤 108
1.2 『파이돈』과 ‘끝’을 향한 추구 115
2 철학자의 신으로서의 끝 126
2.1 끝에로의 사유 실험 127
2.2 철학사에 신이 들어오게 된 배경 139
4장 철학의 분류 147
1 철학사의 분류법들 148
1.1 고대의 철학 분류법 148
1.2 칸트의 철학 분류법 151
1.3 퀼페의 철학 분류법 156
2 『초대』의 분류법 158
2부 형이상학: ‘네가 아닌 것’이 되어라!
5장 초월 165
1 실체 형이상학 165
1.1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165
1.2 두-세계-이론과 실체 형이상학 179
2 동굴의 비유와 타자화로서의 초월 201
2.1 동굴의 비유 205
2.2 비유의 해석: 존재와 인식의 단계 219
2.3 끝에로의 초월: ‘네가 아닌 그것’이 되어라! 240
6장 신 248
1 신 존재 증명 251
1.1 중세적 문제로서의 신 존재 증명 251
1.2 세 가지 증명 방식: 자연신학적, 우주론적, 존재론적 증명 255
1.3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 262
1.4 존재론적 증명에 대한 칸트의 비판 267
2 철학적 문제로서의 신 274
2.1 사실로서의 유신론과 무신론 276
2.2 요청으로서의 유신론과 무신론 278
3부 인식론: 나는 안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7장 자아 293
1 자아와 인식의 문제 293
1.1 인식의 원천은 무엇인가? 294
1.2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 이 대립의 철학적 의미 297
2 데카르트적 회의와 자아 305
2.1 데카르트는 누구인가? 307
2.2 회의 317
2.3 자아 330
8장 인식 347
1 경험론의 문제의식과 시원 350
1.1 경험 또는 실체? 350
1.2 감각 경험의 상대화와 실재론의 거부 360
2 물체, 정신, 법칙의 해체 375
2.1 물체의 해체: 조지 버클리 375
2.2 정신과 인과법칙의 해체: 데이비드 흄 405
9장 끝내는 말 451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철학자의 관심은 말과 표현이 아니라 생각과 사유를 향한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철학자도 말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철학자를 철학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외적인 말이 아니라 내적 사유다. 이 대목에서, 철학하는 자는 ‘내면’을 향하고, 말 잘하는 자는 ‘외면’에 신경 쓴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양철학의 주류가 공유해 온 주된 특징 중 하나는 특유의 정신주의적 경향, 즉 ‘외적, 감성적인 것에 대한 내적, 정신적인 것의 우위’다. 나는 이 원칙적인 우위에 의거하여 철학자는 외적인 말만 잘하는 자일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은 내적 사유의 결과다.
과학자도 ‘왜?’라고 묻고 철학자도 ‘왜?’라고 묻지만 두 물음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과학자의 ‘왜?’가 특정 전제 위에서의 ‘왜?’라면, 철학자의 ‘왜?’는 아무런 전제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세계의 끝에 이를 때까지 던져지는 ‘왜?’다. 이렇게 보면 ‘왜?’에 대한 숲속의 실증주의자의 답은 그 자체 완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철학자는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과연 어떤 죽음이 철학적인 것일까?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던 그날 하루에 대한 온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 앞에 찾아온 죽음을 담담히 그리고 “숙연히” 받아들이는 소크라테스의 혼과 부르르 “떨며” “차가워지고 굳어 가던” 그의 신체의 최후를 보게 된다. 이 끝 이후 저 세상에서 소크라테스의 영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그건 『파이돈』의 저자도 모른다. 플라톤이 이 책에 적어 둔 것, 우리가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학했던소크라테스의 마지막 하루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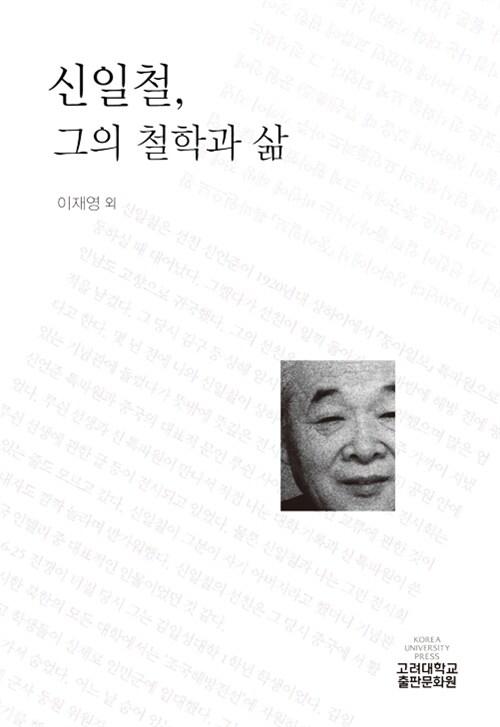











![[세트] 박사 문어, 시간을 거슬러 도착한 말들 +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느린 과학 선언 - 전2권](/img_thumb2/K6621365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