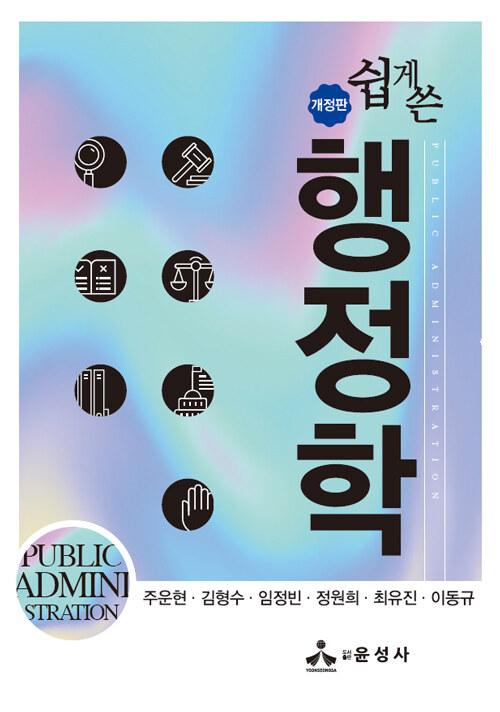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68090064
· 쪽수 : 375쪽
· 출판일 : 2021-11-15
책 소개
목차
여는 글. 좋은 도시
1장. 공동체, 다시 살다
공동체가 살아나면 -아미시 이야기
오염은 항상 문제다 -미국의 러브 커낼과 한국의 장점마을
탄이 떠난 자리 -태백 상장동 벽화마을과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골목에서 다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강릉 월화거리와 로즈웰 히스토릭 디스트릭트
벽화 그리기만으로는 부족해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주 자만 벽화갤러리
2장. 공간, 다시 살다
남은 건물 없음 -충남 당진의 아미미술관과 제주 명월국민학교
다시 얻은 생명 -러스트 벨트의 교회들
주민에게 돌아오다 -클리블랜드 퍼블릭 스퀘어와 대전 옛 충남도청사
담배 팩토리에서 예술 팩토리로 -대구예술발전소와 청주 동부창고
랜드마크가 된 기피 시설 -오산의 에코리움과 하남의 유니온파크
3장. 콘텐츠, 다시 살아나다
도시의 숨은 기획자, 동네 책방 -안성의 다즐링북스와 부여의 세간
오래된 도시에서 역사적인 도시로 -군산의 구도심 여행
일상 속 즐거운 여행 -안성의 두레피디 사업장
녹색으로 채운 도시 -문경의 로컬푸드와 동작의 성대골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 소셜 믹스 -뉴욕의 비아 베르데와 남양주의 위스테이 별내
맺음말. 여정의 끝에서
감사의 말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오염은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여 우리의 삶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같다. 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패턴이 있다. 마을 주민이 암이나 백혈병으로 지속해서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과성이 없다.” 혹은 “너희가 인과성을 입증해라.”라는 주장을 되풀이한다는 점이다.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단속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 누구도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않는다. 겨우 인과성이 입증된 뒤에는 “얼마면 될까?”라는 태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보상의 과정에서 “너희 잘못은 없니?”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분노를 넘어서 참담함을 느끼게 할 지경이다. 이런 패턴은 언제나 똑같다.
정의란 무엇일까? 환경의 오염에서 비롯된 정의의 문제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만약 장점 마을의 주민이 돈이 많았다면, 혹은 정치 권력을 소유했다면, 오염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 과정이 지금과 같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비료 공장이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사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오염 물질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감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 -‘오염은 항상 문제다’ 중에서
‘어댑티브 리유즈(adaptive reuse)’는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도시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공간 업사이클링(upcycling)’이라 부르는 것 같다. ‘adaptive’는 ‘적응하는’이란 뜻의 형용사이다. 그렇다면, ‘adaptive reuse’는 ‘적응하는 재활용’이라 직역할 수 있겠다.
사람이 사용하던 다양한 공간. 예를 들어, 집이나 학교, 교회, 서점, 식당, 공장 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새로운 주인을 빨리 찾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긴 시간 동안 활용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능을 상실한 공간은 관리가 되지 않는다.
빈 건물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방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미 사람이 떠나기 시작한 도시가 많이 선택하는 최악의 대안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남은 사람, 즉 마을에서 계속 사는 사람을 위해 커뮤니티가 원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는 것이다. 노동과 도시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리처드 세넷은 《짓기와 거주하기》에서 현대 도시의 문제는 지어지는 건물과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물의 균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수없이 지어진 건물 중 공동체가 원하는 건물은 별로 많지 않다. 건물은 참 많은데 우리 아이가 갈 곳은 없다.
세 번째 선택지는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다. 비어가는 도시에서는 이 방안도 괜찮은 대안이다. 구도심의 문제는 환경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옛날 도시계획에서는 공원이나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을 집약시키다 보니 도시가 숨을 쉴 여유가 없었다. 도시가 숨을 쉴 수 있으면, 공동체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다. 도시재생은 빈 도시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도시를 잘 비우는 과정이다.
‘적응적 재활용’은 두 번째 선택지에 초점을 맞춘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적응할 것인지’이다. 공동체의 수요에 적응하고, 지역 경제 상황에 적응하며, 생태에 적응하는 것이 적응적 재활용이다.
-‘남은 건물 없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