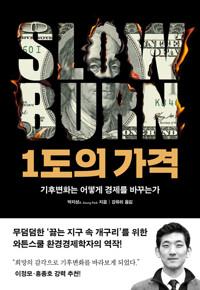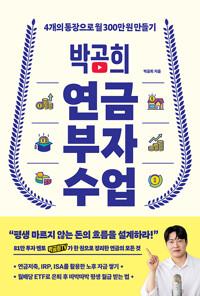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전략/혁신
· ISBN : 9791195968619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6-12-23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1부 문제 찾기
1. 화성 시차
2. 사용자 겸 발명가
3. 남의 입장에 서 보기
4. 피드백의 미래
2부 발견
5. 슈퍼 인카운터러
6. 데이터 고글
7. 무에서 유 창조하기
3부 예언
8. 퐁 효과
9. 웨인 그레츠키 게임
10. 머릿속 실험실
11.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방법
4부 연결
12. 중개자
13. 허용 구역
14. 총체적 발명
5부 역량 강화
15. 종이로 만든 눈
16. 팅커링 교육
결론
리뷰
책속에서
내가 에이미 스미스Amy Smith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2003년의 일이었다. 몇몇 친구들이 이야기하길 MIT의 어떤 유별난 강사가 수강생 전체를 아이티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역할을 뒤집어 MIT 학생들이 현지 농부들에게 기술을 배운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궁금증을 자아냈고, 나는 곧장 스미스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다. 스미스는 황급히 가나 또는 잠비아행 비행기에 오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양동이를 들고 MIT 복도를 성큼성큼 걷고 있던 스미스를 발견하고 헐레벌떡 달려갔다. 그녀는 수업 중 시연에 사용할 구정물을 받으러 찰스 강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잰 걸음으로 걸으며 스미스는 오지 마을에서의 수질 검사에 따르는 고충에 대해 설명했다. (중략)
내가 에이미 스미스의 디-랩D-Lab 수업을 참관하던 날, 학생들은 커다란 검은색 테이블 주변에 모여 곧 있을 아이티 답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몇 주 뒤면 출발 예정이었다. 학생들은 현지인들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마을의 식수에 위험한 박테리아가 있는지도 검사할 것이다. 스미스 교수는 이 작업에 관한 자신의 윤리적 견해도 덧붙여 가면서 방법을 시연해 보이고 있었다. 교수는 은색 바벨 같이 생긴 수질 검사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시험 장비의 가격은 600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훨씬 저렴한 장비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이었다. 플레이텍스 사의 젖병으로 스미스 교수가 직접 만든 장비는 제작비가 겨우 20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동일한 금액으로 검사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클라인은 상상력을 예리하게 다듬어 재난 예측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른바 "사전 부검"이라는 방법이다. 그는 경영자들에게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 지금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되돌아' 보라고 주문한다.
클라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보통 사전 부검은 팀 구성원들에게 프로젝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시작된다. 제일 먼저 리더는 프로젝트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모두에게 알린다. 자리에 모인 팀원들은 몇 분에 걸쳐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실패의 원인을 종이에 적는다. 특히 평소 같으면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을 원인들까지 빠짐없이 적는다."
사람들은 각자 상상한 대로 프로젝트가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끝나게 된 이유를 차례로 발표한다. 클라인은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높은 사람들은 곧잘 위험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사전 부검은 이런 태도를 누그러뜨린"다면서, "이 활동은 또한 팀의 감수성을 높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문제의 조짐을 재빨리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결국 사전 부검은 고통스럽게 사후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썼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내면에서 솟아나는 의심과 걱정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물며 차분하게 구체화시켜 보기란 더더욱 어렵다. 창의적인 돌파구가 떠오르는 즉시 의기양양해져서 '눈 딱 감고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 결과를 솔직하게 가늠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전 부검은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김 서림이 없는 거울이나 이발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른 벨란저는 직감적으로 이 방법을 실천해 온 셈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아이디어의 "제품 테스트"를 수행했고 가상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느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1990년대 중반에 팀은 학교의 명물 빌딩 20의 안쪽 방에서 로봇 밑 공간에 담요를 깔고 잠을 잤다. 우리의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아니 팀 자신조차도 그가 벌인 엉뚱한 프로젝트들이 궁극적으로 10억 달러 산업의 발단이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에 사시사철 샌들 차림이었던 팀은 해변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든 서퍼라고 해도 믿어 줄 만했다. 사실 그는 MIT 졸업생도 아니었고 그 학교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다. 대신 그는 일본에서 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잠수복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으며, 마구점에서 낙농장 젖소의 젖통에 채우는 장비를 수리하는 일을 했다. 팀은 이력서에 이 경력을 "젖소 브라 수리"라고 적었는데, 덕분에 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해서 이 대학교의 비공식 쓰레기장 겸 비밀 실험실인 빌딩 20에 자리를 틀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임시로 급조된 이 건물에는 한때 방사선 연구실이 들어서 있었지만 곧 철거 예정이었고(1998년에 철거되었다),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벽에다 구멍을 뚫고,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계단을 내려가고, 침낭을 가져와 남는 방에서 숙식을 한들 상관이 없었다.
"특히 (빌딩 20의) 방 한 곳은 누구든 가서 이것저것 땜질하고 고칠 수 있는 무정부 지상천국이었어." 팀은 내게 말했다. "워낙 고물이 가득 차 있어서 문을 조금만 열고 간신히 몸을 구겨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지." 공식적으로 이 고물 방은 마이터스MITERS라는 학생 동아리 소유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팀의 아파트였다.
빌딩 20은 20세기에 가장 많은 발명품을 쏟아 낸 발명의 허브 중 하나였다. 전성기에는 마이크로파, 전자공학, 신경생물학, 심지어 언어학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여기서 탄생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한때 거기서 근무했다.) 적어도 아홉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곳에서 나왔다. 아울러 발명에 대한 새로운 생각, 즉 누구나 공공 연구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 생겨난 곳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MIT에서 제일 지저분한 건물이 최고의 창의력 허브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의성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