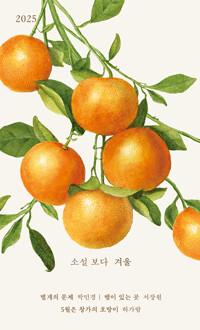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문학의 이해 > 일반문학론
· ISBN : 9788936463601
· 쪽수 : 508쪽
· 출판일 : 2022-06-30
책 소개
목차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제1부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민족문학의 민중성과 예술성
오늘의 민족문학과 민족운동
한국의 민중문학과 민족문학에 관하여
통일운동과 문학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
민족문학론과 분단문제
제2부
민족문학과 외국문학 연구
외국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식민지 시대와 서양문학 읽기
영미문학 연구와 이데올로기
제3부
80년대 소설의 분단극복의식: 송기숙 소설집 『개는 왜 짖는가』를 중심으로
『만인보』에 관하여
살아 있는 김수영
살아 있는 신동엽
서사시 『푸른 겨울』의 성취
제4부
학문의 과학성과 민족적 실천: ‘인문과학’의 문제와 관련하여
작품·실천·진리: 민족문학론의 과학성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언어학적 모형과 문학비평: 『언어의 감옥』에 대한 비판적 소개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리의 소설문학은 이제 노동현실·분단문제·광주사태 등등의 힘겨운 주제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본격적인 작품화가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지를 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려볼 지점에까지 온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그것은 앞의 온갖 주제들을 상호연관된 총체적 현실로 인식하는 본격적인 장편소설, 곧 리얼리즘 소설이어야 함이 분명해진 것이다. 실상 우리가 ‘장편문학’이라고 하면 흔히 ‘장편소설’과 같은 뜻으로 알 만큼 본격적인 장편문학의 성취는 리얼리즘에 투철한 장편소설의 생산에 크게 의존한다. 이것은 서양문학의 장르 개념에 얽매인 주장이라기보다 20세기 구미 비평에서는 차라리 도외시되는 제3세계문학의 가능성에의 믿음에 근거한 소설관인 것이다.
1980년대의 마지막해를 민주화나 자주화의 획기적인 성취 없이 넘기면서 우리에게 힘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동시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져온 변화를 보나 동유럽을 비롯한 바깥세상의 엄청난 바뀜을 보나 앞으로는 점점 힘 가운데도 지혜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지기도 했다. ‘지혜’는 꽤나 막연한 말이고 어찌 보면 낡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본뜻을 살려 이해하는 ‘지혜의 시대’라면, ‘경제 외적 강제’라고도 일컫는 좀더 공공연한 강압이든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사고파는 개인’이라는 허상을 앞세운 음성화된 강압이든 강압이 안 통하고 또 불필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싶다.
이런 시대를 좀더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지 않고 ‘지혜’라는 알 듯 말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과학의 중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다. 과학을 떠난 지혜가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대 도래의 한 징표다. 지혜는 이제 강압의 시대 틈바구니에서 숨쉬며 먼 훗날을 기약하는 단편적 지혜가 아니라, 전인류의 삶을 슬기롭게 이끌고 갈 실력의 지혜가 될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도 필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도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세계관’의 문제로 되는 순간—더욱이 ‘실천과 합일된’ 세계관의 문제로 되는 순간—무엇이 과학적이고 무엇이 비과학적인지는 이미 어떤 명백하게 과학적인 실증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지혜를 알아보는 지혜만이 검증자가 될 수 있다. 실천과 하나인 과학은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이다.
언어 및 언어학적 방법에 관한 논의는 오늘의 지적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일수록 언어에 대해서는 매우 소박한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문학적 리얼리즘의 논의에서도 언어를 객관적 현실을 묘사하는 한갓 ‘도구’로 보거나, 언어 자체도 ‘상부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또다른 극단에 흐르기도 한다. 여기에는 물론 인간이 노동하는 존재이고 노동을 통해 자기 삶에 필요한 재화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건전한 상식이 작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생활이 ‘상부구조’의 성격을 띠는 것도 사실이고 언어가 노동의 ‘도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하는 인간이 먼저 있고 언어가 그에 뒤따라 발생한다는 식의 소박한 사고는, 인간 노동의 본질적 특징을 꿀벌의 집짓기와 인간의 건축행위의 차이로써 설명한 『자본론』의 유명한 대목과도 어긋난다. 인간은 아무리 허술한 건물을 짓더라도 그에 대한 일정한 설계를 갖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가장 훌륭한 꿀벌의 작업과도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인데, 본능적인 움직임이 아닌 ‘노동’이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으며 이는 곧 ‘노동하는 인간’은 처음부터 ‘말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언어에 대한 남다른 관심 자체가 노동에 대한 무관심을 낳을 이유는 없다. 다만 노동에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논의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현실을 극복할 노력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을 따름이다. 실제로 이들이 언어의 참뜻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마찬가지로 언어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과연 노동의 본뜻에는 충실한지도 캐물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