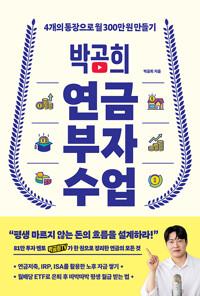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세계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60514379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14-11-19
책 소개
목차
서론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결론
저자 주
찾아보기
리뷰
책속에서
세탁기보다 인터넷이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고 착각하면…
더 걱정스러운 일은 선진국 사람들이 인터넷에 매료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국제 문제화되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나 자선단체, 개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를 갖추라고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정보 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씩 마련해 주고, 시골 마을마다 인터넷 센터를 세워 주는 것이 도움은 될 터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우물을 파 주고, 전기를 넣어 주며,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비록 고리타분해 보일지는 모르나 실제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중에서
결과에 따라 보상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하지만…
애초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온전히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전망이 있어 보여 선택한 직장이 갑자기 외국과의 경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다. 1960년대에 미국 철강 회사나 영국 조선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1990년대 초가 되면 일본이나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자기가 몸담은 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실 이런 현상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뿐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역사의 폐기물 취급을 받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
물론 이상적인 자유 시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라면 이런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직한 미국 철강 노동자와 영국의 조선 노동자는 성장 산업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강 노동자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조선 노동자였다가 투자 은행가로 변신한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되는가?
―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중에서
자유 시장 경제학으로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2008년 위기를 불러올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실 그들은 1982년 제3세계 채무 위기, 1995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위기 등 1980년대 초 이후 크고 작은 수십 개의 금융 위기에도 책임이 있다. 금융 규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그들이다. 더 넓게 생각하면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 왔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다. 부자 나라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했고,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모르는 체하도록 했고, 탈산업화 현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경제 현상들, 즉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지나치게 높은 경영자들의 보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 등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본성과 각자 생산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을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그저 실생활에서 동떨어진 것 이상의 우를 범한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학이 한 짓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쳤다.
―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중에서







































![[큰글자도서] 100세 인생](/img_thumb2/9791192512716.jpg)